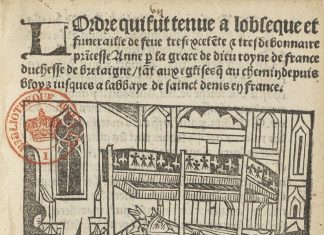겉표지 사진.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이 동일한 이 사진은 1947년 쇼와 천황(히로히토)의 히로시마 순행 사진으로 원자폭탄으로 폭발한 돔을 배경으로 군중들이 천황을 향해 소리지르는 장면으로 분노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환영하는 지 알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한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민주와 애국: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공공성〈民主〉と〈愛国〉―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조성은 역, 돌베개 新曜社, 2019(2002).
분량은 기겁할 만큼이었지만, 책 내용은 사실 꽤 재미있었다. 한 일주일은. 생각이 많아졌다. 이런 장르를 일본에서는 ‘정신사精神史’라고 말한다고 한다. 한국어로는 지성사 정도가 될까. 철학사라고 부르는 영역을 보통은 사상사라고 한다는데. 일본철학이란 말이 때론 부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1200쪽에 이르는 긴 분량으로 1945년에서 68년에 이르는 지성사를 풀어낼 만큼이나 일본 지성계가 풍부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을 한 두 마디로 정리하는 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 같고, 중간중간 기억해 두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 볼 생각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쓰이는 것은 세대론이었다.
이 책의 내용을 풀면 실은 세대론이다. 전후 세대론이긴 한데. 그게 간단하지 않다. 전후의 문을 열어젖히는 마루야마 마사오는 1914년생 오쓰카 히사오는 1907년생, 이 사람들은 전쟁 이전에 이미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양쪽의 세례를 받았던 인물들이다. 전쟁에 휩쓸리기 전에 자기 세계의 기본 얼개를 구축했다고 해야 할까. 반면 전후 우파들을 대변한, 요시모토 다카아키는 1924년생, 미시마 유키오는 1925년생 이들을 전중파라고도 하는데. 황국 소년으로 자라나서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전장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끝났다. 가장 희생이 많았다고 하는 1922년생인 쓰루미 슌스케는 부모의 능력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기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황국 소년이었다고 해도, 전쟁의 문턱까지 갔다 온 이들과 완전히 소년이기만 했던 1932년생의 에토 준이나, 1935년생의 오에 겐자부로, 1932년생의 이시하라 신타로는 또 다른 길을 간다. 같은 나이라 해도 눈앞에서 오사카가 불타버리는 걸 경험한 1932년생 오다 마코토의 삶은 또 다르다. 전쟁을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지만. 어떤 위치와 입장에서 전쟁을 경험했는가? 전쟁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세계관을 자의식을 구축할 수 있었나 혹은 없었나? 전쟁을 어디서 어떻게 경험했는가? 본국에서 그냥 결의만 다진 정도였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로 끌려가 위안소를 관리했던가? 시골에서 전쟁의 위협을 그다지 경험하지 못했는지, 눈 앞에서 도시가 불타버리는 것을 경험했는지? 전쟁 경험이라고 해도 나이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동질적이지 않다. 전혀 다른 경험이 불과 몇 년여의 차이로 사람들의 삶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각자 다른 삶과 사상을 살아나가는 동력이 된다. 세대의 공통경험이 불과 몇 년 사이로 나뉜다. 전쟁이란 그토록 참혹하게 사람의 삶을 각인하는 경험이 된다. 그렇다고 섣부른 결정론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쉽게 말하는 세대론이란 참으로 섣부르다는 생각이다. 20대, 30대, 40대로 그냥 나누어 버리는 세대론, 세대의 공통경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섬세하게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5년 전에도 20대론, 지금도 20대론을 말하는 건, 지적 게으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20대 젊은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 이용하려는 의도 이든가. 같은 20대라 해도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서 경험하는 삶과 쇠락해가는 지방도시에서 경험하는 삶이 같을 수 없다. 공통경험과 시대감각을 기준으로 좀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 세대론이라는 것은 그냥 논객들의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 그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불러서 써제끼는. 가끔은 마케팅에서 등장하는 세대론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다. 돈에 대한 욕망, 돈을 이끌어내려는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반도시 필요하겠지만, 그 호명과 구분은 신중하고,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쉽게 말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입만 열면 세대론을 들어서 아무 생각없이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이들도 좀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고. 오염물을 걸러내는 데도 생각보다 많은 정신력이 소모된다.
이 책은 전후의 내셔널리즘과 공적인 것을 둘러싼 언설言說[한국어로는 담론]의 변동을 검증한다. …… 한 사회의 특정한 시대를 지배했던 말의 체계 내지 구조를 언설이라고 칭한다. 전후사상에 있어서 언설을 검증한다는 말은, 민족, 시민, 국민 등의 말이 특정한 시대 속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었는가, 그리고 이 구조는 어떻게 변동했는가를 밝힌다는 뜻이다.(26)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변동해도, 그것이 사회 구성원의 생활 상황을 바꾸고 이어서 말의 쓰임이 바뀌는 것은 약간 늦게 일어난다는 시각이다. 사람들은 사회와 경제의 상황이 변동되어도 이전의 사회를 지배한 언어 체계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한다. …… 많은 경우에 이런 언설 구조의 변동은 완전히 새로운 말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언어를 바꾸어 읽고 그 의미를 변용시킴으로써 일어난다.(27) 기존의 언어 체계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말을 바꾸어 읽는読みかえ 작업이 종종 행해진다. 이런 사정으로 시민이나 민족과 같은 말들의 의미가, 시대와 함께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의 언어 체계로는 표현이 곤란한 잔여의 부분을, 이 책에서는 심정心情이라고 부르겠다. …… 잔여의 부분이 기존 언어 체계 속에서 특정한 말을 표현 수단으로 골라내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바꾸어 읽기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언설 구조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 최근의 역사 연구에서는, 사회의 변동이 집단적인 심성心性, mentality을 바꾸고 그것이 말까지 변동시키는 사례가 검증되고 있다.(28) 심정은 언어 체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언어 체계에 구속된 것이기도 하다. …… 언어 체계가 변천하는 과도기에는, 표면적인 단어가 바뀌었음에도 그 문법이나 실천이 과거 그대로인 상태가 발생한다.(29) 이 책은 시민이나 민족이라는 말이 시대별 혹은 국면별로 지녔던 울림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다른 시대의 시민과 민족, 민주와 애국이라는 말의 울림을, 현재의 시민이나 애국이라는 말로 기술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어의 표면적인 형태를 넘어선 대상, 언어로는 기술하기 곤란한 대상을 다루기 위해, 언어 표현의 잔여 부분인 심정이라는 개념을 가설한다. 이와 같이 심정에 대한 주목은, 언어의 표면적인 형상을 넘어서 사상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31)
서장에서 방법을 논하는 부분에서 몇 구절 옮겨보았다. 민족, 시민, 민주, 국민, 애국 등의 단어는 나 자신도 책을 읽을 때, 번역할 때, 번역서를 읽을 때, 이야기를 나눌 때 모든 순간에서 나를 괴롭히고, 장황한 설명으로 이끈다. 2021년 현재까지 지난 100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두 단어를 꼽는다면 하나는 국민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이다. 때로는 nation의 번역어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한 이 두 단어 중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지배자와 지배권력이 전유한 단어로 저항을 위해서는 폐기하거나 사용을 거부해야 하는 말이었지만, 지난 십수년간 이 모든 정치적 호명의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이제는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려울 만큼 범람하는 말이 되었다. 이제는 그 말이 포괄하던 의미들을 잘라내어 다른 말로 옮겨 쓰려는 움직임도 있다. people에게 인민이라는 번역어를 찾아주려는 움직임이 그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한 단어는 분단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며 역사적 시원과 연결해 주는 커다란 의미로 사람들을 움직여왔지만, 어느새 휴전선 너머의 쇠락하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정치집단과 연결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말로 퇴락해 버렸다. 불과 십수년 사이에 그리고 더 넓게 보는 수십년간 언중들이 움직여간 이 말들의 경계는 격차가 너무나 커서 때론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마음 속 한구석에 스스로 그런 복잡한 심정을 안고, 옆 나라에서 벌어진 말들의 변화를 엿보는 일은 때로 구토가 올라올 만큼 어지러운 일이었다. 책이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여, 다 옮길 수도, 요약할 수도 없다. 읽으면서 표시를 붙일 만큼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만 옮기면서 몇 글자 덧붙여 보려한다.
전쟁을 찬미하는 것만으로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 군과 관청의 분파주의 탓에, 어떤 부문에 속하더라도 다른 부문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교토학파의 철학자들은 해군과 연결된 까닭에 육군과 결부된 우익론자들로부터 적대시되어, 전쟁을 찬미하는 방식이 서구 사상을 따랐다는 명목으로 공격받았다고 한다. 반대로 서구 사상을 배격했던 일본 낭만파의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도 끝내는 군의 반감을 사 징벌적인 징병을 당했다. 문단과 논단 내에서 누군가의 증오를 받으면 설령 관청이나 군의 특정 부국에 연줄이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 밀고를 당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전시에 분명히 전쟁 협력을 행한 지식인들이, 자신은 탄압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허위가 아니라 이런 사정이 배경에 있었다. 의심증과 질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인에 대한 우정이나 동정은 종종 자기 자신의 위험을 의미했다. …… 이런 상황은 많은 지식인에게 자기혐오와 인간 불신을 심었다.(64) 패전 후에는 이런 전쟁 체험의 토양을 바탕으로 사회 변혁의 이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문학’과 휴머니즘의 허구를 폭로하는 ‘육체 문학’이 각각 대두된다. 군에 협력해 이익을 얻은 지식인들도 자기혐오와 굴욕감에 고뇌했다. …… 많은 지식인들에게 전쟁은 실로 악몽이었다. 그것은 표면에서 숭고한 이념에 대한 찬미가 이루어지고, 뒷면에서는 공포와 보신, 의심증과 배반, 환멸과 허위를 하나로 뭉쳐 놓은 것이었다. 타자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의 긍지가 뿌리채 뽑힌 그 체험은, 굴욕감과 자기혐오 없이는 좀처럼 회상할 수 없는, 서로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로 봉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회한의 기억이 전후사상의 중요한 저류가 된다.(65-66)
일본군과 관청의 분파주의는 너무나 유명한 일이고, 패전으로 이끌려간 무모한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찬미하는 이들에게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뜻밖의 일로, 교토학파가 육군에게 적대시되었다는 일은 일본의 표면 만을 보는 나 같은 이들에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고. 밀고와 의심이 난무하며, 질투와 복수가 생명을 빼앗아가는 상황에서 생겨난 굴욕감과 자기혐오 떠 올리기 실은 상처. 실제 중요한 사상가나 지식인들의 구체적인 전쟁체험기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황족 수상 히가시쿠니 나루히코는 1945년 8월 28일 기자 회견에서] “장래에 언론을 활발하게 하고 건전한 결사를 발달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완곡하게나마 공표했다. 또한 이런 논조는 1945년 8월 하순부터 9월 초에, 즉 점령군의 지시가 내리기 전부터 출현했다. 전후 민주주의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기 이전에, 총력전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좀 더 말하자면 이런 사상은 패전 후에 돌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1944년 7월에 작가 이시카와 다쓰조는 …… “비판을 억압하면 전의戰意는 고양되지 않는다”, “국민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무슨 총력전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 이런 논조는 전시 체제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그것을 총력적의 합리적인 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후에 다케우치 요시미가 말한 것처럼 ‘저항과 굴복’은 ‘한 끝 차이’의 관계였다. 패전 직후의 논조는, 모두 국민의 저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패전이라는 충격에 직면한 사람들이 취했던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였다. 민주화에 대한 지향은 이런 내셔널리즘과 표리일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셔널리즘은, 전쟁으로 붕괴된 국민의 도의道義를 재건한다는 주장과 연결되었다.(89)
이런 언급을 원래 일본에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패전을 전후해서 살아나와 왔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후 민주주의가 점령군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강제되었다면 차라리 다른 형태로 변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제도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의 어떤 부분들, 사상의 어떤 핵심들은 총력전 체제로부터 또는 그에 대한 비판이나 충언으로부터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또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 민주주의, 일본 내셔널리즘의 어떤 지향으로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는 총력전 사상의 연장선상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와타나베 히로시가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일본 사상의 변화와 서양사상의 수용과정에서 도쿠가와 시대의 사상들과 연결짓는 부분을 기억해 보라.
이 논문[「국민주의 이론의 형성国民主義理論の形成」]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丸山真男集》2권 227쪽). “국민이란 국민이고자 하는 존재라고 한다. 단지 하나의 국가적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통된 정치적 제도를 위에 받들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국민’을 성립시키기에 부족하다.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인민 내지 국가 소속원이며 ‘국민’nation은 아니다. …… 근대적 국민 국가를 짊어지는 것은 실로 이런 의미의 국민 의식이다.” 근대적 국민 내지 국민 국가는 언어나 문화의 공통성 같은 것이 아니라, 국정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국민 의식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마루야마의 과제는 이런 “국민주의”nationalism, Principle of nationality로 유지되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을 일본에 이룩한느 것이었다(《丸山真男集》2권 228, 268쪽). 마루야마는 이 논문에서 국가주의와 구분하여 국민주의라는 말을 채용한다. 그에 다르면 “국가주의라는 말”은 “종종 개인주의의 반대 관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한다. 물론 국민주의란 그의 후쿠자와 평가에서처럼 “개인주의자라는 점에서 실로 국가주의자”인 상태이다.(98) 미일 개전 이후, 1942년 8월 공표된 이 연재 논문[「근세 일본정치사상에서의 ‘자연’과 ‘작위’近世日本政治思想に於ける「自然」と「作為」」]의 최종회에는 막부 말기를 논하면서 “국민이 스스로를 구성하는 질서에 대한 주체적 자각 없이, 단지 소여의 질서에 운명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곳에서는 강인强靭한 외적 방위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문연이 나타난다(《丸山真男集》2권 115쪽). 그리고 전황이 긴박해지고 시대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전쟁 후기로 접어들면서, 마루야마는 국민주의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을 썼다.(106-107) 말하자면 마루야마가 1946년 「근대적 사유」에서 말했듯이, 근대 국민 국가의 이념은 전시의 논단에서 제악諸惡의 근원으로 취급받았다. 마루야마 자신도 근대 국민 국가의 이념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는 논단의 유행에 등을 돌리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재평가한 것이다.(107) 1930년대가지의 마루야마는 당시의 유행을 따라 근대를 비판했던, 말하자면 지적 우등생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전쟁 속에서 국민주의의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전후 지식인으로서의 마루야마가 탄생한 것이다.(108)
길게 인용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는데, 자꾸 길어진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논문들은 모두 훗날 『일본정치사상사연구』로 출판된 것이다. 오구마 에이지가 여기서 추적하는 마루야마의 궤적은 이렇다. 원래 도쿄대 조수助手 논문이었던 ‘소라이학’에 대한 논문 이후, ‘자연과 ‘작위’ 논문은 소라이, 노리나가, 쇼에키 등을 다루면서도 서양정치사상과의 긴밀한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으로, 베버, 트뢸치, 퇴니스, 홉스, 아퀴나스, 슈미트 등의 논의와 연결시킨다. 오구마 에이지는 1943년에 발견된 이 논문의 끝부분과 당시에는 출판되지 않았던 유고인 1944년 7월의 ‘국민주의’ 논문의 첫머리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 글은 유고 내지는 유언장 처럼, 징병 통지를 받은 후, 서둘러서 작성했다는 사정은 『일본정치사상사연구』의 서문에 상세히 실려 있다. 오구마 에이지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이런 국민주의 주장,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정치 의식을 가진 국민을 주창하는 내셔널리즘,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다분히 헤겔적인,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근대에 다시 주목하게 된 마루야마 사상의 특징이라고 언급하는 것이다. 이 점이 달랐기에 그는 전후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의 국민주의 주장은 총력전 체제를 비판하는 지점인 동시에 국민 하나하나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주의 즉 내셔널리즘이야말로 총력전에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주창하는 것이기도 했다.
훗날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로부터, 마루야마와 오쓰카의 사상은 서양 근대를 이상화하며 대중을 멸시한다고 비판받았다. 앞의 “쓰치야는 파랗게 질리고, 후루시마는 울고, 그리고 괴링은 홍소한다”라는 표현은, 마루야마가 서양을 미화했다는 증거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왜 마루야마가 “괴링은 홍소한다”라고 말했으며 구舊 학도병을 비롯한 독자들은 여기에 설득력을 느꼈는지는, 그들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마루야마와 오쓰카가 근대라는 말로 설명한 것은, 서양 근대 그 자체는 아니었다. 그것은 비참한 전쟁 체험의 반동으로써 꿈꾸게 된 이상적인 인간상을, 서양 사상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개個의 확립과 사회적 연대를 겸비하고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내는 정신을, 그들은 주체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주체성을 갖춘 인간상을 마루야마는 근대적 국민, 오쓰카는 근대적 인간유형이라고 불렀다. 즉 전후사상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주체성이란, 전쟁과 패전의 굴욕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말이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듯이 그 주체성은 국내에서는 권위에 항거하는 ‘자아의 확립’으로, 국제 관계에서는 미소美蘇에 대한 자주독립이나 중립을 주창하는 내셔널리즘으로 각각 표현되었다. 마루야마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일신 독립하여 일국 독립한다”라는 말을 사랑한 것은 그런 심정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마루야마와 오쓰카의 사상은 공통의 전쟁 체험을 가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125-126) 마루야마와 오쓰카의 사상은, 전쟁 체험에서 태어난 진정한 애국이라는 심정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모순되는 여러 이념이 얽힌, 말하자면 판도라의 상자였다. [또한 많은 마루야마 연구는 마루야마가 주창한 근대가, 서양 근대의 현실과 일치하는지, 혹은 정치사상사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 그러나 필자는 마루야마나 오쓰카가 제창한 서양 근대는 전쟁 체험의 결과로서 생긴 심정을 표현하는 매체였다고 본다. 이에 대해 히라이시 나오아키平石直昭「理念としての近代西洋」(中村正則・天川晃・尹建次・五十嵐武史偏『戦後日本占領と戦後改革』第三卷『戦後思想と社会意識』岩波書店, 1995) 은 후지타 쇼조의 지적을 바탕으로 오쓰카나 마루야마의 서양 근대는 “어떤 요구로서의 가정에 붙여진 이름’이며, 그들이 ‘그것에 부여한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85쪽)라고 말한다. 2장의 주1, 1003]
이 지점에서 나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마루야마 마사오 독해에 대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나는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메이지라는 맥락 속에 마루야마 마사오를 두고 독해한 점이 있다고 해야겠다. 그건 바로 서양 근대와의 대결과 수용이라는 그의 자의식이다. 이런 자의식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나 자신이 끊임없이 한국 사회와 서양 사회 및 그 사상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 안에 형성된 타자로서의 서양과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자의식이 나를 그런 독법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하는 근대 국민 국가의 출발점이 전쟁에 대한 반대, 그것도 체험에 근거한 반대에서 시작되고 통용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나의 이해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기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해진다. 여기서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이 책에 매력을 느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이런 논의를 읽을 때마다, 나는 작고한 김윤식의 일본 체류 시절의 자의식이 떠오른다. 그의 글에서 국립대 조교수 또는 교수로 자신을 지칭하는 부분이 반복되는데. 이는 마치 제국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제국대학의 조교수로 군대에 징집되었던 마루야마 마사오가 한쪽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마루야마 마사오를 논하지 않지만.
1950년대까지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산당의 정신적 권위는 절대적이었다.(219) 1950년대 중반까지 그 권위는 신과 같았다.(220) 마루야마 마사오가 패전후의 지식인들을 “회한 공동체”라고 부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회한이란 크게 말하자면 무모한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비참한 패전을 불러온 데 대한 회한이었다. …… 마루야마가 말하는 회한이란,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의 문제보다도, 전시기 그들의 처신에 대한, 말하자면 윤리적인 문제였다.(220) 이런 회한을 지닌 사람들에게 평화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굴욕의 기억을 해소하고 자신의 용기와 양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행위였다.(222) 실은 패전 직후는 종교가 관심을 모은 시기이기도 했다. 구래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마음의 지침을 갈구하던 당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던 것은,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서였다. …… 종교에 대한 이런 관심을 전사자의 기억과도 관계가 있었다.(225) 전쟁 체험은 사람들에게 회한과 죄책감이라는 기독교적인 심정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죄를 벌하고 용서해 줄 신을 찾는 경향을 만들어 갔다.(227) 이런 회한으로 신격화되어 간 존재가 또 하나 있었다. 일본공산당이다.(227-228) 패전 직후의 이 옥중 비전향이라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존경을 얻었다. …… 당시 젊은이들의 공산당 입당 지원이 속출한 데는, 공산주의 그 자체에 공명한 까닭도 있었겠지만 이런 소박한 경의가 배경에 있었음을 빼놓을 수 없다.(228) 나아가 당시의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사회 과학으로 얻은 역사의 필연성을 숙지한 존재로도 여겨졌다. 비합리적인 정신주의의 공허함에 질렸던 패전 직후의 사람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동경이 존재했다. …… 과학과 역사의 필연성을 자기편으로 삼은 공산당은 “오류가 없다”라는 신화가 전쟁 체험과 회한의 기억 위에 정착해 간다.(229) 하물며 탄압에 굴복하고 전향했던 과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비전향 간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 죄책감과 참회 없이는 상대할 수 없는 대사이며, 일본의 용기와 양심, 과학과 진리의 상징이라고 해야 할 존재였다. 공산당이 ‘양심의 유일한 증거’이며 ‘기독교를 대신할 정신적 원리’였던 상황은 이런 사정에서 출현했다. …… 그들은 전시 중의 사회 변천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지도적 입장으로 모셔졌을 때, 사람들의 경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신뢰로 받아들여서 이따금 독선적으로 지도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전후에 공산당이 급성장했을 때 입당 내지 복당한 당원의 대부분은, 전시 중에 황국 청년이었던 젊은이 들이거나 전향하여 전쟁에 협력했던 지식인 및 노동 운동가 등이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은 한 줌의 비전향 간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전향과 전쟁 협력의 과거에 대해, 말하자면 면죄부를 받았다. 공산당에 소속됨으로써 전쟁책임의 추궁에서 벗어났던 그들은, 종종 당의 권위를 빌려 천황제나 위정자를 규탄하고 비공산주의자를 비판하는 자세를 취했다.(230)[또한 마루야마 마사오는 1977년의 「近代日本の知識人」에서 전후 지식인들을 회한 공동체라고 이름 붙이며 “회한의 의식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마루야마에 따르면 그것은 “공산당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의 원천이 되어 전향에 회한을 지닌 공산당원이 “상부의 방침에 무조건 복종하는 경향을 재생산”한데다가 “비전향”의 실적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공산당의 오만함’도 초래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후의 비코뮤니스트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산당이 누렸던 성망을, 오로지 ‘기세 좋게 활개 치는 세력에 대한 지식인의 권위주의적 추수追隨로 돌린다면-직업적 반공反共팔이는 기꺼이 그렇게 돌리겠지만-그것은 인식으로서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丸山集 10卷 256, 257쪽). 이상 마루야마의 지적은 특별히 실증적인 근거를 보여 주지는 않지만, 그 자신의 전쟁・전후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적환한 것이다.(5장 주24, 1018)
마루야마 마사오의 “회한 공동체”라는 말을 새겨보면, 전쟁 중에 자신을 지키지 못한 회한, 전쟁 중에 자기 신념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회한이 전후의 평화 운동, 전후 민주주의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당시 일본 사상계 전체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공산당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극소수의 공산당원 만이 옥중 비전향을 관철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념은 과학으로 또 종교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지금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기묘한 이야기지만, 당시라면 이해되지 않을 법하지 않다. 공산주의는 과학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도. 공산주의의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사회과학적 지식이 있었기에 꺾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기묘한 사후적 해석이다. 어떤 이는 옥중 비전향의 관철 후, 다른 이는 중국 공산당의 옌안 장정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권위를 얻기도 했다. 일본 내 좌익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설 자리가 없자, 많은 사람이 만철満鉄 조사부의 촉탁으로 일했는데. 패전으로 끝나자 국공내전에 투신한 이가 또 상당수다. 그러나 그 신적 권위와 현실적인 무감각은 결국 중요한 정세에 대한 오판과 전략의 착오로 나타나고, 코민테른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 진보 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역사는 늘 아이러니하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임정을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백범 김구의 권위가 떠오른다. 그는 이념적으로 정반대편의 우익인사였지만. 해방 직후의 사회주의 붐도 떠오르고. 너무 피상적인 것 같지만, 해방정국에서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에서 가졌던 권위의 원천이 바로 이 비전향이 아니었을까. 평양의 김일성도 자기 권위와 정당화의 원천을 끊임없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찾는다. 아니 북한 정권 전체의 역사가 그렇다. 오죽하면 와다 하루키가 ‘유격대국가’라고 명명했겠는가. 38이남에서 활동하던 좌익들의 판단착오와 군사적 모험주의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분단과 한국전쟁의 규정력이 너무 커서 담론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시도된 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외생변수의 압도적인 힘이 담론 분석을 유의미하게 남겨둘 것 같지도 않고.
마루야마 마사오의 이 “회한 공동체”라는 말에 대한 새겨 볼 만한 비판은 우루이런吳叡人(Wu Rwei-Ren)이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의 토론에서 보여준다. “[회한의 공동체]라는 논리는 바로 회한을 통해서 피해자를 미화시키고 동시에 자기 내부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망각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336) 회한이라는 말 자체가 피해자를 미화한다는 말은 회한이라는 말로 전시의 굴복과 책임을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며, 자기 내부의 또 다른 피해자란 버려진 식민지인 재일조선인과 타이완인은 물론, 오키나와인, 아이누인, 부라쿠민까지 일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위주체들 그리고 일본 제국이 한때 지배했던 아시아에서 양산해낸 다양하고 뒤틀린 존재들이면서 일본인도 아닌 이들 피해자를 망각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후 일본 정치사상은 급속하게 일본 안으로 축소되고, 단일민족 국민국가 일본의 급속한 수립은 일본 안과 밖에서 수많은 기민棄民을 낳았다. 일본 대신 분단된 남과 북의 한반도가 그 하나의 사례라면, 전후 국민당에 의한 모국없는 식민통치가 이루어졌고, 원주민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으며, 주권 국민국가의 장에서 아직도 성원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타이완이 또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내가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개 가지고 있는 불만, 즉 그의 사상에서 피지배, 피식민 조선의 자리가 없는 이유를 우루이런의 지적을 통해 보게 되었다. 우루이런은 타이완 민족주의자이자 운동가이면서 학자이고, 베네딕트 앤더슨의 Imagined Communities의 타이페이 판의 번역자다. 그의 역자 서문에 대한 베네딕트 앤더슨 본인의 상찬을 최근 번역되어 나온 『상상된 공동체』에 추가된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할 수 있으면, 짯떼르지와 두아라에 평가만이라도 꼭 좀 읽어보고 싶다. 우상파괴적이라고까지한 The Formosan Ideology도. 그가 최근에 펴낸 『受困的思想』은 고마고메 다케시가 『台灣、あるいは孤立無援の島の思想』라고 번역했다. 스스로 ‘곤경의 사상’, ‘타이완, 이른바 고립무원인 섬의 사상’이라는 제목 만으로도 그 답답함이 전해져 온다. 우루이런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면 좋겠다.
다이쇼기에 인격을 형성한 지식인들은 이런 전쟁 체제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평론가 기요사와 기요시清沢洌의 『암흑일기暗黒日記』는 자유주의자가 전쟁을 비판한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데, 이런 지식인들의 심정도 잘 보여준다.(239) 또한 기요사와는 “미국의 전후 요구 속에는 조선 독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한국 병합]은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이니까”라고 생각했다. 총력전이 혁명을 초래하기 전에 항복하면 바람직하지만, 만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구미 제국과 타협하고, “조선, 타이완[의 상실]을 저지할 수 있다면 최상이다”라는 것이 그의 전후 구상이었다. 강제 연행 등으로 급증한 조선인에 대해서도 “전차 속에서도 조선어가 범람했다. 금후의 가장 큰 사회 문제다”라고 말한다.[또한 기요사와는 창씨개명에 대해서 “조선인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여, 일본인의 신용(?)을 참용僭用하게 만드는-총독 정치의 악惡,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렵다”라고 비판한다(1944. 5. 29). 조선인을 일본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창씨개명에 반대한다는 논조는, 당시의 후생성 주변에 존재했으며, 후술하듯이 와쓰지 데쓰로나 아베 요시시게의 조선 통치관과 공통된다. 앞의 책(2장) 『単一民族神話の起遠』13장을 참조하라. 5장의 주40, 1019] 이런 사고양식은 전시 중의 상층 계급에서는 나름대로 일반적이었다. …… 기요사와의 전시 일기에는 전후에 수상이 된 요시다 시게루와 회합을 연 모습도 쓰여 있는데, 요시다 역시 빨갱이와 군부에 반감을 지닌 자유주의자였다. 빨갱이와 군부는 무지한 민중을 선동하여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전향해 가던 와중에 기요사와나 요시다 같은 자유주의자 쪽이 전쟁에 비판적인 자세를 지켰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주의는 체계적인 사상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생활감각이었다. 사상은 전향할 수 있지만, 생활 감각은 쉽게 바뀔 수 없다. 사상은 전향할 수 있지만 생활 감각은 쉽게 바뀔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자유를 좌우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방위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 자유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241)
기요사와 기요시는 평범한 보통의 그리고 나름 선량한(?) 자유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전쟁 반대가 이데올로기적 반대가 아니라 생활감각에 의거한 반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데올로기적 반대는 오히려 꺾이기 쉬웠을 것이다. 좌익의 전향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제국의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인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씨개명도 반대한다. 창씨개명이 악한 일이라서가 아니다. 이것이 당시의 자국인에 대한 설득 양식이었든지 아니든지. 한국의 진보세력과 일본의 리버럴리스트들은 오랜 기간 동맹을 맺어왔다. 서로 상대가 우리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시절이 있었다. 한국의 군사 독재의 암울한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전후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의 야당과 비판 세력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식민지에 대해서도 사과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민주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동시에 불황으로 위축기를 지나던 일본은 우경화되었고, 일본의 리버럴리스트들은 한국의 옛 동지들과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래 있던 차이가 점점 도드라졌다. 역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도의적 사과를 얼마나 넘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한국은 보수 정권이었고,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한국과의 협력을 바랐지만, 한국의 보수 정권을 이를 뿌리쳤다. 그리고 지진.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 또는 이 책의 저자 오구마 에이지가 말하는 분극화에 따라 일본에서 리버럴리스트들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와 강제 징용이 정치쟁점, 외교 분쟁화하면서, 일본 리버럴리스트들의 한계도 명확해지고 있다.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이들이 실망을 말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한계를 몰랐던 쪽에 잘못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도 각자 다르고. 요즘에는 일본 리버럴리스트들과 연계가 있었던 한국 지식인들 일부가 분화해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동참하기도 한다. 기묘한 분화다. 그럼에도 무작정한 단결보다 분화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민주진보의 집권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리버럴리스트들과 진보의 일종의 동맹에 의한 집권이다. 이 동맹은 끊임없이 균열과 결집을 반복하는데. 물론 진보도 일색이 아니라 다색이다. 리버럴리스트도 균일하지 않고. 이제는 좀 상대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식의 회한 섞인 언급은 그만하고, 상대의 한계와 범위를 이해하고 담담하게 대화했으면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모양이다.
젊은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메이지생生인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을 비판하며 1950년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대의 메이지적인 인간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최근 일본의 초국가주의가 메이지 이후에 국가 내지 사회 체제의 필연적인 발전으로서 나왔다는 점을, 어떻게 해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 분명 지식인이 살던 세계는 관념적으로 상당히 근대적이었습니다만, 그런 관념의 세계는 일반 국민의 생활을 규정하는 ‘사상’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국민 생활 그 자체의 근대화 수준과 불균형이 컸습니다. …… 그런 사람이 살았던 지식 사회가 특별한 사회이므로, 일반적인 국민층은 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환경과 사회의식 속에 있었습니다.”(253) 마루야마 등의 세대는 동원을 통해 하층 민중과 접촉한 결과, 자기들의 생활 감각 및 천황관이 전체 일본 사회에서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마루야마의 견해로는 쇼와기 초국가주의의 대두가 상층의 지식인이 보면 돌발 사태였지만, 메이지・다이쇼기에 없지는 않았지며, 하층 민중 사이에서는 상태常態였던 것이 정치의 중추가지 진출한 결과였다. 그런 까닭에 다이쇼기로 회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근대 일본의 사회 구조의 분석과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다이쇼를 회고하는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에 비해 젊은 세대는 메이지를 중시했다. 그들은 건국과 변혁의 시대였던 메이지 유신과 자유 민권 운동을 상찬함으로써, 안정과 문화의 시대인 다이쇼기에 자란 올드 리버럴리스트에게 대항하고자 했다.(254) 실은 패전 직후부터 1950년대가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전후의 민주화의 선례로 평가하는 논조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 또 젊은 세대의 지식인은 다이쇼기에 유행한 교양주의 문화에 혐오감을 품고 있었다.(255) 전후 민주주의를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비유하는 풍조의 출현은, 형해화・온건화된 전후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조가 대두한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다. 마루야마를 비롯한 패전 직후의 지식인들은 패전 후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하며 변혁의 시대로서의 메이지라는 상像을 만들어 냈다. 거기서는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정치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고 국민이라 민족이라는 말은 정치 참가와 주체성의 표현이었다. 그런 논조는 그들이 내셔널리즘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재건을 지향했던 점과 연동되었다.(256)
마루야마 마사오가 젊은 지식인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런 식의 메이지 상찬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는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에서 발견한다. 지식인들의 메이지에 대한 평가보다 『료마가 간다竜馬がゆく』 같은 통속 역사 소설이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이 둘은 양편에서 메이지 상찬을 이끌었다. 쇼와(쇼와 전기)는 실패했지만, 메이지는 원래 성공적이었다는 신화가 여기서 탄생하게 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내셔널리즘의 기원찾기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전후 지식인의 중심이 된 30세가량의 세대는, 전쟁을 결정한 40대나 50대에 대한 반감과 피해자 의식을 품었다. 그러나 패전 후에 전장에서 돌아온 20세 전후의 세대는 전쟁의 악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30대에게도 강한 반감을 품었고 그들의 비겁과 기만을 비난했다.(380) 세대 간의 숙명인 듯.
이 시기[한국전쟁]에 공산당의 민족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민족의 근대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수정되었다. 이 전환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공산당 기관지 『젠에이』에 스탈린의 언어학 논문이 번역 게재된 데서 시작된다.(394) 그때까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민족을 근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스탈린의 1913년 논문인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가 있었다. 거기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발전단계론을 따라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로 시장・언어・문화 등의 공통성이 생긴 뒤에 민족이 형성된다는 견해를 취했다. 그러나 1950년 『젠에이』가 게재한 스탈린의 새 논문에서는, 역점을 두는 방식이 바뀌었다. 거기서는 근대적인 민족(러시아어로 나치아natsiya, 영어의 nation에 해당)은 자본주의 이후에 형성되었지만, 그 기반으로서 근대 이전의 민족체(러시아어로 나로드노스티narodnost’, 영어의 folk 내지 독일어의 Volk에 해당)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395) 민중 지향과 함께 이시모다가 전환한 배경이 된 것은 아시아의 재평가였다. 중국 혁명의 성공 이래로 아시아의 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주목이 높아졌다. 그러나 근대화 이전에는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민족 독립도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기 쉬웠다.(397) 이런 이시모다의 전환의 배경이 된 것은 소련이나 중국의 자극만이 아니었다. 실은 이시모다는 전쟁 전부터 노동 운동에 참가하면서 조선인의 민족주의와 접촉한 경험이 있었다. 이시모다가 전전에 활동했던 곳은 도쿄의 서민적인 노동자 거리였던 후카가와深川였다. 그곳은 다수의 조선인과 오키나와인 노동자가 살았고, 전전에 유일한 조선인 중의원衆議院 의원(1932, 1937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박춘금朴春琴을 지칭-옮긴이)이 당선된 지역이기도 했다. 이시모다는 거기서 조선인 노동 운동가들과 만났다. …… “지배 민족으로서의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자기의 인식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알게 되었고, 조선인의 입장과 눈으로 일본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 그리고 조선인들과의 이런 접촉이 이시모다의 경우에는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 그는 “일본인 전체가 압박・착취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고, 자기가 “일본 민족으로 태어난 점”을 의식하게 되었다.(398) …… “가난한 일본의 민중에게서조차 혹박酷薄한 처사를 받아 괴로워함을 보면, 역시 나는 조선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기분이 우선 들었지만, 그러나 그와 친해질수록, 오히려 일본 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기분이 점점 자기 속에서 성장해 갔다.”(399) 마루야마나 난바라는 일본의 민주화와 평화 문제는 열심히 논했지만 자이니치 조선인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400) 조선 민족주의의 자극으로 일본 민족주의에 눈을 뜬다는 현상은, 패전 후의 일본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전전부터 활동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조선인 활동가와 교류한 경험을 크든 작든 가지고 있었다.(402) 원래 1948년 시점에서는, 민족은 근대의 산물이라는 견해와 이상적인 민족이 형성되기까지는 계급 투쟁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단순한 민족 예찬에 제동을 걸었다. …… 그런 제동이 제거된 1950년 이후에는 구래의 민족관을 비판했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조차 신중한 자세를 잃어버렸다. 원래 그들도 다른 일본 신민들과 마찬가지로 전쟁 전의 애국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혁명을 추진하는 형태로 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허용되자, 몇 년 전까지 익숙했던 언어의 발화 형태로 되돌아가 버렸다.(410) 마루야마 마사오는 1950년 좌담회에서 당시의 학생들을 이렇게 평한다. “낮에는 주체성이라든가 민주 혁명을 입가에 거품을 튀며 논하던 자가, 밤에 회식으로 술을 먹으며 점점 흐트러지면, 역시 곧바로 군대 시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가를 부릅니다.”(411)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하는 완전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스탈린이나 레닌 또는 마오의 주장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 걸 따르는 걸 모두들 과학이라고 말하던 시절이. 또 하나는 사회주의는 민족 또는 민족주의와 계속해서 싸워왔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입장을 택하고, 궁극적인 세계 혁명을 꿈꿔왔기 때문에 19세기부터 국민국가와 계속해서 싸워왔고, 20세기 초 독일 사회민주당 등이 국민국가 노선을 택한 데 좌절해 왔다는 점에 있다. 노동자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계급의 적을 위해서 싸운다고 비난하는 논법은 꽤나 오래된 것이다. 전통적인 이해. 그러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것은 독일 나치당의 정식 명칭이다.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다.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필요하다 싶은 건 전부 다 엮어서 쓴 기이한 명칭인데. 나중에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국가사회주의라는 기존 번역보다는 민족사회주의가 맞는 듯. 소련 공산당의 노선을 따라서 민족을 낮게 평가하던 일본도 스탈린의 언어학 논문이라는 계기를 통해 민족에 대한 재평가 및 민중 지향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일본 공산당의 이런 소련 공산당과 국제 공산주의에 대한 추종 경향이 일본 좌파가 약체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전환 과정을 촉진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조선인 민족주의 운동가와의 접촉 경험이라는 지점이다. 마루야마와 난바라는 이런 움직임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마루야마의 스승인 난바라는 원래 식민주의 이론가였으니 그렇다고 치고, 마루야마 연구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이나 인식이 없는 부분이 나는 늘 불만이지만. 그런데, 오구마 에이지의 논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 번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일본 좌파들이 전쟁 전의 군국주의자들의 논법이나 애국 교육의 영향 내지 잔상으로 순식간에 휩쓸려 가버렸다는 점이다. 마루야마의 지적처럼 밤에 술을 마시면서는 모두들 군대 이야기를 하고 군가를 불렀다는 점이다. 아, 이거 어디서 익숙한 장면인데. 근데 한국은 아직도 모두들 군복무를 하지만, 일본군은 1945년에 끝났다는 점. 몸에 새겨진 경험이 이데올로기와 운동을 왜곡시키고,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이시모다 쇼石母田正가 주도했던 국민적 역사학 운동이란 알기쉽게 말하면 민중 속으로 내려가는 하방운동이고, 계몽운동 특히 농촌이나 노동자 계몽운동이다. 여기에 산촌공작대 같은 중국 혁명의 사례를 들어서 농촌에서 도시 포위 전략으로, 산촌에서 혁명 기지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인데, 젊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투신했다가 1955년의 육전협, 일본공산당 제6회 전국협의회가 의회투쟁으로 전환하면서, 농촌이 아닌 도시로 방향을 바꾼 점은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서 1950년대 초중반에 이 운동에 헌신했던 젊은 운동가들이 버려졌다는 점에 있다. 1964년에 나온 시바타 쇼의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 이런 이들의 좌절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 좌절은 일본 진보 운동 세력의 공산당 불신 및 급진화를 가져와, 신좌파의 등장과 연합적군 같은 극단적 모험주의의 씨를 뿌리게 된다. 더욱이 이런 국민적 역사학 운동 같은 민중 속으로 식의 운동 방식은 한국의 1970년대와 80년대의 운동 양상에서도 그 외형이나 방식이 자주 드러난다. 1980년대 중후반과 90년대초반 한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잠시 있었던 일종의 대안문화는 연구 가치가 많다. 아직 살아있을 때, 연구해야 하는데. 여하튼 일본과 한국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주고 받았다.
다케우치는 전후에 “노예와 노예의 주인은 같은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썼다. 이 말은 그가 1943년의 『루쉰』에서 인용한 “타인을 노예로 삼는 자는, 주인을 갖게 되면 자기가 노예임을 감수한다”라는 루쉰의 말을 고친 것이었다.(1권 125쪽) …… 노먼의 『일본에서의 병사와 농민Soldier and Peasant in Japan』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 “자기는 징병 군대에 소집된 부자유한 주체(에이전트)인 일반 일본인은,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 타국민에게 노예의 족쇄를 채우는 대행인agent이 되었다”라고 쓴 뒤에 노먼은 이렇게 덧붙인다. “타인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자유로운 인간을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반대로 가장 잔인하고 무치無恥한 노예는 타인의 자유에 대해 가장 무자비하며 유력한 약탈자가 된다.”(505)
다케우치 요시미도 종군했다. 그는 33살의 노병이었기 때문에, 낙오하기로 악명 높은 병사로 중국을 전전했고, 1년간 구류되었다가 귀국하게 된다.(503) 노예의 주인도 노예라는 이 표현은 헤겔과도 이어지지만. 자유로운 자는 자신을 노예화할 수 없고, 다시 말해 타인을, 즉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노예화했던 일본인들 스스로가 노예였다는 것은, 마루야마 마사오든 다케우치 요시미든 자신들 스스로가 경험했던 바였다.
요시무라[요시무라 쇼이치로吉村正一郎]에 따르면 “사실상 미국의 위성국이 된 현재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재군비는 불가피하며, 헌법 제9조는 군비 확장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었다. 이런 헌법관은 차츰 일반에도 침투했다. 1952년 2월과 1953년 2월 『아사히신문』 여론 조사를 비교해 보면 헌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10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퍼센트 증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점에 대해 “일본에 군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이제 사람들은 헌법 제9조가 군비의 전폐全廢를 요구하는 것도, 안보 조약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안심하면서 헌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공산당이나 사회당에 투표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지지’가 신장한 것과 병행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원수폭原水爆 금지 운동과 「경찰 직권 행사법警察職権行使法(경직법)」[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 반대 투쟁 등에서 보이듯, 진보계의 사회 운동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거기서 패전 직후와 같은 첨예함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56년에 마루야마 마사오는 “’신헌법’은 오늘날 상당히 넓은 국민 층에서 일종의 보수 감각으로 전화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 감각 내지는 수익감受益感 위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1947년에 자신이 말했던 “대학 출신의 샐러리맨층=인텔리라는 등식이 무너지고” 일본 사회의 구조 변동이 급격히 진행되는 중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1957년 마루야마는 시투아앵citoyen의 번역으로 과거의 공민이 아니라 시민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와 병행하여 전후사상의 침체가 일어났다. 전후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패전 시에 30세 전후였던 전후사상가들도 40세를 넘겼고, 그들을 지탱했던 전쟁 체험의 기억도 차츰 풍화되었다. …… 그리고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는 말이 『경제 백서』에 등장한 1956년에, 미소의 평화 공존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본의 유엔 가입이 실현되었다. …… 이런 체제 속에서 헌법과 자위대는 조금씩 정착했다. 혼란과 개혁이라는 ‘제1의 전후’가 끝나고 안정과 성장이라는 ‘제2의 전후’가 시작되는 가운데, 보수와 좌파 양족 모두에서 개헌론은 약해지고 헌법은 국민적인 정착을 보았다. 그것은 헌법의 이념이 철저해진 결과라기보다는 좌우의 정치 세력들이 서로 이념을 부딪히는 것을 보류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은 ‘단일’한 ‘민족’이나 ‘국민’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존재했던 시대가 끝나고, 혐오받는 기정사실로 바뀌는 시대의 시작과 병행했다.(597-598)
일본 헌법을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며, 그중 특히 9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언론이든 논단이든 종종 언급되지만, 평면적 읽기 만으로는 일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알기 어렵다. 일본에서 헌법 9조와 관련된 논의는 1945년 이후 정치사 전체에서 한 줄기 내지 기둥을 차지하고 그 의미가 변경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군비통제 장치 내지는 헌법의 보수화 내지 보수적인 이념으로의 이해는 공산당과 사회당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지만, 집권에는 아예 다가가지 못하는 만년 야당으로서 이익을 고유하는 관계로 전락시켰다. 500명을 넘나드는 의원정수에서 최소한 100석까지는 꾸준히 확보하지만, 과반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형태. 한때 혁신 지자체 운동으로 지방정부에서는 활약했지만, 결국 50년간의 1.5당제는 막상 변화가 와서 집권하게 되었을 때, 독자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자민당과 연립하다가 몰락하거나, 자민당을 탈당한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집권하다가 단기간에 몰락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정당으로서 성장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일 듯. 그렇기에 일본에서 평화헌법 수호 내지 9조 지키기는 외부에서 봤을 때와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일본에서 보수 정권이 연이어 가면서도 현행 헌법을 고치려다가 반복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고 실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후사상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 시기에 60년의 용어인 시민이 국민이나 민족 대신에 등장하게 된다. 오구마 에이지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1957년 citoyen의 공민公民에서 시민으로 바꿨다는 점을 언급한다. 자세한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일본에서 원래 공公은 천황, 천황가, 천황 주변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게 또는 공가公家란 천황를 모시고 조정을 이루는 가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도쿠가와 막부 시기에는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와 공가제법도公家諸法度(禁中並公家諸法度)라고 해서 교토 천황의 조정과 에도 도쿠가와 막부가 지켜야 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 당연히 무가제법도는 전국의 다이묘와 사무라이들이 지켜야 하는 법률이고. 막부 말기 공무합체公武合体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천황가와 도쿠가와 쇼군가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물론 공公은 공적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공민이라는 말이 천황의 신민을 곧바로 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으로 바꾸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국민, 민족, 시민의 삼파전은 한국에서도 아직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다케우치는 독립과 균질과 연대의 어감을 표현하는 경우에 ‘민주주의’를 피하고 ‘국민’이나 ‘민족’을 사용했다. 그것은 과거에 성전완수를 외쳤던 자가 민주주의로 안장을 갈아탄 여러 사레에 반발해서였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민주주의를 버린 지금은 ‘민주주의를 내면에서 전화하여 그것에 알맞은 내용을 국민 스스로가 부여하고자 결의했다”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에 미국과 보수 정권이 버린 헌법이 자주독립의 상징으로서 다시 읽힌 것과도 닮았다. 마루야마 마사오도 민주주의라는 말로 마찬가지 심정을 표현했다. 안보 투쟁을 혁명의 첫걸음으로 간주한 전학련 주류파 등은 ‘민주주의의 옹호’라는 슬로건에는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마루야마는 당시의 좌담회에서 “민주주의 옹호보다 안보 폐안廢案이 급진적이라던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미적지근하다는 생각만큼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내정과 외교를 어디까지나 인민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로 끌어 내리려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에서 급진적인 요구입니다”라고 말하며, “위에서 청사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자발적으로 운동・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수입형 제도가 아닌 일본의 독자적인 민주주의의 형태가 비로소 창조되어 간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마루야마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중시하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민주주의 창조라는 내셔널리즘을 주장한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위로부터의 청사진을 거부하는 심정을 표현한 말이며, 따라서 모순되지 않았다. 1960년 초여름에는 시민과 국민, 개인과 조직, 민주와 애국은 모두 동일한 현상과 심정을 표현하는 말일 수 있었다. 5월 29일 쓰루미와 다케우치 등이 모인 사상의 과학 연구회 확대평의회는 “지금 진행 중인 상태를 혁명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원이 거의 이론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 다케우치에 따르면 거기서 말하는 혁명이란 사회주의 정당의 권력 탈취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완성품이 아닌 과정으로서, 날마다의 실천으로서 파악하는 것” 내지 “국민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스스로 관행을 만들고 스스로 법을 만드는 훈련”을 의미하는 “일종의 정신 혁명”이었다. 다케우치는 그런 관점에 서서 “최종적인 권력의 탈취만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오히려 관념적이다”라고 주장했다.(635-636)
1960년의 뜨거운 여름에서 생각할 법한 말이다. 운동의 열기가 달아올랐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주권자라는 인식이 퍼져나간다. 2016년 겨울의 그 광장에서 느꼈던 것과 유사한 혹은 비슷한 순간이기도 하다. 개인의 창조성,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삶의 태도, 즉 민주주의의 내면화는 모두 바람직한 것이긴 하되, 여기에는 패배주의가 깔려있다.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 사건도 결국 안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결되고, 기시 수상이 사임하는 것으로 모든 사태가 끝난다. 패배를 정신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정신승리에 가까운 일이 마루야마 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쓰루미 슌스케 같은 사상가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정권을 바꾸고, 어떻게 제도를 수립할 것인가의 논의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주의는 군국주의가 이끌어간 무모한 전쟁에서 개인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심정의 재현이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은 지켰지만 사회와 정치는 여전히 바꾸지 못하고 흘러갔다는 점이다. 87년 한국에서 대중운동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양보 즉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내고도 막상 쿠데타 당사자이자 그 후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왔던 충격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공황상태에 빠졌다. 정권교체까지 그로부터 10년이 걸렸다. 일본의 경우는 개헌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물러선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이후 활동하던 전후사상가들이 급속히 쇠락하고, 쓰루미 슌스케는 상당기간 우울로 칩거하기도 한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활동은 줄어들고, 1968년의 충격으로 논단에서 사라진다. 이 시기부터 일본의 집요저음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집요저음 연구들은 실패에 대해 곱씹는 것이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항상 위에서 내려 준 반쪽이라는 한계가 계속 지적된다.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일본 같다. 안보 투쟁은 급속하게 사라지고, 고도성장의 대중사회가 도래한다. 1968년의 전공투는 대학, 대도시 일부 대학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1991년 강경대의 죽음으로 촉발된 그 봄과 여름의 투쟁이 급속하게 사라진 것에 대해서, 모두들 그만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1968년과는 다른 사상계가 모두 결합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호응했던 이 1960년 안보가 바로 그렇게 사라졌다. 기시 내각이 총사직한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는 64년 도쿄올림픽이 있었다. 아베가 물러나도 스가가 이어가고, 도쿄올림픽은 여전히 개최할 예정이듯이.
이런 와중에 ‘단일 민족’이라는 말의 용법도 변화했다. 이 말은 1950년대에는 형성되어야 할 목표로서 좌파가 주창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는 고대 이래의 기성사실을 가리키는 말로 보수 측이 주창하게 된다. …… 고도성장의 진전은 좌파의 논조에도 미묘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그것은 근대라는 말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광채를 잃고 비판 대상으로 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대신에 대두한 것은 근대화의 페혜인 공해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농촌 공동체와 토착 문화에 대한 재평가였다. 그와 함께 과거에는 공산당 주변에서 사용되었던 근대주의라는 비난 용어가 급속히 일반화되었다. …… 동시에 민속학과 고대사가 주목을 받았다. ……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기묘한 일이지만, 이런 동향에 맞추어 근대주의를 비판한 자들은 자기들이 사용한 말의 유래를 알지 못했다. 공산당에 비판적이었던 신좌익계의 젊은이들은, 이런 조류 속에서 그들의 말하는 “전후 민주주의=근대주의”를 오히려 비판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공산당에 반항하면서도, 그 반항이 공산당으로부터 주어진 언어 사용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동향과 병행해서 ‘메이지’의 평가가 변용되었다. 마루야마 마사오를 비롯한 전후 지식인들은 근대화와 국가 건설의 시대로서 메이지를 높이 평가했다. …… 그러나 1960년대 중기 이후로 이런 경향은 역전되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으로 고양된 내셔널리즘에 힘입어, 메이지 100년을 기념하며 메이지 재평가 캠페인을 개시했다. 물론 이 경우의 메이지는 혁명과 자유민권의 시대가 아니라, 국가의식과 원훈元勳들의 시대로 그려졌다. 좌파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이런 동향에 반발해 메이지 100년에 반대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이 시기부터 일교조도 애국심에 대한 반발을 점차 강화했다.(668-669) …… 1965년 무렵에 메이지는 보수 반동의 상징으로서 전후와 대치하는 존재가 되어 갔다. 1960년대 후반에는 …… 보수파 비평가인 에토 준이 메이지를 내세우며 국가를 이야기하고, 전후사상은 시라카바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그가 주장한 메이지 상찬과 시라카바파 비판이라는 도식은, 과거에는 마루야마 마사오와 다케우치 요시미, 혹은 공산당계의 문학가들이 주장했었다. 그러나 에토는 요시모토 다카아키와 신좌익의 젋은이들처럼 그런 언어 사용의 유래를 자각하지 못했다. 패전 직후의 전후사상은 총력적 체제를 비롯한 전시 중의 언어 체계를 변주하는 형태로 전쟁 비판을 표현했다. 그리고 1960년대의 좌우에서 이루어진 전후 민주주의 비판도, 전후사상의 언어 체계를 변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런 동향과 반대로, 1960년대 말에는 이전가지 메이지를 상찬했던 전후 지식인들이 다이쇼를 상찬하는 경우도 있었다.(670)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 말의 활과 창을 바꾸어 들게 된다. 그들의 말은 변용되어 상대의 수중에 넘어갔고, 새로이 말을 손에 넣은 이들은 과거의 이 말들의 용법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말도 메이지도 상찬과 비난 사이를 오르내렸다. 단순히 비슷한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근대주의 비판의 용어로 사용된 것이다. 농촌 공동체, 토착문화, 민속학, 고대사의 붐과 사라짐. 이런 요소들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전개되는 맥락과 용법 즉, 배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참고로 미셸 푸코는 1960년에 이미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의 일본은 포스트모던 붐을 이룬다. 나는 이 시기 일본에서 전후 민주주의를 근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전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1930년대 근대초극론과 닮아 있다고 혐의를 두어왔다. 서양을 배워서 서양을 극복했다 혹은 도전한다는 자세가 포스트모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이 아닐는지.
“관료화와 도시화라는 이중의 의미에서 근대화의 큰 물결이 이런 중간층의 자주적 기반을 이미 크게 씻어 내서, …… 이런 암전暗轉을 거친 메이지 30년대의 기독교도들이 ‘봉건적 정신’을 강조해 보아도, 거기서는 이미 민권 운동의 단계와 같은 역동적인 반응을 찾을 수 없다. 아니 다른 의미에서라면 반응은 있었다. 실로 메이지 30년 무렵부터 사상계에 대두하기 시작한 ‘무사도’ 붐이 그것이며 거기에는 분명히 청일전쟁 후의 국가적 자부심과 군국적 색조를 띤 복고 풍조의 반영이 보인다. ……. 사태를 냉혹하게 본다면, 이때 봉건적 충성의 강조는 실감의 범위 안에서는 이미 반동적으로 작용했으며, 반대로 저항의 발상과 결합된 한에서는 사회적인 기초가 없는 ‘황야’의 외침이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이때로부터 4년 뒤의 마루야마는 앞에서 말한 “대일본 제국의 ‘실재’ 보다도 전후 민주주의의 ‘허망’ 쪽에 건다”라는 “거의 자학적이라고 할” 말을 썼다. 그는 자신이 주창한 국민주의가 대중 사회 상황 속에서 어떤 운명에 빠져 있는지 아마도 “지나칠 만큼 잘 알았다”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이 두꺼운 책에서 마루야마 마사오의 말을 골라내는 걸 보면, 나는 확실히 마루야마 마사오를 좋아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앞의 인용문은 1960년 「충성과 반역」이고, 뒤의 ‘허망’은 1964년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증보판 후기에 실린 유명한 말이다. 마루야마는 메이지 시기의 자유민권 운동이 무사도와 봉건적 가치들을 차용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무기로 바꾸었다고 말했지만, (와타나베 히로시도 이를 따른다) 메이지 30년대가 되면, 이미 그것이 반동화되어서 다시 지배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자신은 전후 민주주의 ‘허망’에 건다고 했는데, 이 ‘허망’은 fiction을 가리키는 말이다. Fiction은 의제이고, 상상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 홉스를 따르든 베버를 따르든 전후 민주주의가 제창한 fiction으로서의 국민 쪽에 걸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국민은 이미 대일본제국의 국민에게 잡아먹힌 다음이다. 대중사회와 고도성장이 가져온 변화이다. 격변기에 형성되거나 재발견되어 권위를 가진 언어가 한순간 광채를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마치 지금의 한국은 ‘국민’이라는 말의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조금씩 허물고 있는데, people의 번역어로 인민이 쓰이는 것이 하나의 징후다. ‘민족’이라는 관념이 광채를 잃고, 뭔가 부족하고, 북한에 관련되고, 부담을 주는 말로 전락했듯이, ‘국민’이 광채를 잃고, 예전의 굴종과 획일을 뜻하던 관념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범람해서 지겨운 K-도 그렇고.
이런 배경 속에서 1960년대 후반에는 각자의 대학에서 분쟁이 이어졌다. 1965년 4월에 다카사키경제대학에서, 대학이 위치한 지역 출신을 우선시하는 위탁 학생 입학에 반대하는 학생이 단식 투쟁과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1966년 와세다대학에서 수업료 인상 반대 투쟁이 일어나 학생들이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 또한 1968년 니혼대학에서는 20억 엔의 사용처 불명금이 발각되어, 이것을 계기로 단독 경영자의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같은 해인 1968년 도쿄대학 의학부 학생들이 무임금 노동과 마찬가지인 등록의 제도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690)
대학 분쟁이 반드시 사회적인 투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촉발하는 지점들이 있다. 프랑스 68의 배경에 깔린 불만 중에 야간에 기숙사에 이성 출입을 엄격하게 막는 것이 있었다. 이화여대 입시에 관한 분쟁에서 시작되어 눈덩이처럼 번져간 촛불을 기억해 보라.
요시다[전공투계의 학생 요시다 가즈아키吉田和明]에 따르면 당시의 대학에서는 요시모토의 저작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걸어 다니는 여학생, 남학생의 모습이 유행했다”고 한다. 요시다는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 못해도 거기 담긴 메타 메시지를 “시라도 읽듯이”, “마음 깊이 느껴 버렸기” 대문이라고 말한다. 분명 요시모토의 글에는 당시 청년들이 선호하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윗세대의 위선을 비판하는 순수 지향, 괴멸적인 철저 투쟁을 주장하는 전투적 자세, 국가와 공산당이라는 권위에의 반항, 봉건적인 이에[家]와의 대결과 연애 찬미, 그리고 자립이라는 슬로건. 게다가 무엇보다도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좋을 길을 걷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요시모토가 품고 있던 주제는, ‘시라도 읽듯이’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 논쟁 상대를 비난하는 요시모토의 과격함이나 패배의 상처를 강조하는 자세, 전투적인 로맨티시즘도 그를 통쾌한 영웅으로 비추었다. 그리고 요시모토는 1959년의 평론에서 자기들 전중파를 전전파의 권위의 도전하는 반역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13권 490쪽). 이 당시 전공투의 젊은이들에게 널리 지지를 모은 사상가는 요시모토와 미시마 유키오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병역을 회피한 사실에 죄책감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황국 청년 이미지를 연출한 전중파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778-779) 요시모토의 세계관에서 볼 때에, 투쟁하는 전사자, 패배자, 방관자의 세 종류 사람만 있었다. 승리를 외치는 자는 방관자이며, 전사가 불가능하다면 괴멸적인 철저 투쟁 뒤에 패배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만이 요시모토의 사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요시모토에게 공명했던 전공투의 젊은이들은, 마치 패배를 자기의 목적으로 삼기라도 한 듯이 괴멸적인 철저 투쟁을 했다.(780)
파멸, 괴멸을 예상하면서도 철저한 투쟁을 계속하려는 자세를 어른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전공투의 젊은이들과 연합적군 같은 극단주의로 나아간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쳤다. 요시모토는 1972년 7월 연합적군에 대한 강연에서 자폭 특공대인 가미가제를 언급하면서, ‘이놈들한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열등감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3개월 후 요시모토는 사적인 것을 우선하는 것이 전후사상이며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해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생활 보수라는 흐름의 정착으로 길을 연다.(781-782) 괴멸적 투쟁을 선동하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이끌다가 막상 몇몇이 산화하고 투쟁이 실패하고 나니, 이들을 가미가제 특공대에 비유한 후에는 사적인 것을 내세우는 이 급변이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공명을 이끌어 냈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사상이나 평론을 내세우는 사람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는. 게다가 이 일본 특유의 미학, 자기의 길을 추구하다가 자멸해서 죽어버린 자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이 논법 만은 아무리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오구마 에이지는 이런 괴멸 투쟁의 선동의 배경에 요시모토 다카아키와 미시마 유키오 모두 병역 회피와 또래들이 특공대로 죽어간 데 대한 죄책감이 깔려 있었다고 평하는 것. 일종의 실현하지 못한 황국 청년의 주장이라는 것. 전쟁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달라졌을 텐데. 이런 주장들은 흐름을 타는 것에 불과하다. 전후 민주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포지션을 한 번은 과격한 투쟁 속에서 다른 한 번은 사적인 생활 보수에서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사람들은 탈정치화의 길로 간다. 68 이후 1981년에 프랑스 사회당은 비로소 집권한다. 미테랑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2기에 걸쳐 14년간이었다. 독일 사민당은 기민당과 대연정을 고리로 단독집권과 연정을 통해 권력을 교대해 왔다. 영국도 미국도 모두 마찬가지. 마치 마지막 힘을 쏟아내는듯 괴멸적 투쟁에 돌입하고는 힘을 모두 소진해서 미련이 없다는 집으로 돌아가는 만화 같은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진 것은 55년 보수합동에 의한 체제의 강고함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갈길도 분명하다. 승리를 위한 투쟁이 아닌 투쟁을 위한 투쟁이 끝난 것이다.
이시하라와 오에는 대조적인 길을 걷게 되지만, 그들은 무의식의 레벨에서는 공통된 심정을 품었다. 그 무의식의 형태에는 그들 소국민 세대 특유의 특징이 있었다. 전쟁과 죽음의 공포감이 때대로 성性과 자연의 이미지와 결부되었던 점이다. 전쟁의 상흔은 그들보다 윗세대인 전전파와 전중파의 경우, 회한이나 굴욕과 같은 사회적인 기억으로 새겨졌다. 그러나 패전 시에 10세 전후로, 자기의 체험을 위치 지을 사회적인 언어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소년 소녀들은 보다 추상적인, 표현되지 않은 억압감으로서 전쟁의 압력과 죽음의 공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소국민 세대의 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사로서 죽을 것을 교육받았다. 그것은 동경과 동시에 공포이기도 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를 겉으로 드러내고 공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의 내심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그런 탓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무의식 중에 억압했다. 그리고 그들의 2차 성징기가 전쟁과 겹친 까닭도 있어서, 억압된 죽음의 공포는 종종 성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각인되는 형태가 되었다. …… 물론 이것은 소국민 세대의 인간 전부에게 반드시 공통된 현상을 아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작가 가운데서 종종 보이는 현상이기는 하다. 오에 겐자부로 역시 1959년에 「우리들의 성의 세계われらの性の世界」라는 논고에서 “전쟁의 공포”는 “과거 한 번도 전장에 나간 적이 없는 나에게는 항상 격렬하게 성과 결합된다고 생각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죽음과 성의 이미지 결합은, 연장자들처럼 전쟁의 공포를 언어화할 만큼의 체계적인 언어를 갖지 못했던 소국민 세대의 내부에서는, 신화처럼 혼돈된 기호의 난무로 기억되었다. 그것은 억압된 공포가 무의식 속에서 비합리적인 꿈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과도 닮아 있었다.(802-803) 오에 겐자부로도 1950년대부터 반복해서 핵전쟁에 따른 죽음의 공포를 이야기했다. …… 에토 준도 죽음에 대한 집착이 강렬했다. …… 전후에 대한 위화감과 허구감, 공적인 가치의 희구, 미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죽음, 성, 자연에 대한 공경과 공포 등은 앞으로 검증할 바와 같이 에토 준을 항상 따라다녔던 주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에토 만이 아니라. 오에나 오다 등 소국민 세대의 문학가들에게 공통된 경향이기도 했다. 그리고 에토는 오에와는 대조적이며 이시하라보다 정교한 형태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애국의 논리를 구축해 나간다.(804-805)
전후사상에서 에토의 특징은, 구세대의 올드 리버럴리스트와는 달리 자기의 아이덴티티 문제에서 보수사상을 세워 간 점에 있었다.(856) 그러나 에토의 특징은, 생모의 죽음이 전쟁의 개시와 겹쳤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패전과 겹쳤다는 우연에서, 이런 양가성과 거부감이 ‘집’의 문제와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에토가 단순히 국가에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전사에의 동경을 이야기할 뿐이었다면 젊은 세대에게는 시대착오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숙이나 자기 동일성의 문제로 국가를 이야기하는 에토는, 고도성장 이후의 사회 변동에 당황하던 젊은 세대의 공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 …… 에토의 평론은 지극히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 전쟁과 패전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한 소년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자아 찾기로서의 보수 내셔널리즘이라는, 전 세대의 보수론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언어 행위가 그렇듯이 에토도 과거의 언설을 변주하는 형태로 새로운 언설을 만들어 냈다. 신세대의 대두와 고도성장으로 민주와 애국의 공존 상태가 붕괴해 갈 때, 에토는 그 나름의 방법으로 전후 일본의 보수 내셔널리즘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태로 바꾸어 냈다. 그 속에서 과거에는 전시 중의 일본을 비판하는 준거점이었던 메이지나 전사자가, 전후의 일본을 비판하는 준거점으로 바뀌어 갔다.(857-858)
이시하라 신타로, 오에 겐자부로, 에토 준, 오다 마코토는 모두 소국민 세대로 분류된다. 군대와 전쟁 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자라나다가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져버러니 10대 소년들. 이들의 전쟁 경험에 대한 해석은 성의 이미지와 죽음과 결합된다고 오구마 에이지는 해석한다. 전후 비평가들에 대해서는 김윤식을 통해 약간 들어본 것이 전부라(『내가 읽고 만난 일본』) 오구마의 해석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다만 자기찾기로서의 보수 내셔널리즘이란 흥미롭기 이를 데 없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사자를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 사자와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를 확인하는 것, 과거가 현존함을 증거 짓는 것”, “내 쪽에서 일본을 향해 간다.(846-847)
쓰루미는 “나는 나의 패배주의를 웅크리고 앉아서 지켰고, 스스로의 올바름에 대해 확신을 가졌지만, 동시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 미학적으로 흉하다고 느꼈다”라고 회상한다. 그리고 외골수 소년 비행병들을 그린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울음이 나온다고 말하며 “전쟁 시절, 그런 외골수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켕기는 감정을 계속 가졌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회상에서는 전시 중의 심경을 “이미 많은 지인들이 죽었기에, 살아남고자 생각하는 것이 모독처럼 느껴졌다”라고 쓴다. 이런 전중파다운 심정이, 그가 탈주하지 않았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쓰루미는 이 전쟁 영화론에서 “정말로 힘내서 싸운 사람들에게 대해 나는 어떤 반감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군인, 관료, 정치가, 실업가들에게 미움을 느긴다”라고 말한다. 그 가장 가까운 예가 그의 부친이었다.(873) “나는 이 섬을 지배하는 관료 조직의 말단에서, 내 위에 있는 무게를 현지인에게 더욱 가혹하게 전달하고 있다. 내 스타일은 동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같은 권위를 짊어지고, 두세 마디 짧은 현지어로 명령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쓰루미의 전쟁 체험에서 피해와 가해는 표리일체의 관계였다. …… “백인 여성은 장교에게는 몸을 허락하고, 우리에게는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황색 인종에 대한 권위로 대한다.”(875) 스루미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단순히 재단할 수 없게 되었다. 애시당초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발상조차 의심스러웠다.(876) 쓰루미는 천황의 명령에 따른 전쟁 종결이라는 형태에 강한 실망을 느꼈다. ……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일본의 민종은 천황이 명령한 패전을 간단히 받아들였다. 게다가 점령군의 도착과 함께 어제까지 성전을 외쳤던 지식인과 위정자가 민주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했다. 1942년 쓰루미가 체험한 것과 닮은 언어 체계의 전환이 또다시 일어났다. 후에 쓰루미는 “전후의 민주화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나에게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발성의 결여라는 것이 뒷면에 붙어 있어서 전시보다 더 큰 절망감이 들었다”라고 회상한다.(877)
쓰루미 슌스케는 1922년 생으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또래라고 한다. 그는 하버드에서 유학하다 귀환선을 타고 돌아왔고, 해군 군속으로 자바의 위안소에서 근무하다 건강이 나빠져 일본으로 송환되어 살아남게 된다. 해군 군속으로 있던 시절 사람 만은 죽이지 않겠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자살하겠다고 독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드물게 전쟁 시의 경험을 기록하여 남겼고, 시민 운동을 떠나지 않았으며, 특히 전공투 이후 오다 마코토와 함께 베헤렌(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을 주도하며, 조직 없고, 주도하는 이가 없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이끌었고, 미군 탈주병의 도피를 지원하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싸웠던 인물이다.
말들이 호명들이 난무하고, 기세 좋게 올라섰다가도 부침을 반복하는 시대다. 어떤 말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지, 무엇을 지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은 이미 오염되고 퇴락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말을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바꿔쓰게 될지. 바꿔읽으면서, 말들이 움직이는 언설의 장에서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사라지는 말이 있고 살아나는 말이 있고.
오구마 에이지의 『1968上下』를 읽고 싶어졌다.
2021. 4. 7.
* 괄호 안의 숫자는 번역서의 쪽수이다.
** 이 글의 저작권은 ⓒFELIVIEW.COM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