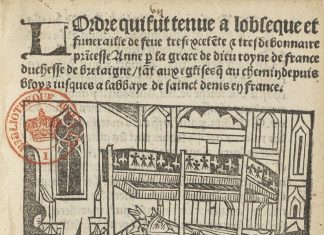기노시타 준지가 소개하는 무겐노의 이즈츠의 한 장면이다. 이것 만으로는 이해불가지만, 가부키와 노의 세계는 일본을 알려주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 책에선 부각되지 못했지만.
加藤周一 外著(加藤周一・丸山真男・木下順二・竹田清子), 『日本文化의 숨은 形 日本文化の隠れた形(かた)』, 김진만 역, 소화岩波書店, 1995(1984, 1991, 2004).
원래 이 글들은 국제기독교대학ICU의 다케다 기요코竹田清子가 개최한 연속강연의 기록이다. 실제 이 강연히 행해진 것은 1981년 6월. 이때 강연의 주제는 융의 원형archetypes으로 일본 문화를 보려는 시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발표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도 융을 통해 일본문화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archetypes의 번역어를 찾는데 그것이 ‘숨은 형かくれた形’이다. 원래 기노시타 준지와 다케다 기요코는 ’かくれた型‘를 제안하였지만, 마루야마 마사오가 ‘型’은 고정적인 느낌이 있으니 ‘形態’가 어떻냐고 제안해, ‘かくれた形’이 되었다.(8-9) 이를 직역하면 ‘숨겨진 형’에 가깝다. 뭐든 수동형으로 쓰는 것이 일본인의 심성을 더 잘드러내는 느낌이다. 숨겨진, 숨어 있는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실린 세 사람의 강연 내용은 그 층위과 관점이 제각각이라 연속강연이나 한 권의 책으로 묶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세 사람 각각의 면면을 본다면 도저히 묻어두기 어려운 글들이다. 머리말과 후기를 보면 이 연속강연의 기획자이자 편집자인 다케다 기요코가 셋을 엮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느낌이 가득하다.
다케다 기요코는 머리말에서 자신의 고민을 밝힌다. 우선 융이란 도입에 불과하고 실은 일본인의 발상 형태나 내발적 사고양식의 특징을 생각할 때, 집단적(집합적) 무의식의 기층에 사상과 행동의 어떤 타입, 어떤 패턴의 양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객관적 사실로만 다루든. 이 집단적 무의식의 기층을 포착하려는 여러가지 시도가 있고, 거기에 공통적인가설이 비합리적, 일본 특유의 특수주의적, 폐쇄적 성격이라는 것. 설명 방식은 다양한다. 가족주의적 공동체관에 입각한 집단주의, 무라村의 장長이 동시에 종교적 권위이기도 신인합일神人合一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관, 샤머니즘, ‘무라’의 원리, 천황제적天皇制的 가치의식 등이다.(10)
다케다 기요코는 호리 이치로堀一郎를 언급한다. 대담집 『두 개의 일본』의 ‘종교적 특성과 일본적 아이덴티티’, ‘심층적인 일본의 성격’ 등도 그 예다. 다테마에建前와 대조해서 사적인 것, 혼네本音가 대치되고, 지식인의 지적 버팀이라고 해야할 합리주의적・규범주의적인 것에 대해 심정적, 비합리주의적인 것이 대치된다. 그리고 샤머니즘과 같은 카리스마적・주술적인 것에 자기를 위양委譲하는 정감문화. 호리 이치로는 일본인은 합리적 사고보다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보다 감정적이며, 사소한 일로 불끈하고, 쉽게 인격 위양을 할 수 있다. 천황제가 사회구석구석에 침투되어 도처에서 소천황제를 형성하고, 신인합일의 관념이나 조상 윗사람에 대한 은혜화 보은의 강조, 죽음 사람死者을 을 호토케仏라고 부르는 민간용어 등에 의해 상징되는 인간이 쉽게 신화神化되는 현상을 보면 잠재적 주술적 카리스마의 기능이 민중 사이에 뿌리깊이 존재한다. 그는 또 현대의 새로운 종교 운동이나 이데올로기가 부추기는 격정적 상황 속에서 근대화의 탈을 쓰고 마르크시즘이나 마오毛이즘의 의상을 빌려 입은 고대의 주술적 카리스마로서의 지도자와 주술・종교적 카리스마 지배에 일시적・심정적으로 인격 위양을 하고, 그 지배에 복종하려는 샤머니즘적인 성聖의 변증법을 양극으로 분화한 잔존 현상을 엿보는 것 같다며, 일본인의 정신 구조에 고대 샤머니즘의 그림자는 의외로 짙고 깊다고 평가한다.(10-12)
다케다 기요코는 세 강연을 간단히 요약하지만,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루야마 마사오다. 다케다 기요코는 ‘역사의식의 ‘고층’’이라는 글을 언급한다. 이 글은 1972년 치쿠마쇼보筑摩書房에서 간행한 『歴史思想集』에 실렸다가, 같은 출판사에 간행한 『忠誠と反逆』에 실린 글로 한국어로는 박충석・김석근 번역의 『충성과 반역』에 실려 있다. 학술명저번역사업으로 나온 책들이 늘 그렇 듯 이 책도 절판이다. 여튼, 알아서 구해보시라. 그리고 또 하나 1977년 마루야마가 국제기독교대학 심포지움에서 ‘마츠리고토의 구조’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고 언급한다.(13) 마루야마의 정치의식의 구조를 말하는 이 글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다. 여러 번역이 있고, 출판된 것은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2005). 원래 1984년 『百華』에 실렸던 것을 1994년에 『現代思想』 다시 수록한 것이 알려져 있고, 지금 국내에 번역된 것도 그것인데. 원래 마루야마는 ‘The Structure of Matsurigoto’라는 글로 영문으로 발표했고, Themes and Theories in Modern Japanese History: Essays in Memory of Richard Storry(1988)에 기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원고를 1977년 국제기독교대학에서도 발표했었다. 아마 이것이 처음일지 아니면 그 이전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그의 유명한 집요저음basso ostinato가 처음 나왔다. 이 책에도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흔히 ‘윤리의식의 고층’으로 알려진 글이 있다. 이 책의 맨마지막에도(114) 영문 논문 밖에 없다고 한 글인데 ‘Some Aspects of Moral Consciousness in Japan’이라는 글로 1976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처음 발표하고 곧이어 하버드 옌칭에서도 발표했던 원고다. 영문원고는 PDF판으로 됴코여자대학의 마루야마 마사오 기념 비교사상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일본어판은 『丸山真男集 別集 第三卷 1963~1996』에 「日本における倫理意識の執拗低音」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마루야마의 아래 강연에서 말하는 일본사상에서의 고층 또는 집요저음 삼부작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 실린 ‘원형・고층・집요저음’(集十二)과 ‘일본사상사에서 ‘고층’의 문제’(1978년 게이오에서 한 강연, 集十一) 그리고 ‘역사의식의 ‘고층’’(集十)’, ‘마츠리고토政事의 구조’(集十二), ‘일본에 있어서 윤리의식의 집요저음’(別集三)을 모두 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들은 모두 마루야마 마사오가 1970년대 중후반에 파고든 주제들이다. 이런 연구가 발표되자 심지어 마루야마가 전향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다케다 기요코가 말하는 대로, 마루야마의 『일본정치사상사연구』에서 소라이학의 ‘자연’과 ‘작위’를 논하고, 사유의 근본구조라며, 중층성을 말할 때,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새삼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다케다 기요코는 중층성에 대해 와쓰지 데쓰로의 「일본 정신」이라는 1934년 논문을 언급한다. 와쓰지 데쓰로는 일본 문화의 특성을 여러겹으로 겹쳐있는 것이라며, 일본은 병존nebeneinander의 나라라고 한 어떤 독일인의 표현을 언급하면서, 민감하게 새 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충실하게 옛 것을 보존하는 민족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 논문은 메이지 이후 서양문화를 흡수하면서 중층적인 일본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부정하던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여져서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일본의 민주화 과정이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주읮거 초국가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양상을 띄다가 이제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 전후의 민주화・근대화를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전통적인 것을 옹호, 부활시킬 것을 제창하는 움직임이 등장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14-15) 가토 슈이치와 마루야마 마사오 이런 점에서 역시 주목할 만한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제 일본에서 이런 지식인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인들은 남아 있다고 해도, 사회 분위기가 자신감을 잃고 우경화하는 것은 어찌보면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서 두렵다고 할까.
가토 슈이치加藤周一, 일본 사회・문화의 기본적 특징.
카토 슈이치의 강연은 이렇게 시작한다. “문이 닫히오니 문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요즘엔 한국에서도 흔한 이런 류의 방송에 대해 가토 슈이치는 고장이 나지 않는 한 문은 닫히며, 문이 닫히지 않을 때나 방송을 해야하는 것이고, 문틈에 끼지 말라는 유치원 소풍 때나 할 일이라고 남에겐 없지만 일본에만 있는 현상 중 하나라고 말한다.(19)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실제 독일이나 영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행선지나 알려줄 뿐이지. 좀 오래 열려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법인데. 한국과 일본에는 유독 저런 방송이 많다. 그렇지만 저런 방송의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은 좀 다르다. 한국은 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세한 설명을 한다. 때론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한다. 예를 들면, 요즘은 지하철이 설 때, 스크린 도어와 맞추지 못해서, 조정하기 위해 후진할 때, 그걸 방송으로 고지를 하고서 한다. 그런 정도는 그냥 해도 되지 않나. 뭐랄까 사회에 너무들 상전이 많아진 느낌이다. 너도나도 자신이 상전이라면서 뭔가 대접받으려는 분위기가 그런 방송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제 오랜만에 지하철로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전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큰 몇 군데서 내릴 때, “발조심, 발조심, 발조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뚜렸하게 들렸다. “이번 정차역은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어쩌고 하는 느긋한 방송이 아니었다. 얼마전에 판결의 영향인 건가. 지하철이 낮에는 노인의 운송수단이 된 현실에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다. 그리고 말이지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나쁘지 않다.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가난한 사람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된다. 그게 훨씬 더 나쁜 일이다. 재작년 일본에 갔을 때, 일본어를 잘 못하는 나도 알아들을 정도로 놀란 일이 있었다. 지하철은 JR이건 도영 Metro건 간에 워낙 방송 내용이 많아 신경쓰기 어려웠지만, 아카사카에서 어디 있다는 커피숍을 찾아가려고 밤에 버스를 탔을 때였다. 한 9정거장인가 10정거장 정도일까. 다음 정거장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매번 “버스 안에서는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해주시고, 통화는 짧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방송하는 거였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 도영버스인데. 이런 방송을 매일매일 매번 듣고 사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싶었다. 뭐랄까 일본사람들의 공중도덕 일본말로 マナー라는 것도 어쩌면 만들어진 거구나 싶고.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 말하는 쓰레기 분류의 복잡함에 대한 이야기가 새삼 떠올랐다. 한 줄 읽다가 너무 나간건가.
가토 슈이치는 일본사회를 이해하기 위핸 패러다임으로 첫째 경쟁적인 집단주의competitive groupism, 집단 안에서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룹 간 경쟁으로 특징지워지는 집단지향성, 둘째 그와 연관해서 현세주의this-worldliness, 문화의 차안此岸성, 일상생활의 현실 밖에 또는 그것을 넘은 가치나 권위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것, 셋째, 시간 관념과 관련해 현재를 존중하는 태도, 옛날 일은 걱정하지 않고, 불편한 것은 재빨리 잊어버리는 일종의 국민적 건망증national amnesia.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현재주의. 넷째, 상징체계의 문제. 마지막으로 일본사회가 가진 특징이 외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언급한다.(20)
첫째 집단주의. 일본 집단의 원형을 두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는 이에家이고 다른 하나는 무라村이다. ‘이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내쫓는 경우는 없다. ‘무라’는 규칙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내보낸다. 무라하치부村八分다. ‘무라’의 첫번째 특징은 순응주의conformism으로 모두가 똑같이 되고 싶다는 욕구이다. 둘째, 소수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의 일치가 이상이며, 소수의견은 불행한 사고로 수용하지 않는다. 셋째, 집단 내부의 구조가 엄격한 상하관계로 성립되어 있다. 일본의 ‘무라’에는 ‘수평’의 인간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 사회학자 R. P. 도어는 일본의 집단 구조는 경사진diagonal 인간 관계라고 했지만, 경사보다 수직의 요소와 수평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일본의 인간관계를 평등화 방향으로 진일보시킨 제1단계는 메이지 유신, 제2단계는 점령하에 시작된 평등주의지만, 철저해진 것은 원래 일본의 토양에 평등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평등・박애 중 자유, 특히 개인의 자유는 전통적인 집단주의와 정면으로 대립하기에 다테마에建前로서의 자유주의나 인권존중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본 사회에서는 철저하지 않았다. 전후의 개혁 중에서 일본 사회에 잘 정착한 부분은 원래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 소수의견의 존중, 개인의 자유가 정착되지 않은 것은 그런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애, 프랑스 혁명 때의 fraternité는 형제애라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횡적관계인데, 프랑스 혁명 때는 프랑스 국민의 단결을 뜻한다. 일본은 너무 지나쳐서 문제다. 네번째 특징은 경쟁으로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서유럽과 북아메리카(뉴 잉글랜드)는 물론 다른 아시아 사회와 다른 점도 일본의 집단들이 지나치게 경쟁적이라는 점이다. 닛산과 도요타, 교토대학과 도교대학. 집단 속에서 출세하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하고 휴가도 가지 않는다. 가장 단순한 유형이 스포츠 시합이다. 귀족과 같은 신분집단과 달리, 상호 경쟁이 심한 집단은 목표 지향적 집단이다. 경쟁에 이기려면 능률이 필요하며, 경쟁 집단 내부에 능력주의가 생긴다. 이 능력에는 동료와 잘어울리는 능력도 포함된다. 극단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능력도 있다. 신분적 집단이 정적인데 반해, 근대 일본의 전형적인 집단은 활동적이고 때로 공격적이다. 과거의 육군이나 오늘날 기업이 똑같다. 그 활동적 집단은 내부 경쟁이 너무 격렬해서 집단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구조이나 개인 책임자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 회사의 사장마저 반드시 책임지지 않는다. 성공이나 실패 모든 것이 회사 전체의 책임이다. 이것은 나라 전체에도 마찬가지여서 15년 전쟁도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전쟁책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전쟁 책임은 일본 국민 전체가 지는 것이지 지도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일억총참회一億総懺悔’란 담배가게 아줌마도, 도조 수상도 일억 분의 일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영에 가까워서 결국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같다. 마루야마가 「일본정치의 심리와 논리」에서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교재판을 비교할 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책임자가 있느나, 나치의 지도자들은 책임을 인정하나, 일본의 전쟁지도자들은 모두 자기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전쟁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한다. 도조 내각에 전쟁을 할 의사를 가진 각료는 한 사람도 없었다. 독일과 달리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강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본인에 의한 전쟁범죄재판은 한 번도 없었다. 일본에서는 지건 이기건 어떤 짓을 해도 책임은 집단 자체에 있고, 개인에게는 없다.(21-26)
가토 슈이치는 일본의 집단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책임에 이르기까지 한 호흡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그의 이야기 중에 몇몇 눈여겨 볼 구석이 있다. 전후에 자유와 평등 모두가 점령군에 의해 강제되었지만, 원래 그 뿌리가 있었던 평등주의는 나름 정착했으되, 자유는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유가 정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천황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집단 간 경쟁이 무엇보다 강하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어떤 분야에든 라이벌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요소가 일본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주장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경쟁은 전국 시대는 물론 그 이전부터 도쿠가와 이후까지 이어지는 무사단과 가신단 간의 목숨을 건 경쟁의 유산인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일본에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내부에서 동료와 어울리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형태가 육군이라고 지적한다. 육군 내부에서의 경쟁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군과의 경쟁심이 매우 컸다. 전쟁을 점점 수렁에 몰아넣은 것이 육해군 간의 경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는 놀랍게도 개인 책임의 실종을 가져온다. 이는 집단에게는 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다이묘와 가신단에게 책임을 물어 작은 영지로 강제 전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 할복을 명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물으면 그것은 결국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그러니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 주식회사가 바로 그런 제도가 아니던가.
‘일억총참회一億総懺悔’에 대한 가토 슈이치의 비판은 날이 서늘할 정도다. 패전 후 아주 잠깐 주장되었던 ‘일억총참회’를 보통은 일본인들이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가토는 정반대다. 책임은 책임질 사람들이 분명하게 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일억총참회’를 말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특별한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의 주장은 전쟁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면책을 가져왔다. 쇼와천황이 건재하고, 전전의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곧 다시 돌아왔다. 옷만 바꾸어 입고.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도 종종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역시 박근혜, 이명박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의 모든 구현은 아니더라도 시발점은 된다. 한국과 일본은 얼핏보면 아주 비슷한데, 자세히 살피면 꽤나 다르다.
이런 집단 속에 편입되어 거기에 속한 개인은 집단 그 자체가 세계이며, 집단 또는 사회 또는 지금 이 세상, 즉 차안此岸이다. 일본 문화의 셰게관은 차안적・일상적・현실적이다. 죽은 사람의 혼은 마을 근처의 산에서 마을을 지켜보다가 특정한 기회에 자기 마을로 자기 가족으로 돌아온다. 살아 생전의 집단에 대한 소속성은 죽어도 변치 않는다. 소속성은 죽음보다 강하며, 사후 세계 역시 집단의 연장이다. 차안에서 단절되어 존재하는 피안은 없다. 가족, 마을, 차안, 이것이 궁극의 현실이다. 이런 세계관에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에서 피안성을 빼앗고 현세이익, 차안적 효용쪽으로 변해간다. 도쿠가와시대에 불교의 세속화가 철저해지며, 정치권력과 결합된다. 정치・윤리적 가치체계, 혹은 문화적・예술적 표현은 17세기부터 세속적이 되었다. 유교윤리 역시 차안적이며, 문학 작품, 회화, 불교적, 종교적 모티프는 극히 적다. 당시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 문화는 불교적이고 유럽에서는 교회의 마녀사냥이 한창인 시절, 일본에선 배타적이고 교조적인 종교체제는 벌써 죽고 없었다. 세속적인 문화는 일본의 실용적인 기술주의(니노미야 손토쿠부터 전후 GNP신앙까지)와 향락주의의 공통되는 배경일 것이다. 미우라 바이엔과 니시타 기타로를 제외하고 도쿠가와시대 이후 일본이 추상적・포괄적 형이상학을 배출한 적이 없다. 개인이 집단에 편입되어 얽매인 조건에서는 그 소속집단, 구체적으로 집, 마을, 번, 국가를 초월한 어떤 권위나 가치에 헌신, 참여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니 개인이 집단의 이익에 대해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집단에 대한 고도의 편입 태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일본문화의 하나의 특징으로 집단을 초월한 가치가 결코 지배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메이지 이후의 지배층은 천황을 절대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천황은 곧 국민의 상징이며, 천황의 절대화는 집단을 초월하는 가치의 절대화이기는커녕, 집단 그 자체의 절대화이다.(26-28)
차안과 현실주의는 실제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상자론 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소속성은 혼령에까지 적용된다. 조상 제사란 혼령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신앙체계는 훨씬 복잡하다.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경우 혼령이 돌아온다고 보지 않는다.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도 저승에서 되돌아온다고 말하지, 근처 산이나 가까운 곳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단순히 가족에 종속된다기 보다 혈육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무라’ 또는 가족에 귀속된다. 피안의 초월적 세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배타적이고 교조적인 종교체제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 집단을 위한 죽음이 많은 것을 보면. 한국에서도 비리나 부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종종 자살을 택하지만, 일본과의 차이점이라면, 책임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까. 일본에서 사령관이나 사장, 회장이 자살했다기 보다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살리기 위해 중간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집단을 초월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독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초월적인 가치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한때나마 유행할 수 있었을까. 한해 수십만의 신자를 얻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나 일본에선 금교의 영향으로 씻은 듯 사라졌다. 반달 등 게르만의 침략이나 사라센 등 이슬람의 침공이 아니고선 그리스도교가 씻은 듯 사라지는 경우도 흔치 않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천황에 대해서 집단 가치의 절대화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곳곳에서 소천황제가 나타난다. 천황제에 대한 이 평가는 곱씹을 부분이 많다.
초월적 가치에 속박되지 않는 문화에서는 종교전쟁도 유토피아사상도 혁명도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적인 행동양식으로 자각 없는 편의주의opportunism, 대세 순응주의가 전형이 된다. 예술적으로 보면 전체의 질서보다 부분적 감각의 세련이 강조,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는 미적 가치도 초월하지 않는다. 세부를 떠나 전체에 질서를 지어주는 원리도 없다. 부분강조주의의 전형으로는 헤이안 시대의 가나모토가타리仮名物語나 17세기 초 다이묘 저택의 평면도를 들 수 있다. 『宇津保物語』는 단편을 축적하다 보니 자연히 전체가 된 것이고, 다이묘 저택은 증축, 곧 부분에서 출발해 전체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존중주의라는 공간에 대한 일본인의 사고방식이다. 이와 병행 관계에 있는 것이 현재의 병렬적 계기로 표상되는 시간의 개념이다. 현재로서의 오늘이 또 하나의 현재로서의 오늘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시간도 끝도 없고, 창세기도 종말론도 없다. 『古事記』의 창세기도 외국의 영향 하에서 쓰여진 것일 뿐, 일본 토착의 시간관념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일본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고, 언제까지든 현재가 계속된다. 이런 시간 관념을 잘 반영하는 것은 12~14세기에 활발하게 만들어진 두루마리 그림絵巻物이다. 길고 가느다란 말이로 전람회에서 일부밖에 볼 수 없다. 이야기의 전후가 단절되어서 끊임없이 현재만 보게 된다. 유럽 중세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이란 시간적으로 긴 사건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다. 이러한 시간적 경과의 공간적 표현은 일본에는 없다. 두루마리는 별안간 무언가 나타난다. 너무 우물쭈물하지 않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응의 연속이다. 현실 세계도 상황은 변한다. 일본에서 상황은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 갑자기 나타난 변화, 갑자기 나타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재빨리 반응하는 기술-심리적 기술이 발달한다. 이것이 絵巻物에마키모노의 시간관념에 집약되어 반영되어 있다. 일본의 외교가 그렇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여 북경 정부의 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1972년 봄 닉슨 정부의 중국 접근이 시작되자 반 년이 지나기 전에 다나카 수상이 북경 정부를 승인해 버렸다. 이는 장님 검객 자토이치座頭市외교라고 할 만하다. 장님은 눈이 멀어 적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지만, 칼이 든 지팡이가 닿을 정도로 상대가 다가오면 빠른 속도로 반응한다. 장님과 일본 외무성의 행동양식은 근본적으로 닮았다. ‘닉슨 쇼크’에 뒤이어 ‘석유 쇼크’. 쇼크가 많은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과 같지만, 반응은 빠르고 적절하다.(28-33)
가토 슈이치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현재주의로서의 부분 강조주의다. 일본 특유의 두루마리 그림인 에마키모노絵巻物를 예로 든다. 헤이안 시대와 가마쿠라 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긴 두루마리의 그림인데. 너무 길어서 전시회에서도 일부 밖에 볼 수 없다고 한다. 원래 조금씩 펼치고 다시 말아가면서 보는 것이다. 이야기는 항상 부분적이고,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게 된다. 전체적인 구조가 있다기 보다는 부분의 집적이 전체를 이룬다. 헤이안 시대의 가나모노가타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현재만 보인다는 그런 의미다. 가토 슈이치는 이를 유럽 중세의 종교화와 비교하는데. 이런 거대한 그림에서는 천지창조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거쳐 종말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시간 프레임을 한 장에 담아내고 그려낸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전통 그림이나 문화는 부분과 현재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는 그런 현재주의와 즉응주의, 편의주의를 일본 외교와 비교한다. 1972년의 미중의 접근은 일본 외교에 쇼크였겠지만, 다나카 내각은 순식간에 북경 정부를 승인한다. 한국이 중국을 승인하는데는 이로부터 17년이나 더 걸렸다. 이런 점은 일본 외교나 대외정책의 특징 중 하나다. 상황이 변화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의 정책 노선을 바꾸어 나간다. 가토 슈이치는 어떤 점에서 이것도 일본에서 하나의 원칙이나 방향성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본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전쟁책임이나 외교정책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일본의 집단 내부의 질서유지 장치로서의 규칙체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극단적인 형식주의로 독특한 의식과 명목 존중의 습관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복잡한 의식체계가 그것이다. 선물 주고받기, 도장 찍기.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데도, 관청은 만족한다. 실질적 의미가 없어져도 의식적인 형식은 남는다. 명목주의는 말이 가리키는 물건이나 현실보다 말 자체를 존중하는 풍습이다. 일본은 문자의 나라니까 이름이 중요하다. 일본 관광객들은 몽블랑에 안개가 껴도 사진만 찍으면 만족한다. 일본의 과자이름은 문학적이다. 의미와 명목의 복잡한 상징체계가 있고, 극단적인 형식주의가 있어서, 집단의 구성원이 질서를 지키는 한 집단의 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 형식 또는 규칙은 지키기만 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집단 속에서 잘 되어가도록 개인의 안전은 보장된다. 대세 순응주의자에게 일본 사회는 매우 안전한 사회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 혹은 주관적인 기분 존중주의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다. 범죄나 사건도 동기가 중요하다. 본인의 ‘기분’이나 ‘마음’의 문제다. 일상생활에서도 ‘악의’가 아니라고들 말한다. 15년 전쟁 당시 전쟁을 찬미한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実篤도 군벌에게 속았고 악의는 없다고 말했다. 기분, 마음의 존중, 이심전심을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사고 방식은 작은 집단, 집단 구성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작은 집단 안에서는 말에 호소하지 않아도 대단히 미묘한 것을 서로 알아차리지만, 외부에는 말에 호소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일본 사회에서는 그룹간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이 그룹 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마음’중시, 주관주의의 양면이다. 중국과 14세기 이후 일본의 수묵화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추상적 표현주의와 사실주의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일본에 오면 사실이 없어지고 추상적 표현주의로 근접해 간다. 이것이 일본의 기분주의, 마음 존중주의이다. 일본 사회의 한 쪽에는 외면적인 형식주의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극단적인 주관주의가 있다. 이 사회는 한 쪽에서 루스 베네딕트가 말한 것처럼, 내면화되지 않는 외재적 규칙의 번잡한 체계를 따라 기능하는 동시에, 다른 쪽에서 객관적 규범으로 외재화되는 일이 없는 내면적 감정을 높은 가치로 친다. 도쿠가와 조닌町人 사회의 ‘의리’가 외재적 규범, 의식적 규칙, 사회적 제재에 의해 강요되는 질서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면, ‘인정’은 외재적 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사적인 감정으로 조닌 문화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실제 사회에서는 ‘의리’의 강제력이 우선한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는 ‘의리’ 대문에 죽고 죽는다. 이것이 동반자살情死이다 조닌의 극장에서는 인정이 이긴다. 동반가출道行이다. 죽는 것이 도리어 전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인 사랑의 ‘모범’으로, 가치로 확정하게 된다. 이런 가치의 분극화 현상, 조닌 사회에서 의리의 질서가 내면화되지 않고, 인정의 가치는 외재화되지 않고 내면에 머무른 이유는, 의리의 질서가 무사 지배층에서 나와 위에서 아래로 조닌 층에 강요되었고, ‘인정’의 가치에 대한 주장은 강요된 질서에 대한 반발로 조닌층 내부에서 나왔다. 인정은 기본적 가치로는 무사층에는 없고, 유학자에게도 없다.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 조차 인정이 아니라 성誠에 대해 이야기한다. 외재적 질서의 내면화 현상을 무사층에는 있고, 조닌층에는 없었다.(33-37)
극단적인 형식주의와 극단적인 주관주의의 결합은 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형식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정말 기묘하게 형식이 많다. 연말의 연하장이나 여름의 연하장 결혼식 청첩장에 따라붙는 답장 엽서,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오면 사오는 기념선물(오미야게). 일단 말 자체가 그렇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정해진 말들이 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말을 한다. ‘항상 아내가 혹은 남편이 신세지고 있습니다’ 따위의 말이다. 그런 형식주의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다도일 것이다. 일본식 다도는 격식이 지나치다. 남의 나라 문화니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우습지만. 한국에는 다도가 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실은 자유롭다. 중국의 다도도 실은 아주 자유롭다. 일본만 그렇다. 그런데 이런 형식주의 사회에서도 기묘한 주관주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신의 약점이 될만한 비밀을 털어놓으면 갑작스레 친구가 되거나 부탁을 들어주거나 한다는 식이다. 배를 가른다는 말로 속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기묘한 일본식 고백 문화가 있다. 한국에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국은 그렇게 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악의’는 없었다는 말로 용서가 된다고 한다. ‘악의’는 없다는 이 말은 실은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끼리끼리 봐주겠다는 말이다. ‘악의’는 없었다는 말은 그래서 강자에 의한 약자의 권리를 유린할 때, 특권의 뻔뻔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것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맥락이다. 피해자 보고 참으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런 형식주의와 주관주의가 결합될 때, 내부에서는 아주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쇄국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아주 직선적이라고 할까. 한국의 의사소통은 서양에 비교할 때, 너무나 주저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주 직접적인 편에 속한다. 이런 일본사회의 특성들이 바로 지난 전쟁과 패전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들은 아주 일본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점점 더 일본적인 행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은 그것 뿐이다.
경쟁적 집단주의, 세계관의 차안성과 초월적 가치의 부재, 그것이 시간의 축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현재주의-그러한 일본사회 또는 문화의 특징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극단적인 형식주의와 극단적인 ‘기분주의’의 양면을 갖춘 가치의 체계가 전형적인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체계는 밖을 향하게 되면, 구성원 개개인이 단단하게 짜여진 집단은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고,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구별이 매우 뚜렸하다. 쇄국심리가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곤란하며, 외인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국제적 고립에 대한 공포가 메이지 시대 이래 있어서 강대국 일변도로 나타난다. 영국과 독일과 미국과 동맹을 맺는다. 좌익은 소련 일변도이고, 프랑스 문학자는 프랑스 일변도, 중국 전문가는 중국 일변도가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 서양 문화, 수입은 많이 하고 수출은 거의 없다. 내보내지 않고 들여오기만 한다. 외인은 싫지만 외인의 문화는 좋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문화가 미리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의 조건은 외국은 멀다는 감각, 즉 쇄국 심리이다.(38-39)
일본과 일본인의 전형적인 행동양식과 일본의 대외관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외국문화는 좋아하지만, 외국인과는 분리한다는 견해는 아주 인상적이다. 사람과 문화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이하다. 문화란 삶의 양식인데, 사람과 문화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는가? 그냥 사람을 막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외국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일본은 어떻게 또 변화하고 적응해 나갈는지. 오버투어리즘과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기노시타 준지木下順二, 복식複式 무겐노夢幻能를 중심으로
기노시타 준지가 말하는 복식 무겐노의 특징은 전장과 후장으로 나뉘어진 노에서 전장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배우가 후장에서는 수백년이 지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혼령으로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전장의 단순한 리얼리즘은 후장의 불가사의한 리얼리즘에 의해서 나타난다.(51-52) 노란 어떤 때는 운명이 되고, 어떤 때는 자연이 되는 등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53) 애매모호한 말의 중첩을 통해 불가사의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55) 노의 배우는 어느 때는 주인공이 되고, 어느 때는 상황을 말하고, 어느 때는 다른 여러가지가 되는 것. 대단히 이상하지만 과연 그렇다는 리얼리티가 생겨난다.(59)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적 리얼리티의 차원이 아닌 리얼리티를 호소해 온다. 쓸쓸함의 리얼리티. 진실을 느낀다는 리얼리티 같은 것.(61-62)
노能는 실상 한토막 정도를 동영상으로 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기노시타 준지의 주장 중에 새겨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운명과 자연의 뒤섞임이 일본 문화의 어떤 한 ‘숨은 형’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 원형原型・고층古層・집요저음執拗低音 : 나의 일본사상사 방법론이 걸어온 길.
마루야마는 3년전 ICU에서 「정치의식의 고층」이라는 테마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연제는 「마츠리고토祭・政事의 구조(The Structure of Matsurigoto-Things Religious and Things Governmental)」(69)였고, 1972년 「역사의식의 ‘고층’」이란 글을 쓰기도 했다. 이때 마루야마가 변했다든가, 대학 분쟁시 ‘전향’했다는 설까지 있었다.(72-73) 전후에 『일본정치사상사연구』를 출간한 이후 1970년대에 ‘고층’이나 ‘원형’에 도달하게 된 데 일종의 경로가 있다.(74)
전쟁이 끝나자 전쟁 중의 사상적인 쇄국이 풀렸다. 난바라 시게루南原繫는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와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에 대한 논문을 쓰는 데도 절반은 외국 문헌을 쓰라고 말했는데,. 일본 정신이나 황도皇道정신이 아닌 일본사상사를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서수입은 격감하고, 구미문화는 전혀 배제하던 시대였다. 그러다가 전후에 왈칵 ‘개국開国’이 되었다. 쇄국에서 개국으로의 전환은 학문적 고찰 이전에, 일상 현실의 체험으로서다. 해방이란 사상적 개국을 뜻했다. 마루야마에게 메이지 유신이 더블・이미지로 비쳤다.(74-75) 유신 이후의 신문, 잡지를 보았더니 상황이 놀랍게 비슷했다. 구체제가 무너지고 서구문화가 노도처럼 흘러왔다. 검열의 시대가 가고, 섹스물, 잔혹물 할 것 없이 무제한으로 범람했다.(75) 메이지 초기에 참방률讒謗律나 신문지 조례 등 여러가지 단속이 있었지만, 서구 정치사상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자유롭게 소개되었고, 감각적인 면에도 해방이 일어나 외설 전문잡지까지 나왔다. 전쟁 직후에도 ‘가스토리 잡지’가 범람했다.(76) 이런 개국의 더블 이미지로 보면, 메이지 유신을 제1의 개국으로 패전을 제2의 개국으로 보거나, 15~16세기 그리스도교의 도래와 남만南蠻 문화의 도래를 제1의 개국으로, 이번은 제3으로 볼 수도 있다. 제1의 개국은 그리스도교의 금제와 함께 전면 쇄국으로 끝났다. 나가사키長崎의 데지마出島라는 작은 구멍은 있었지만. 제2의 개국, 즉 막말, 유신의 개국은 이데올로기적 쇄국과 기술적 개국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낳았다. 메이지 천황의 어제 와카和歌 중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 버려, 외국에 뒤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노라 善きをとり 悪しきを捨てて 外(と)つ国に 劣らぬ国と なすよりもがな라는 시가 아주 상징적이다. 좋을 것을 취한다. 부국강병을 위해 제일 먼저 취한 것은 산업, 기술 등 ‘물질 문명’이다. 그런 면의 개국인데, 서양 곧 물질 문명이라는 뿌리깊은 등식은, 사실 일본의 근대가 자기 스스로 서양에 투영한 이미지의 반사이고, ‘훔쳐먹기’식 수입의 역투영이다. 나쁜 것을 버린다. 메이지 10(1877)대부터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시작되어, 제국 헌법帝国憲法과 교육칙어教育勅語의 제정이 통제의 한 획이다. 소위 국체国体란 근대 일본의 관념은 막말, 미토水戸학에 등장하지만, ‘국체’가 일본의 축이 되어 그것에 봉사하고 강화해 주는 것은 외국에서 가져오고, 그에 반하는 ‘나쁜’ 이데올로기나 제도는 배제한다는 ‘선택적’ 개국이 메이지 20(1887)이후 근대 일본의 일관된 특색이다. 물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비교적 사상의 자유가 있던 시기도 있었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이데올로기적 쇄국, 기술적-테크놀로지적 개국이라는 구분이 근대 일본의 특징이고 그것이 가장 극점에 이른 1930년대 이후의 군국 시대에도, 기술면에서는 개국이었다. 기술이나 자연과학계에서는 전쟁기간을 자유가 없는 ‘어두운 골짜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패전으로 제3의 개국이라는 전면 개국의 시대가 왔다. 이것은 국체의 붕괴, 즉 근대 천황제라는 통치구조(어떤 통합성을 지닌 하나의 정치구조, 경제구조)가 붕괴하고 국체 이데올로기도 일거에 붕괴했다. 전면 쇄국에서 선택적 개국, 그리고 전면 개국의 세 단계를 밟았다. 국가수준에서. 이것이 1959년의 「개국」이란 논문의 내용이다.(76-78) 1957년 강의에서 ‘시야의 확대와 정치적 집중’이라고 막말 유신을 묘사했다. 시야의 확대란 세계상이 넓어져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눈을 돌린다는 의미이며, 인식의 대상적 확대 뿐 아니라 인식 주체의 변혁을 가져온다. 셰계상이란 단순히 개인의 인식 대상의 문제가 아닌 자기를 지탱해 주는 정신적 지주 같은 것이다. 인간은 자기 주위, 곧 세계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세계상 속에서 자아는 자리를 잡아 안정감을 가진다. 세계상이 변화하면 자아의 자리잡음이 달라지면, 자아의 ‘아이덴티티’가 종잡을 수 없게 되어 위기가 닥친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탄압과 박해가 그런 것이다. 막말의 개국이란 세계 이미지 에서 자신의 자리잡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안주하고 있던 환경으로부터 유리되는 것이다.(79-81) 1958년 강의에서 역사적으로 ‘세 개의 개국’을 논하고,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를 논한 바 있다. 이것은 앙리 베르그송이 세운 정식(La Société close et la société ouverte)이다. 포퍼는 조금 달리 말하는데, 일본의 쇄국과 개국을, 초역사적이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보편적 문제라는 이중성에서 잡아보려 했다.(81) 이런 경험들이 일본사상사의 방법론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꾸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아 보편적인 역사적 발전 단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사상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철학적 마르크스주의에는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역사를 생각하는 데 역사적 발전단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본정치사상사연구』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 주자학적 사고 양식의 해체가 중세의 스콜라철학의 실재론에서 유명론으로의 변용에 상응한다는 견해 자체가 이런 보편적 역사적 발전으로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국을 사상사적 문제로 보려할 때,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 서유럽에서는 개국이라는 사상적 문제가 없다. 개국이란 일본, 조선, 중국 등 동아시아 특유의 문제이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서구의 충격western impact를 받아 서구를 향해 나라는 연다는 것이 개국이다. 제정 러시아에만 표트르 대제 이후에 있었다. 이는 문화접촉이므로 옛날에는 유럽에도 아주 격렬하게 있었다. 그러나 15, 16세기 이후 유럽은 19세기 동아시아의 개국에 필적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82-83) 문화접촉으로서의 개국은 고대, 봉건, 자본제적 역사적 발전을 종선으로 보면, 횡선 또는 횡파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강좌파와 노농파의 논쟁도 종적 발전에 대한 계열에 속한다. 도쿠가와시대의 사상사 문제를 보면 봉건적 세계상의 태내에서 어떤 과정으로 부르주아적인 또는 시민적인 세계상이 성숙해 가는가 하는 문제 설정이다. 사상이나 세계의 내재적인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종선의 시각이란 틀 안에 있다. 그것만으로는 막말 유신의 사상적 경관, 전쟁 이후의 사상적, 문화적 경관을 포착할 수 없다. 큰 파도나 홍수의 충격, 개국이라는 것이 사상사적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횡으로부터의 급격한 문화 접촉이라는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의 대비라는 문제설정에는 역사적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론적 접근법이 개입된다.(83-84)
이 강연이 비로소 머리에 들어오면서 흥미로워지기 시작한 건 내가 『일본정치사상사연구』를 끈기있게 읽고 정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내리를 평가들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의 구분. 한국 사상계는 그런 것을 할 겨를이 아예 없었다. 종적인 것이 끊기고, 횡적인 것이 이식된 느낌이다. 그 중간의 과도기로서의 식민지기는 어떻게 사상사적으로 평가해야하는 걸까. ‘식민지’라는 사상은. 개국이라는 사상을 횡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를 패전 이후의 물결과 메이지 시대를 비교하면서라고 말한다. 발전사로서의 사상사 연구를 전쟁 중에 일단락했기에 패전 후에 이런 관점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개국과 쇄국 문제를 고민해왔고, 그것을 종적으로가 아니라 횡적으로 초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21세기의 일본은 점차 닫히는 쪽으록 가는 것 같다. 예전처럼 주변부로 닫히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로서 닫히는 것이긴 하지만. 특히 인상적인 것은 매이지 유신이 부분적 개국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방식, 물질문명을 취하고, 이데올로기를 배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패전으로 개국이 왔다. 그렇다면 한국은 70년대와 80년대를 이르는 근대화 과정에서 물질문명을 취하고, 이데올로기 통제를 시도했다. 국제우체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도서를 통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식의 적극적 이데올로기화도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붕괴하고 말았는데. 물질문명 속에서 자라나는 이데올로기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둑을 막고 버티고 있었을 따름이다. 일본에서는 그것이 외세에 의해 패전에 의해 무너진 것일뿐. 그것이 오히려 둑과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될 ‘국민’의 힘을 약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런 시각에서 일본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7세기의 다이카개신大化改新에서 율령제도의 건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도 메이지 유신과 함께 일본 사회의 두 개의 큰 전기가 되었다. 율령제도로의 대변혁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중국 대륙, 당唐 문화와의 대규모 접촉으로 인한 충격 없이 생각할 수 없다. 율령제까지 대규모 제도 변혁의 모델은 전부 당제唐制에서 따온 것이다. 유신 이후 프랑스 그후 프러시아를 모델로 일본의 행정, 군사, 교육,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을 했다. 막말에 외교면에서 러미영프의 압력 하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처럼 6, 7세기 일본은 조선 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관계에 말려들었다. 일본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로 재편성했고, 하급관료 조직에 이르기까지 당제를 모방했다. 외압의 계기가 없이는 그 정도의 제도적 변혁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외압 또는 국제적 충격이란 지금까지 일본과 비교해 대단히 수준 높은 문화와의 접촉을 뜻한다. 단순히 당시의 유럽의 정치, 문화, 사상의 압력에 그치지 않는다. 절대주의, 부르주아 제패기, 제국주의와 같은 서구의 압력이란 종의 발전 속에 해소되고 만다. 마루야마가 문화접촉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백 년의 다른 전통을 가진 구조적으로 이질적 문화권과의 문제다.(85-86) 또 하나는 일본 역사의 시대구분의 문제다. 일본사는 역사적 단계의 구분이 생산양식이나 생산관계뿐 아니라 정치사 영역에서도 서유럽과 비교하기 어렵다. 다이카개신 이전의 소가蘇我씨나 모노노베物部씨가 할거하던 씨족국가의 호족의 느슨한 통합체계, 여기서는 천황가도 호족 중 하나로 동등자 중 으뜸primus inter pares이었다. 여기서 쿠데타를 거쳐 태정관太政官제, 즉 중앙집권 율령국가로의 길이 열린다. 국가제도로서는 아주 큰 단절이 있으나, 사회체제로 보면 의외로 연속성이 있고, 두 가지가 겹쳐있다. 씨족국가의 国造라는 반독립적 호족제는 폐지되고, 国司 또는 郡司라는 지방관 제도로 대치되지만, 종래의 国造가 눌러앉아 郡司가 된 경우가 흔하다. 율령제로의 변혁은 일종의 법률 혁명으로 법제 변화에 비해 사회적 체제는 변하지 않았다. 연속성이 강하다. 그리고 그 관료제도의 태내에서 장원적 토지소유가 발달한다. 율령적인 공지공민公地公民제도와 모순되는 사회제도가 일찍부터 생겨났고, 율령 체제가 공허하게 되고 변질해 간다. 관제상으로도 료게令外官라는 정식 법령 밖에 있는 관직이 있는 데,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内大臣, 中納言, 参議, 蔵人所, 検非違使 등 잘알려진 관직이 모두 료게令外官이다. 예외라야 할 관료가 큰 의미를 차지한다. 일본에서 摂関制의 등장은 이 현상의 집중적 표현이다. 摂政과 関白도 중국의 관직이지만, 임시직인데, 일본에서 하나의 상설적 정치 기관이 된다. 다른 한편 장원荘園의 장관荘官이나 율령제에 따라 지방에 파견되던 즈료受領 같은 하급관리가 토착해서 무장 집단을 형성하고 무사단이라는 독자적 정치, 군사집단으로 성장해 나가며, 그 경우도 사회체제가 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옛 체제와 겹쳐서 나타난다. 봉건적이 토지 소유가 언제 생기는지 살펴보면 갖가지 이론이 나오며, 의견이 엇갈리고, 시대구분의 문제가 까다로워 다이코검지太閤検地가 비로소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확립했다는 학설도 있어, 봉건제의 개시가 헤이안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수백 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된다. 서구 역사를 모델로 한 시대 구분이 일본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의문이다.(86-89) 토크빌 처럼 프랑스 혁명 뒤와 루이왕조의 절대주의시대 사이의 뜻밖의 연속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혁명이 단절이고 근대를 개시했으며, 의외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 분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의 생산관계 변혁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메이지 5, 6년(1872~3)의 지조개혁地租改正이다. 지주에게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준 농지개혁이다. 그러나 당시의 지주가 반드시 경작자였던 것은 아니다. 에도 막번체제 내부에서 지주와 소작자의 계급 분화가 진행되고, 상당한 정도로 부재지주도 생겼다. 프랑스혁명 때 경작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고, 귀족의 토지는 몰수한다. 일본의 경우 소작인의 소작료는 에도시대의 五公五民에 가까운 고액이 보장되고, 경작자에게 농지 소유권이 인정된 것은 전후의 농지 개혁이다. 이 경우도 산림 지주는 제외. 이것이 메이지 유신을 두고 부르주아 혁명이냐 절대주의의 수립이냐에 대해 강좌파와 노농파의 격렬한 논쟁이 생기는 하나의 배경이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매우 철저해 보이는 변혁도, 의외로 그 이전 체제의 연속성이 있다. 이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마쓰카타 재정이라는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한 프롤레타리아의 산출 이후 경공업 중심의 자본주의적 확대재생산이 일어난다. 정치체제에 있어 폐번치현 후 얼마나 달라졌는가의 문제가 있다.(89-90) 고대적인 대규모 노예제는 이민족에 의한 정복의 산물인데, 記紀에 그런 기술이 없으니 기록된 역사 이후 일본은 이민족에 의한 대규모 정복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 역사의 지속성 또는 연속성을 설명하는 역사적 배경이 된다.(90-91)
횡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의 문화접촉으로 메이지 유신과 다이카 개신을 들 수 있다. 수준 높은 문화의 커다란 압력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이카 개신을 살펴보면, 율령제도가 형성되었지만, 인적 구성의 변화가 없이 구 체제의 지배자들이 새로운 지배자들로 관직만 바꾸어 등장했을 뿐이다. 특히 료게令外官라고 하는 예외적인 관직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일단 율령제가 성립된 후에, 이 체제가 현실의 권력관계와 부정합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메이지 유신과 같은 대규모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틈새나 여백을 통해서 실제 권력을 운용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이런 변화를 서구 사회의 발전단계에 맞추어서 평가하기 어렵다. 봉건제도인 장원제가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논의가 수백년 단위로 엇갈린다. 게다가 메이지 유신 자체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기에도 불충분했다. 그리고 정치체제 역시도 폐번치현 후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아직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속성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가 고층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문화적으로는 유사 이래 ‘열린 사회’인데, 사회관계에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닫힌 사회’이다. 집약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답水畓 벼농사를 중심으로 생겨 난 사회관계와 종교적 의례가 기록된 역사(기기신화를 포함하여) 이래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한편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받은 복잡한 문화적 자극의 전통이 메이지 이후 서구로부터의 자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막말 메이지 이래 외국인의 일본관에 잘 나타난다. 일본만큼 언제나 최신 유행의 문화를 추구해서 변화를 좋아하는 나라도 없고, 일본만큼 완강하게 자기의 생활양식이나 종교의식(혹은 非종교의식)을 바꾸지 않는 국민도 없다. 양쪽 다 옳다. 끊임없이 새로운 메시지를 찾는 것과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면서 근본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는 것. 이는 사상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리스도교의 도래와 그 ‘절멸’의 운명에 대해 조지 샌섬G. Sansom은 어떤 국민도 새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기쁘게 수용하지 않았고, 이처럼 완강하게 전통을 고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교의 도래와 전파 속도를 조선과 중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놀랍게 빠르다. 반세기가 되지 않아 40~50만의 신자를 얻었다. 그러나 금교 이후 그리스도교의 흔적이 그렇게 절멸된 나라도 없다. 에도 사상사에도 그리스도교의 사상사적 영향은 없다. 중국도 조선도 그리스도교의 도래에 대한 저항은 일본보다 강했지만, 침투하고 나면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자취를 근대까지 추적할 수 있다. 조선의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의 핵심은 기독교인들이고, 반체제 운동도 그리스도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절멸할 때, 놀라운 속도로 자취를 감춘다. 집단전향해서 그리스도교인이 되지만 집단전향해서 교를 버린다. 문화접촉은 일본의 경우 일방통행이지만, 유럽은 상호적이면 다양한 문화접촉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문화는 개체성 즉 개성적 측면이 있다.(92-95)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국 기독교가 저항의 기독교가 아니라 체제순응의 기독교인 동시에 체제 그 자체의 일부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면 3.1운동의 주도세력 중 하나가 기독교이고, 1970년대 유신반대 운동을 일본에서 이끌어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으니 그렇게 생각할 법하다. 그러니 그 점은 접어두고. 일본은 최신유행을 받아들이지만, 전통은 완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로 집단전향하고 그리스도교에서 집단전향한다는 평가도 그렇다. 마루야마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에서 패전 직후에 그리스도교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이 천황제를 폐기하지 않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부흥을 하면서 일시적 유행이 사그러진 바 있다. 패전 직후에는 창가학회도 전국적인 붐을 이루어서 지금은 연립여당의 일부인 공명당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종교 문제는 정말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야하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일본을 이해하는 데, 곡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마루야가마 일본사상사의 고층古層을 논할 때 기기記紀신화는 중요한 소재다. 일본 신화 그 자체가 고층은 아니다. 일본 신화에서 개개 설화를 보면 일본에만 고유한 것은 거의 없다. 특수성이란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 한편으로 高天原(천상)-葦原中國(지상=일본국)-根國(지하)라는 우주cosmos의 수직적 구조와 서방 정토와 결합하는 봉래국, 이즈모에 상정된 황천국과 위원중국 같은 세계의 수평적 구조가 경합하고 있다. 수직적 요소는 북방 알타이계 신화와 공통으로 천손강림신화가 그것이다. 해상에서 온다는 수평형의 설화도 있다. 이런 신화를 개개 요소로 분해해 보면 세계 어느 곳엔가 있는 설화와 공통이고 일본에 고유한, 일본 신화의 특수성이라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개개의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게슈탈트-전체로서의 일본 신화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개성적이다. 천지창조, 국토생산, 최고통치자의 선조의 출생의 세 가지가 이어지고 그 3자가 시간적, 역사적 계열 속에 전개해 나가는 구조는 세계의 수많은 신화 중 독특하다. 神代史에서 人代史로라는 역사적 구성이 그렇다. 신화 뿐 아니라 일본 문화의 일본사상사를 ‘특수성’이 아니라 ‘개체성’의 상에서 포착하는 게 어떻겠는가. 전체 구조로서의 일본 문화란 세계에서 하나 뿐이다. 개성은 전체 구조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 특수성이란 세계 어디엔가에 있는 것 속에 해소되어 버린다. 전체 구조로서의 일본정신사의 개체성이란 관점에서 서로 모순된 두 개 요소의 통일, 즉 외래문화의 압도적 영향과 또 하나 소위 일본적인 것의 집요한 잔존, 이 모순의 통일로 일본사상사를 포착하고 싶다.(96-98) 일본은 유사이래 최고의 문화권인 중국 문화의 옆에 있어 자극을 받았으되, 조선 처럼 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마치 영국 같지만, 도버해협과 쓰시마해협은 달라 로마 정복 이전의 문화는 유적으로만 남아 있으며, 고전은 유럽 대륙과 공통으로 그리스・로마의 고전이고 종교도 그리스도교이다. 토속적인 것은 전통으로서는 절멸된다. 동아시아의 유교의 경우 조선은 유교문화권이되, 민중 수준에서는 도교적이다. 중국 대륙과 공통이다. 그러나 일본은 유교문화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유교가 성했던 에도 시대에도 유교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 나온다. 에도 유학은 처음부터 수정주의적이며, 국학은 가라고코로를 배격한다. 조선에도 국학이 있었으나, 조선 후기 청의 등장으로 도통이 넘어왔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유불은 외래사상이고 일본 고래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학이다. 일본에는 외래 대 내발이라는 생각이 있다. 일본에서는 동양 정신이나 일본 정신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조선쪽에서 보면 유신이후의 일본은 서양화해서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대로 남서 태평양제도는 대륙 문화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 야생 문화가 보존되어 있지만, 정체성이 지배한다.(98-101) 일본은 높이 치솟는 ‘세계 문화’로부터 부단한 자극을 받으면서 그에 침윤되지 않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조선은 홍수형이고, 일본은 누수형이다. 새는 물에 자주적으로 대응하고 천정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이 이웃에서 들어오는 문화에 민감하고 호기심이 강한 측면과 반대로 안의 자기동일성을 완강하게 유지하는 이중적 측면과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는 지정학적 요인이다.(101) 고도공업국가로서 일본만큼 민족적 등질성을 지키는 나라는 없다. 다른 고도 자본주의국가와 비교하면 그렇다. 언어도 기본적으로 동일언어다. 고도 공업국가이면서 미개민족의 특징이라는 놀라운 민족 등질성을 유지하고 있다.(102-103)
기기신화라는 것이 외국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흥미롭게 외국인에게 소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마루야마는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성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마치 『일본정치사상사연구』에서 말하는 사유의 내적 구조를 살피는 것 같다. 그는 여전한 메타사상가이다. 그러면서 신대사에서 인대사로 연결되는 일본사상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천지창조, 영토창조, 최고통치자의 선조의 출생의 연결구조를 가진 신화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천황제에서 나타나는 현인신이라는 구조는 생각만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만큼 닮지 않았다. 일본 천황제의 현인신에는 신성이 없기 때문. 그들이 내세우는 신성은 혈통뿐이다. 물론 일본의 신은 다른 나라의 신과 또 다르다. 특성 자체가. 그러니 페르시아의 왕에서 등장하는 신왕과도 또 다른 형태다. 차라리 신임을 주장하는 로마황제가 비슷할까. 그들은 황제가 되어야만 신이된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구조는 없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바는 아니다. 그래서 개체성이라 표현된다. 외부의 압도적 영향과 일본적인 것의 잔존. 그러면서 조선의 민중문화를 도교적이라고 설명하는데. 도교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불교적이라고 보아야할까? 유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만 쉽사리 동의가 안된다. 마루야마는 일본 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지한 것 같다. 일본중심주의나 일본제일주의라기 보다 다원적 관점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서 도쿠가와가 유교문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에도시대 유교를 평가하는데. 이 부분은 『일본정치사상사연구』에서 확실히 진보한 것으로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조선의 국학이란 ‘소중화론’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조선의 국학은 일본의 침략과 일본 국학의 영향을 받아 1930년대에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연구 대상도 일본 국학처럼 신라 향가나 고려 가요를 연구한다. 물론 고대 역사서도 연구하고. 신화도 연구한다. 어디서 이런 견해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점점 조선이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신뢰가 되지 않는다. 연구했다면 이런 말을 할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거리나 언어, 인종 동질성을 말하는데, 이건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마루야마는 고래로 일본이 외래의 보편주의적 세계관을 차례로 수용하면서 수정해 온 계기를 생각하고 있다. 이때 범하기 쉬운 두 가지 과오 중 하나는 일본사상사를 외래 사상의 왜곡의 역사로 보는 것, 일탈의 사상으로 보면서 진짜는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래 사상으로부터 독립해서 내발內發적인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국학에서 근대 일본주의, 최근 유행하는 토착 사상의 탐구까지.(103-104) 일본은 고대로부터 압도적으로 대륙 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다. 일본 최고의 문헌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배제하고 일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만두의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은 조작이 될 수밖에 없다. 에도시대 중기부터 국학운동의 희비극은 만두껍질 벗기기가 되거나 아니면 일본적인 것 속에 외래 이데올로기를 습합시켜 그리스도교도 일본 신도의 파생물이라는 식으로 일종의 범일본주의로 확대 해석한다. 세계 문화는 모두 일본에서 나왔다는 식인데. 그런 ‘판저패니즘’은 일종의 외래 사상 콤플렉스컴 뒤집어 놓은 것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일본 사상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절망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히라타 아츠타네 파에서 전쟁 중 황도주의자와 일본주의자까지. 마루야마는 사상에 한정해서, 일본의 다소나마 체계적인 사상이나 교의는 그 내용을 보면 고래로 외래 사상이지만, 일본에 들어오면 일정한 변용을 거친, 폭 넓은 수정이 가해진다. 침윤형, 병탄형은 아니다. 완결적 이데올로기로서 일본적인 것을 끄집어내려하면 실패하지만, 외래 사상의 수정 패턴을 보면, 변용의 패턴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공통성을 보인다. 고급의 사상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 정신 태도로서 부단히 밖을 향해 두리번거리면서 바깥을 훑어보지만, 두리번거리는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수정주의가 하나의 패턴으로 집요하게 되풀이 된다.(104-105) 1963년부터 강의에서 개국, 문화 접촉의 여러 모습, 일본 문화와 일본 사회의 변용성과 지속성의 역설적 결합 등의 문제를 파고들어, ‘원형prototype’을 논하게 된다.(105) 삼각형을 그려 보면, 제일 저변에 원형이 있고, 그 위에 유교, 불교, 마르크스주의 등 외래의 교의나 체계가 쌓인다. 저변의 원형과 그 위에 쌓인 외래 사상 사이에 상호 교섭이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원형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소거법 뿐이다. 예를 들면 신도에서 원형을 추출하면 일본 신화가 된다. 물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이다.(106-107) 계속 소거해 나가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무엇인가 원형이 남는다. 원형은 그 자체로는 교의가 되지 않으며, 교의가 되려면 외래 세계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단편적 발상은 놀랍도록 집요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 밖에서 들어오는 외래 사상을 수용하고 일본화시킨다.(108) 그러다가 1972년 「역사의식의 ‘고층’」이란 논문을 발표하며 고층이란 말을 썼다. 물론 지질학적 비유로 저변에는 고층이 깔려 있다. 원형은 역사 발전 계열에 들어갈 위험이 있지만, 고층이라면 시대를 넘어 활동하는 성층성을 명확하게 해준다. 원형처럼 숙명론적이지도 않다. 고층은 기저에 있으니 강인하기는 하나 지진이라도 나면 융기해서 지층의 구조를 변동시킬 수도 있다. 유학사에서 고학이나 국학을 고층의 융기로 본다. 사상의 근대화 과정의 이중진행이 있다. 외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층이 융기한다. 물론 순수한 고층이란 없다.(108-110) 이 고층을 음악용어인 바소 오스티나토basso ostinato로 바꾸었다.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저음음형이다. 고층을 마르크스주의의 토대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저음이란 저음부가 화성을 담당하는 바소 콘티누오basso continuo와도 다르다. 바소 오스티나토는 저음부에 일정한 선율을 가진 악구가 집요하게 등장한다. 그래서 음악 전체의 진행이 달라진다. 이 비유로 일본사상사를 보면, 주선율은 압도적으로 대육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왔다. 그러나 저음부에서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음형에 의해 수정된다.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하나의 패턴, 사물을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패턴으로서 일본적인 것을 잡아보겠다고 사용한 것이다.(110-112)
일본적인 것의 특수성을 찾아내려는 일본주의는 만두껍질 벗기기나 판저패니즘이 되어버린다. 이 판저패니즘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판코리아니즘에 가까운 정신 상태를 가진 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병리적인 부분이 아니던가. 역사는 늘 묘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마루야마는 여기서 자신의 집요저음에 대해 말한다. 원형에서 고층으로 그리고 다시 집요저음으로 비유가 변해왔지만 그 설명은 일관성이 있다. 미셸 푸코가 일본에서 마루야마와 대담한 후에 마루야마를 콜레주 드 프랑스로 초청했던 것도 납득이 된다. 물론 푸코가 말하는 고고학과는 또다른 형태의 주장이지만. 계보학과도 은근히 닮은 구성이 있다. 그는 반가웠을 지도 모른다. 마루야마는 프랑스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거절했다고 하던데. basso ostinato에 대해선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사상을 보면서도 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참 표현해 내기 어려운데. 마루야마는 잘 끄집어 낸다.
마지막으로 마루야마는 연속성과 비연속성, 또는 항상성과 변화성의 문제를 말한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쪽의 계기를 대립 내지는 모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다. 마루야마가 지적하는 것은 변화의 방식이다. 변화의 패턴 자체에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음형이 있다. 일본사상사는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그럼에도 일관해서라기 보다 역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 발상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게 변한다는 것이다. 정통 사상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본격적 정통의 조건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을 좋아하는 경향이 부단히 재생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밖의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변신의 속도 자체가 전통화하고 있다.(112-113) 안과 밖이란 외국과 일본에서 남과 자기까지 일종의 닮은꼴 구조를 이루며 여러 겹으로 그려진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변해 있는 관점. 불변의 요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영세무진이라는 절대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패턴 때문에 변화한다는 시각으로 일본사상사를 고찰하려고 하면, 일본사상사의 개성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바소 오스티나토’를 역사의식(코스모스의 의식), 윤리의식, 정치의식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했다.(113-114)
마지막 절이 정말로 흥미로운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양태에서 일본적인 특징을 찾는다는 것. 어떤 패턴 때문에 변화한다는 시각. 실제, 마츠리고토의 구조. 역사의 식의 고층, 윤리의식의 고층(집요저음)이라는 세 논문을 차례로 살펴보려는 기대가 생긴다.
다케타 기요코, 프로티트・융・사상사 : 후기
일본사상사 연구에 있어 ‘일본 문화의 숨은 형 아키타입스’, 사회, 문화, 국민 사상의 심층의 숨어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본질 규명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비합리적, 일본 특유의 특수주의적, 폐쇄적 성격, 주술적인 것이 지배하는 ‘무라’적, 가족주의적, 공동체적 집단주의가 의식에서나 사회관계에 있어 지배적인 힘을 가졌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양의 사상은 받아들여질 리 없다. 초월자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는 있을 수 없다는 단정이 곧잘 등장한다.(115-116)
다케타 기요코의 이 후기는 다시 보면 발문이기도 하다. 그가 초대해 강연한 세 사람이 모두 각각 자기 분야를 구축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한다고 해야할까. 그래서인지. 뭔가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 오해도 막고 싶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의 영역을 조명하여 숨은 동기를 폭로하고, 재음미할 것을 촉구하는데 공헌했고, 역사(사상사)의 해석과 이해에도 시사한 바가 있다. E. H. 카도 역사 연구자에게 프로이트는 첫째 사람들이 자기 행동의 공기라고 말하거나 믿는 내용의해 실제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낡은 환상에 종지부를 찍은 것, 둘째, 역사가가 그의 주제나 시기나 사실의 선택 혹은 그 해석을 이끌어 온 숨은 동기, 다시 말해 그의 시각을 결정해 온 국가적, 사회적 배경을 잘 재음미할 것을 권고한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케다는 프로이트의 마지막 저서 『인간모세와 일신교』(1939)가 특정 민족의 문화사, 사상사가 내포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접근방식을 창조적으로 탐구한 귀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116-118) 유대인인 프로이트는 유럽의 반유대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압박 속에서 유대인의 의미를 추궁해 나갈 때, 모세는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한다. 프로이트는 모세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이집트인은 아니었을까 하는 가설을 세운다. 이교도로서의 모세의 이미지는 프로이트에게 안티 세미티즘을 막는 필사적인 시도였다.(118) 프로이트가 1914년 익명으로 발표한 ‘미켈란젤로와 모세’에 자기를 거역하는 민중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고 대리석상 속에서 분노를 동결시킨 모세를 발견한다. 프로이트는 전통적 모세와는 별개의 새로 부가된 모세를 발견하고, 현대 유럽제국의 유대인들을 내적으로 엄하게 묶는 종교적, 사상적 구속(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아낸다.(118-119) 프로이트와 이처럼 전통적 문화의 의미나 역사적 정설을 역전시키는 것 같은 가설을 세우고, 새로 고쳐 읽는 시도는 일본 문화의 ‘숨은 형’을 묻는 데도 통찰과 용기를 준다.(119) 에릭 에릭슨의 청년 루터도 정신분석을 역사연구의 도구로 삼아 종교개혁자의 청년기를 재검토하여, 정신적, 사회적 대변혁의 한 요인을 찾아보려는 시도이고, 사상사 연구의 방법론적 탐구이다. 탄광부를 아버지로 태어난 엄격하고 잔혹한 아버지에 대한 부친 혐오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체험시켜 수도원으로 발을 돌리고, 부친 혐오가 로마 교황에 대한 저항을 낳았다는 것. 종교개혁에 대한 재해석을 낳지는 못했어도, 흥미로운 접근이었다.(120) 동시에 에릭슨 이래 정신분석적 역사 해석을 통한 역사의 왜소화에도 동조할 수 없다. 역사의 다이내믹스를 개인의 정신 분석으로 끝낼 수는 없다.(121) 유아사 야스오湯浅泰雄가 『융과 그리스도교』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란 펄펄 끓는 흥분에 찬 큰 가마솥이고 하나의 악이며, 심층심리학은 인간의 암흑면을 폭로하는 학문이라고 지적하는데, 비합리, 무의식에 문을 열고 내면의 숨은 동기, 욕망, 비합리적 정념의 경향을 조명해서 검토하는 것도 문화나 사상사 연구에 시사가 된다.(122)
융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프로이트로 시작한다. 특이하게도 프로이트에서 ‘인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다. 반유대주의의 압박 속에서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던 프로이트는 율법의 제창자인 모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율법 구조로부터의 해방을 모색한다. 그리고 유아사 야스오를 꺼낸다. 『융과 그리스도교』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융의 본질 파악법은 다른 특질을 가진 것으로, 특정 민족의 문화, 사상의 품속 깊이 숨은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을 고찰할 때, 융의 방법도 적잖은 시사를 준다. 첫째, 융은 무의식의 본질을 억압된 것, 본래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그는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양자가 합일해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과 무의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은 의식의 작업을 도와주는 불가결의 협력자라고 생각한다. 무의식은 의식의 영원한 창조적 어머니이자 늘 활동하며 미래의 사명에 봉사하는 갖가지 재료를 조합한다. 셋째, 무의식에 있어 인식은 개인적 무의식과 집합적 무의식의 두가지 층이 있다. 집합적, 보편적 무의식의 층은 前유아기, 선조 대대의 생활의 잔재를 포함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몰랐던 정신적 내면세계가 입을 열고 있다. 인류발전의 거대한 정신적 유산, 심층구조이자 선천적인 혼의 영역이라고 한다.(123-124) 융에 있어서 꿈은 무의식이 혼의 내부로부터 의식을 향해 발하는 메시지고, 지시 내지는 경고라고도 볼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신화는 ‘집단적 꿈’, 즉 ‘무의식의 욕구’라고 한 것과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레비-스트로스 처럼 융도 무의식의 욕구에 들어 있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의식주체의 사는 방식에 투영하면, 의식의 작업으로 불가결의 창조적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융은 집합적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카테고리로서의 원형이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하나의 원형이 아니라 복수이고 특히 퍼스낼리티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네 개의 원형이 있다. 첫째, 페르소나, 둘째,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 셋째, 그림자shadow, 넷째, 자기self. 특히 그림자 원형은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다른 어떤 원형보다 많이 품고 있고 인간의 영감은 그림자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활력, 창조력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다. 자아와 무의식의 영역을 매개한다.(125-127)
융의 무의식과 원형을 연결하려고 시도한다. 어쩌면 자기 기획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발표자 중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일본사상사의 심층에 잠재하는 집단적 무의식 영역과 그 특질을 고찰할 때, 융의 집단적 무의식 개념 그리고 원형은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일본 문화의 심층을 융의 통찰과 함께 인간론적 상상력을 가지고 모색해 가면 그런 노력 속에 인류적, 보편적 가치를 향해 자기를 열고 발전을 지향해 가는 창조적 생명력이 내포되어 있다. 인류 공통의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문화의 심층에 ‘숨은 形’으로 잠재할 가능성은 없는가. 기노시타 준지가 발제한 제아미의 복식 무겐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서 융과 통하는 숨은 형이 떠오르는 것 같다. 비극적 패장의 비애를 재료로 함녀서 하나의 인간의 의식에 내재하는 두 개의 세계, 피아 아집과 원념과 현실세계와 그것의 부정, 즉 자기 부정을 통한 초월 지향, 영원히 초월적, 보편적 가치에 이어지는 세계, 이런 두 개의 ‘숨은 형’이 ‘복식 무겐노’라는 드라마에 올려져 있는 것 같다.(128-130)
마지막 부분은 기노시타 준지에 대한 일종의 변명과도 같지만, 약간 생각해 볼 구석이 있다 싶어서 적어 둔다.
2018. 12. 23.
* 괄호 안의 숫자는 번역서의 쪽수이다.
** 이 글의 저작권은 ⓒFELIVIEW.COM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