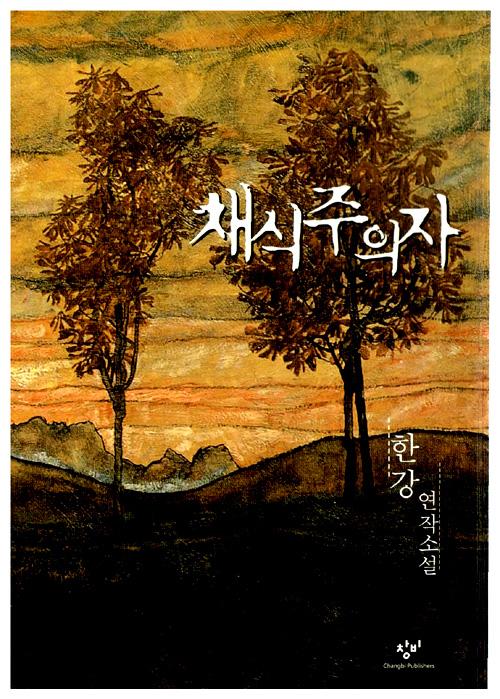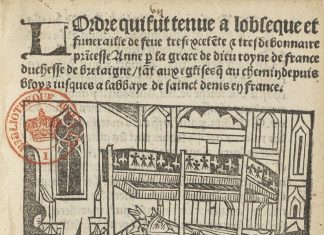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씨』를 읽고 나는 심드렁했다. 공감은 하겠다만, 이게 소설인가. 그리고 묵혀두었던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꺼내들었는데. 목구멍이 조여왔다. 해설은 더 그랬다.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후의 결혼식 가지 않아도 돼. 나는 실은 역할에 매이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다간 말라죽는다고.
나는 아직도 고기를 먹는다. 그것도 잘 먹는다. 그러나 고기를 먹으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고기를 먹으면서 생각하면 안된다. 도축장이 떠오르고, 불결한 사육환경이 떠오르고. 그 속에서 비육되어 가는 고기들을 생각한다. 개고기를 끊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개들이 사육되는 장면을 여러차례 본 어느날 더이상 입속에서 다가서는 욕지기를 견딜 수 없었다. 닭고기와도 급격히 멀어졌다. 어떤 사료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48일, 49일 최선의 효율을 보일 때 잡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좋아하던 삼계탕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래도 닭을 가끔은 먹게 되지만. 난 채식주의자가 아니니까. 며칠 전 통닭집에서 닭을 사면서 일부러 조각을 산 건 한 마디로 튀겨져있는 그 닭이 너무나 앙상해서 였다. 재는 며칠 동안 살았을까. 돼지고기도 그보단 더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음식 속에 숨겨져 있으면, 다른 재료들과 뒤섞여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면, TV나 뉴스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 한우를 먹지 않고, 호주산, 미국산 소만 먹는 이유도 상대적인 목축환경 때문이다. 아, 물론 값도 비싸지만. 그래도 아직 양고기는 그냥 먹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비웃으리라,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으면서 말이지. 그렇다. 나는 아직도 고기를 좋아하고 잘먹는다. 그렇지만,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은 아니다. 고기를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 마음 속에 기묘한 거리낌이 왔다갔다한다. 어느새 고기 먹는 일이 전보다는 적어지고 있다. 그래도 먹고 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말하면서. 식물도 생명이긴 마찬가지라고 되뇌이면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을 거다.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자신을 짓누르는 일상들을. 영혜가 느껐을 분노가 어떤 것일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때,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가슴 속을 헤짚어 보게 마련이다. 폭력은 흔적을 남긴다. 그 어떤 폭력이라도. 감정의 기억은 고인 웅덩이 같아서, 지나가던 이가 한 발만 들여놓아도, 밑바닥에 잠긴 찌꺼기가 모두 올라와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건 그런 거다. 어느 순간 얼굴이 굳어지고, 눈가에 힘줄이 돋고,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과 상처주는 말을 상대의 마음 속을 헤짚게 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던져놓는 것이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후회하다가도 마음 속으로 다시 한 번 다잡으면서 이건 내 권리라고 외치는 것이다. 나는 상처받았기에, 그 상처를 알면서 헤짚은 너의 죄라고. 그래서 상처입을 말을 던진다. 분노의 말을 내뱉을 때. 자신도 상처입으면서도. 그러나 분노의 말을 내뱉지 않고, 스스로 삭인다면, 그땐 영혼이 부스러져 버린다. 겉보기엔 모두들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안은 다들 부스러져 있다.
가장 무방비 상태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사람이 여자고 주부다.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붙들고 외면한다. 그러는 동안 살이 단단해 진다. 아니다. 상처에 딱지가 거듭 앉아, 굳은 살로 보일 뿐, 그 안은 여전히 썩어 있다. 역할은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지만,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이 포식자로 설 수 있을 때 뿐이다. 어제와 오늘을 하루 하루 견디게 했던,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라는 그 역할에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길이라는 걸 직시하는 순간 끝이 온다.
먹지 않고 죽겠다면 인정해주면 그만인 것을. 어느새 생명을 유지 보존한다는 목적은 새로운 폭력이 되어간다. 죽어가는 것이 분명한 사람의 늑골을 부러뜨려가면서 심장마사지를 하곤 바늘 하나 들어갈 곳이 없는 사람의 중심정맥관을 드러내서 바늘을 꽂고 약물을 공급한다. 항생제, 영양제, 진통제, 이완제. 그래서 기어이 살려내서 기계에 의존해 숨을 헐떡이면서 목숨을 보존한다. 중환자실에 누운 자의 의식은 또렷하지만, 들려오는 건 비명소리와 헐떡이는 숨가쁜 호흡들뿐. 피곤에 지친 간호사와 의사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만. 그들은 순순히 죽게 해주지 않는다. 정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건 무엇을 위한 최선일까.
사전의사결정서라는 것을 만들어 돌리기 시작한다. 표면적으로야 죽어가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돈 아닌가. 건강보험이 더이상 감당할 수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노골적으로 차별할 수는 없는 법이다. 차별은 몰래해야 하니까. 장래의 자신을 알 수 없는 오늘 사전의사결정서를 들이대는 시스템은 또 얼마나 잔혹한가. 광고에선 고통스런 삶의 연장 따윈 원하지 않는 점잖고 그럴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연신 권유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봐야 살고자 하는 자와 죽고자 하는 자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법. 살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죽게 두면 안되는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면 병원에 가질 말아야 겠다.
나무가 되겠다면, 나무가 되고 싶다면 땅을 파고 묻어주고, 물을 주면 될 것을. 산 속에 정신병동에 가두어 둔채 바늘을 꽂지 말고.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은 죽은 나무가 살아날거라면서 매일 같이 물을 주는 아이가 나온다. 물을 주면 되는데. 나무로 살고 싶다면 나무가 되게 해주면 될 것을.
예술을 향한 도약인지. 욕정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건 여자들 뿐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미쳐서 죽을꺼야. 아니 이미 미쳐서 죽을 지경이야. 아냐 이미 미쳤어. 모두들 질러대고 있는 비명이 컴퓨터의 스크린을 통해서 넘어온다. 편의점 점주들도 조그만 옷가게 주인들도 알바들도 취준생들도 모두들 미쳐서 죽을 지경인 거다. 몰카와 성폭력과 불공정에 시달린 그녀들도 미쳐버리겠어서 뛰쳐나온 거다. 모두들 미쳐버리겠다는 아니 이미 미쳐버린 거다. 그런데도 아직 폭발하지 않는다. 냄비가 터질 듯 들끓고 있지만. 이대로 모두들 미쳐서 죽어가는 건가.
도망쳐야 한다.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쳐야 한다. 도망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2018. 7. 14.
** 이 글의 저작권은 ⓒFELIVIEW.COM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