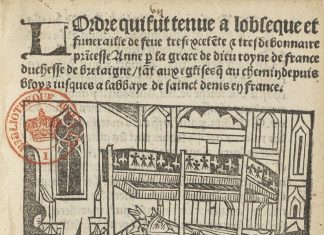한민족이란 만들어진 것인가? – 앙드레 슈미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대한매일신보 편집국. 갓 쓴 기자의 모습. 뒤쪽에 한복을 걸어놓았다. 사진은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앙드레 슈미드,『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2002.
지난 토요일 밤 분당 교보에서 집어들고, 주말 사역 하는 틈틈이 결국 오늘 아침에 다읽었다. 읽는 내내 너무 재미가 있고, 긴장되기도 하고. 이 책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식민지 시기 일본계 은행 행원들의 족적을 다룬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논문을 찾다가, 비교적 최근에 UCLA에서 “Colonial Finance: Daiichi Bank and the Bank of Chōsen in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 Japan, and Manchuria” (Howard Hae Kahm)라는 논문이 출간된 것을 소개받았고, 그 논문평을 해 놓은 것을 읽다가. 앙드레 슈미드의 ‘Korea Problem’, 즉, 일본 근대사 연구에서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을 무시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되었고, 저자인 Kahm은 이를 바꾸어 ‘Japan Problem’, 즉,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Kahm의 논문을 보다 Andre Schmid가 더 끌리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2000년대 초중반에 이미 한 번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뒤였다.
옮긴이 서문을 읽다, 이십년쯤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석사과정 중에 잠시 쉬고 있을 때였을 거다. 에릭 홉스봄의 『187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책을 보고, 꽤나 충격을 받았다. 각설하고 ‘민족(nation)’은 근대의 발명품이라는 주장이었다. 제목처럼 프랑스 대혁명 이후라는 주장. 그 이전은 신분제사회이므로.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은 꽤 나중에 나왔다. 그리고 접한 것이 좀 먼저 번역되어 나와있던,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였다. 이 책은 나중에 『상상의 공동체』라는 원제를 달고 개정판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연구자인 앤더슨은 동남아시아 사례에서 인쇄매체의 영향과 ‘관주도 민족주의’를 지적한다. 나 자신도 한국 정치 사회 전반에 압도적 규정력을 가진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 앞에서 고전하고 있던 터였고, 당시까지 나와있던 주로 언어, 인종, 전통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즉 내셔널리즘 연구서들이 통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홉스봄과 앤더슨의 주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게다가 당시는 민주주의 형성과정과 자본주의 이행에 대한 역사적 연구들, 테다 스코치폴, 베네딕트 앤더슨의 형제인 페리 앤더슨, 찰스 틸리,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배링턴 무어 같은 사람의 역사적 연구에 관심이 많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홉스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홉스봄이 슬쩍,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말하는 구절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쟁은 그 당시 흔하던 ‘보편’과 ‘특수’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나중에 후문으로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과 저녁을 겸하면서 술자리를 가질 때, 최장집 교수가 열변을 토하니, 북한의 나이든 학자가 이렇게 받았다고 했다. “홉스바움 얘기구만요.” 홉스봄은 이미 1990년대 말에 휴전선의 양편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셈이다.
앙드레 슈미드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철렁한 것은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1980년대 말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나로서는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주제를 근대성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 속의 금기였는지도 모르겠다. 홉스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민족이나 민족주의도 근대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과 그럴 수가 없다고 머리를 내젓는 일은 말하자면 동시에 일어났던 셈이다. 그후 점차,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가진 파괴력이나 목적에 대한 반발과 의구심으로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가급적 내셔널리즘, 네이션 혹은 국민 등의 표현을 쓰면서,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단어와 개념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앙드레 슈미드는 바로 이점을 멋지게 지적한다.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서북학회월보』 같은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민족”이라는 것이 청일전쟁 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개념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역자 정여울은 중요한 인용자료의 원문을 소개함으로써, 이해를 크게 높였다. 이점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시작되고, 문명개화론과 연관되었지만, 식민주의가 강화되고, 국권을 점차 상실해 가자, ‘국혼(민족혼)’, ‘국수(민족 정체성)’과 같은 추상적이면서, 영토와 분리된(그럴 수밖에 없는) 국가 없는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더 큰 상징권력을 확보하고, 강화하게 된다.
슈미드는 문명개화론이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모두의 바탕이 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족 주장과 국권 침탈이 모두 동일한 기반, 근대성을 확립하고, 세계 자본주의 질서로의 편입이라는 동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애국계몽운동 기간의 민족주의의 언설은 훗날 식민주의자의 언설에 채용되어서, 구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민족주의자들의 역사해석은 일본의 한국사 연구에서 시작된 것을 차용한 것이 많았는데다, 애국계몽운동의 기반인 문명개화론이 양쪽 모두에서 동일하게 활용되는 점은, 애국계몽과 자강운동이 결국 식민지에서 동화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결론에서 한국전쟁 후 이기백이 주도한 식민사관의 극복은 결국 동일하게 근대화론으로 수렴되어 오래된 목표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기백이 지적한 식민사관 극복의 내용으로 사대주의, 당파성, 정체성(멈춰있음), 문화적 기원의 결핍, 한반도의 지리적 외형에 중점을 둔 환경결정론은 실제 식민지 시기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조선이 일본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했으나, 갑오경장 이후 조선의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신문과 논설에 주장한 조선의 문제점들이었고,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 자본주의 세계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이었다. 근대성과 세계 자본주의 질서로의 편입이라는 기반 앞에서, 양자의 언설은 결국 닮게 된다.
인상적인 것은 슈미드의 연구에서 소위 말하는 전통과 근대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지적하는 부분이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단재 신채호의 『독사신론』이었다. 슈미드에 의하면 신채호는 족보를 재발견했다. 족보를 기술하는 방법을 역사기술법으로 가져와 왕조교체에 따른 정통성이라는 유교적 사관을 극복한다. 이점은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다. 민족사의 영역을 국경 밖으로 넓혀서, 단군조선에서 시작해서,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를 쓰며, 만주 회복을 꿈꾸는 논리를 펼쳤다. 나는 신채호에 대한 글은 꽤 읽었어도 『독사신론』을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요즘 세칭 ‘환빠’의 원조가 신채호였던 셈이다. 1710년부터 시작되어 이어지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갈등의 역사도 그렇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당시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신문을 통해 의병을 비판한 점이라든가, 개신유학을 표방하고, 유학자들을 독자로하는 『황성신문』과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의 차이나 논쟁. 역사를 창조하고, 기억의 장소, 아니 기억을 만들어 내는 과정. 당시 신문이 가진 영향력에 대한 이토 히로부미의 불평. 중화사상을 버리고, 문명개화하는 과정에서 식민주의로의 전환. 중국에 대한 태도와 일본의 대한 태도의 교차.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 서로 경쟁하다, ‘단기(檀箕, 단군과 기자) 이래’가 ‘단기(檀紀)가 되는 과정.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와 장지연의 『대한강역고』.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과 6할이상 일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판 자금으로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500엔을 지원받고, 그의 출판사에서 초판 1,000부를 찍어서 조선으로 가져온 것일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건 표절이라 할 수 없겠지, 저자의 승인을 받아, 편역한 것이라고 해야 하나.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의 남쪽과 북쪽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nation이 ‘국민’과 ‘공민’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 근간은 오래된 민족 관념과 민족주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역사적 경험과 자기 인식을 통해, 각각 새롭게 형성된 ‘국민’과 ‘공민’은 어떻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까.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중국 나름으로 체제의 취약성으로 지적되는 분열 혹은 분리 가능성 때문에 일종의 국민국가(nation state)를 형성하는 과정은 아닐까.
앙드레 슈미든 역사에서의 연속성과 장기지속 문제,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확산과 자본주의 질서에의 편입이라는 과제가 조선의 몰락, 애국계몽, 식민지,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국면과 언술을 통해 잘 보여준다. 식민지 시기 연구에서 일본 본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자각하게 되었다.
근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고대사에 집중하겠다는 건 뭐지. 신채호를 통해 제기된 민족주의와 해방 이후 근대화의 동맹을 다시 한 번 재현해 보겠다는 것일까.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중심부로 더 긴밀하게 결합하기 위해 어떤 장애나 의심도 없이 돌진하고 싶다는 것일까.
* 역자는 충실한 역주는 물론, 『황성신문』,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중요하게 인용된 기사의 원문을 게재하여 확인할 수 있게했고, 앙드레 슈미드가 오독한 것이 의심될 경우 이를 충실하게 밝혀놓았다. 이 책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후주를 참고하면서 읽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번역서의 쪽수를 인용했다.
*** 이 글의 저작권은 ⓒFELIVIEW.COM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