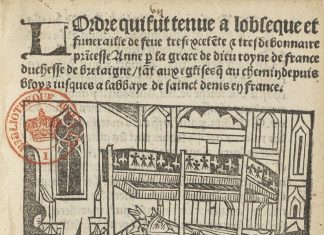우치다 준Jun Uchida, 『제국의 브로커들Brokers of Empire』, 한승동 역, 도서출판 길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20(2011).
영어판을 서가에 꽂아둔 지, 서너 해가 된지라, 번역본 출간이 더욱 반가웠다. 한국어판 서문에 나온 지 이미 9년이 지난 책이라는 말에는 지나친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서 다 읽고 난 지금은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조금은 지겹게 읽은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여느 때 같은 글을 쓸 느낌은 들지 않는다. 다만, 읽으면서 들었던 이런 저런 생각들을 정리해 두려고 한다.
정착민 즉 이주 식민자들, 이 책에서는 쓰지 않지만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일본에 돌아간 뒤에는 귀환자引揚者라고 말한다. 일본어로는 히키아게샤라고 읽는다. 우치다 준의 조부모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바로 그 귀환자 다시 말해 정착민이었다. 그래서 인지 이 글은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한 헌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비록 입장은 다르더라도.
챙겨 읽지도 않을 거면서 사두었던 것은 너무 많은 문헌에서 우치다 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집어 드는 책마다 참고문헌과 인용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서가 한층 더 반가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꼼꼼히 읽고 난 후의 느낌은 뭔가 껄끄럽다는 것. 아주 새로운 내용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부분이 흥미로웠다. 동민회와 갑자구락부도 그렇지만, 청일전쟁 이전부터 활동한 이주민들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었다.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내용은 다채롭게 이야기를 보완해 준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핵심이 아니다.
우치다 준의 이 연구에는 두 가지 이론적 자원이 깔려 있다. 하나는 포스트 식민주의 다른 하나는 비교사적 관점이다. 메리 루이스 프랫의 ‘접촉 지대’와 호미 바바의 ‘리미널리티’. 메리 루이스 프랫은 “접촉지대, 그것은 지배와 복종, 식민주의와 노예제도 등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가로질러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가 초래한 결과 속에서 이종문화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사회적 공간이다”(『제국의 시선』, 32)라고 정의한다. 우치다 준의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이런 접촉과 조우를 탐색하는 연구다. 그는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정착민, 다시 말해 재조일본인들의 정체성을 ‘리미널리티liminality’라고 평가한다. 연구자에 따라 간극성, 계역성, 역공간성 등의 조어로 대응하는 이 개념을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매 장의 결론 부분 마다 이런 설명이 꼭 등장한다. 그럼에도 역사적 궤적을 따라서 매 장마다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이 과연 그 정도로 입체적이고 한계적인지는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리미널한 인물은 녹기연맹에서 활동했던 현승엽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중추원 참의였고, 본인은 아나키스트 였다가 전향해서, 조선어 폐지까지 말하는 극렬 ‘친일’ 활동을 하다가, 이 경우에 친일이라는 안일한 표현이 어울리는 지에도 의심이 든다. 해방 후에는 일본으로 가서 주일 미국대사관 근무 경력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는 알 수 없는. 왠지 영화로 그려도 그럴 듯할 것 같은.
비교역사적 관점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이론적 설명을 구사할 때마다, 남아프리카의 영국 식민지, 로지디아나 케냐와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의 경우를 든다. 그곳의 이주 정착민들을 근거로 해서 성립시킨 정착 식민주의settler colonialsm[이주 식민지]의 사례가 우치다 준의 식민지 조선 연구의 중요한 비교 준거점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 식민지를 비교하는 관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23년 『프랑스령 알제리아 개관佛領アルゼリア概况』(税田谷五郎)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말하듯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드는 건 흔한 일이었다. 윤치호 일기에도 종종 나온다. 다른 식민지와 비교하는 관점이 사라진 것은 오히려 현대의 일인 듯한 느낌도. 일본 제국의 다른 식민지나 점령지인 타이완, 만주국, 중국의 화북지방 이나 내부 식민지인 훗카이도, 오키나와, 가라후토(남부 사할린)에 대한 연구는 종종 접했는데. 본격적으로 다른 식민지들과 비교하는 현대의 연구들은 접해 보질 못했다. 몇몇 참고문헌 목록을 기록해 두었다. 재조일본인연구는 佛教大学의 李昇燁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영국령 로지디아나 프랑스령 알제리와 비교하는 부분을 들여다 볼 때마다, 유사점 보다는 다른 점에 대한 생각을 감출 수 없었다. 식민지 조선이 단순한 점령 식민지 내지 착취 식민지로만은 볼 수 없다는 지적에는 어떤 유보도 없이 동의한다. 문제는 토착 국가다. 식민지를 점령하러 들어간 제국이 접수한 토착 국가의 행정 구조와 국가의 성격, 그 방식, 다시 말해 문명. 아프리카의 영국 식민지든 프랑스 식민지든 그것과 식민지 조선을 비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자긍심의 문제가 아니고, 접수해야만 했고, 접수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식민지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격차가 어느 정도이고, 문명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인가의 문제일 뿐. 결국 식민국가(총독부)를 제약한 것도, 정착민(이주민) 제약한 것도 결국 식민지 앞에 있던 조선이라는 국가였다. 그리고 조선이 양성해 놓은 나름의 엘리트들이었다. 식민국가는 결국은 이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런 차이들이 연구에 얼마나 깊이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형과 조직 형태, 구조, 개인들의 행동양식을 비교하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글 아래 깔려 있는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조선은 점령이나 이주에 의한 식민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국가를 강제적인 조약이라는 형태로 ‘합병annexation’한 식민지였다. 이 과정 자체가 제국 일본의 고민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한계도 보여준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어땠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40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셈이다.
연구는 정착민, 곧 이주정착민들과 식민국가와의 관계를 다채롭게 분석한다. 그러면서 프랑스령 알제리의 콜론colons들과 영국령의 정착민들과 줄곧 비교하면서 이들이 충분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고, 그랬기에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영국령 식민지의 이주정착민들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란 영국인으로서의 권리의 하나다. 그 기원은 최소한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권리가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미국 처럼 독립하거나, 호주, 뉴질랜드 처럼 자치로 나아간다. 로디지아나 케냐에서 이주정착민들이 특권을 누렸다 해도, 그것은 본국에서 영국인이 확보한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프랑스 식민지도 마찬가지다. 제3공화국의 프랑스나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영국의 민주주의를 과장할 생각도 폄하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그것과 당시 일본이 확보한 민주주의와 격차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정착민 다시 말해 재조일본인들의 정치적 한계는 일본 민주주의의 한계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권리도 마찬가지. 1945년 이전에 일본에 민주주의 최소한의 형태로나마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흔히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지칭하는 1차대전 후에서 1930년대의 군국주의 등장 이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정당내각 시기였다. 이 시기에도 나카에 초민이 말하는 ‘은사적 민권’의 한계 안에 있었다. 쟁취한 정치적 권력이 아니었다. 마치 아관파천기 대한제국이 열강의 세력균형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자주적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내각의 관할을 받지 않고 천황의 대권에 속하는 식민지 통치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전권을 행사하는 조선 총독, 이런 총독의 지휘를 받지 않는 천황의 통수 대권 안에서 움직이는 조선군 사령관. 이들 과의 관계에서 정착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식민지에서의 지배권도 유지해야 했으므로, 영사재판권과 함께 폐지된 자치에 대한 향수를 주장할 수 있었을 뿐이다. 게다가 총독의 직접 통치 이전의 자치라는 것도 학교, 수도, 병원과 같은 시설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의 겻이지, 자치 경찰 이나 민병 같은 무장력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차이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프랑스령 알제리 정착민과의 거듭되는 비교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런지는. 그런 비교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단지 의회에서 의석을 가지느냐만 가지고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국 민주주의 및 정치적 권리 확보와의 연관성, 그리고 식민지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유의미한 수준의 비교가 가능할 것 같다. 이래저래 찾아 볼 목록만 늘어간다.
다소 억지스런 이론 적용도 등장한다. 193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를 코포라티즘에 비견한 부분이다. 조합주의적 식민 통치란 신박한 이야기이긴 하다. 이런 논의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초창기 10년의 무단 통치기는 점령 군사 통치 기간(데라우치 총독)이고, 3.1 운동 이후의 소위 문화정치(사이토 총독) 기간은 일종의 유사 민주주의이고, 만주사변 이후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초기는 국가 조합주의이든 사회조합주의이든 일종의 조합주의 국가(우가키 총독)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총력전을 위한 국가 총동원(미나미 총독) 기간이라는. 40년에 못 미치는 짧은 기간 동안 군사 독재에서 의사 민주주의를 거쳐 조합주의를 지나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간다는 식의 논의는 뭐랄까 좀 이론의 과잉 같은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보니 이 책을 통째로 비판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우치다 준의 관점과 시각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재조일본인은 물론이고, 식민지에서 형성된 엘리트나 중간계급에 대한 연구나 만주 붐이 미친 영향 등이 매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를 평면적 수탈로만 보는 관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슨 식민지적 근대가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도 나름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의 시대를 이어가는 기반을 만들어 낸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요즘 일본 식민지 시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과거나 관행이 쓸모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청산주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조선은 과거를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나라였다. 식민지 40년의 단절, 분단, 전쟁 그리고 새로운 국민국가의 수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나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한 가지 만큼은 확실하게 DNA에 각인된 느낌이 든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필요하면 언제든 받아들이지만 효용성이 없다면.
덧붙여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지점, 일종의 리미널 공간에 존재하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번역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국민’으로 옮길 것인가의 문제다. 이 책은 citizen을 국민으로 옮겼다. 또 하나 kokumin도 국민으로 옮겼다. 둘 다 한 마디로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하기 어렵다. 한 발 더 나아가 citizenship은 ‘국민자격’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 사례에서는 종종 ‘시민’이나 ‘시민권’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어쩌면 한국에 있는지도 모른다. 2016년 겨울의 촛불 이후, 국민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정치적 언어적 시민권을 얻었다. 이제 이 단어는 주권자 인민the people의 번역어로 자리잡았다. 동시에 이 단어는 한국인의 국적을 뜻하는 nationality의 번역어이기도 하다. 국민이란 full citizenship을 뜻하기도 한다. 게다가 때로는 nation의 번역어가 되기도 한다. 예전보다 점점 더 그렇다. 남한과 북한이 과거의 종족적ethnic한 민족nation으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를 점점 더 중단하고, 남한과 북한이 각기 다른 국민nation을 구성해서 다른 정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점점 더 정치공동체를 뜻하는 nation을 민족으로 번역하기가 껄끄러워진다. 그래서 인지 아예 네이션이라고 쓰는 경우도 없지 않고, the people 같은 경우 심심치 않게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인민이라는 단어를 학술장에서 거리낌 없이 쓰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분단된 민족이라는 정서적 구애감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이라는 말의 범용성이 오히려 말을 분화시키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은 모두 있었지만, 1970년대까지 국민이란 호명은 citizen 보다는 subject에 가까운 말이었다. 임현진, 한완상 같은 지금은 잊혀진 이들이 ‘민중’이라는 호명을 불러낸 것도 그 때문이다. 얼마전 백기완 선생이 유명을 달리한 것처럼, 이제는 민중이라는 단어 조차 왠지 낡아보인다.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감각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것이 못된다.
kokumin은 물론 國民을 일본식으로 읽은 말이니 만큼 국민으로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고, 영어판 index에서도 kokumin을 citizen, people이라고 병기하고 있으니 이들 모두를 국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어쩐지 납작해진 느낌이다. 우치다 준은 이 당시의 kokumin이 citizen-subject라고 설명하는 Kyu Hyun Kim의 논의를 활용하기도 한다.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대일본제국에서 말하는 국민이 사실상 신민subject이었고,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사실이야 상식에 속하고. 그런 이들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시민권(여기서는 국민자격) 확보로 보는 것도. 그리고 이 논의는 메이지 초기의 국민주의, 국가주의나 전후의 초국가주의(ultranationalism, 이 책에서는 극우민족주의)에서의 정치적 주체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는. 아마도 우치다 준은 그런 어감을 살리기 위해 kokumin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은 국민-신민이라는 말이 틀렸다기 보다는 납작하다는 것. 구헌법이라고 불리는 메이지 흠정헌법(대일본제국헌법)에는 국민kokumi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는다.
어찌보면 언어공동체의 일종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 people에게 인민이라는 번역어를 돌려주고, nation은 곤란하면, 네이션이라고 쓰는 경우가 등장하는 것처럼. citizen을 정치적 권리라는 뜻에서 시민으로 스스럼 없이 번역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국민이라는 호명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채,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그러고보니 공항에서 국적자를 가리킬 때, 내국인 또는 아국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 혼동은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영어판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minzoku와 minjok의 구별이었다. 그것 말고도 한국어 민족으로 옮겨지는 것은 nation과 national도 있다. 그리고 ethnic과 ethnicity도 민족으로 옮긴다. 일본 식민지 시기에도 민족은 민족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동시에 종족 구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호적이나 도항증에 민족 구분 란이 있었다. 거기에 조선, 내지를 기입했다. 대만이나 만주는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식민지, 일본어로는 외지外地라고 하는 이 지역들에서 일본은 표준적이고 통일된 관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 마다 다르게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과 용어들을 사용했다. 이것이 일본의 식민 지배의 특징 중 하나다. 조선으로 옮겨진 Chōsen, Chosŏn, Korea도. 영어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이중 언어적 표기가 식민지적 리미널리티를 부각시킨다. 한국어에서 민족みんぞく이나 조선ちょうせん 또는 국민こくみん이라고 쓰면 비난을 받겠지만, 이런 표기법은 일본어에서 한자에 읽는 방법 즉 후리가나를 다는 것의 변형인데. 가타가나로 외래어를 표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말들이 민조쿠, 쵸오센, 고쿠민인 것은 분명하다. 민족, 조선, 국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한자나 한국어, 일본어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차이가 음역transliterate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좀 매력적이었다. 그런게 꽤 나오면서, 뇌세포를 깨운다. 이런 점에서는 색인이 참 괜찮았다. 영어, 일본어와 한국어 음역에 한자 표기가 뒤섞인.
이런 것들 말고 곤란한 것도 꽤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윤식인데. 우치다 준이 김윤식의 생몰연대를 1903-1950으로 표기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했던지 한국어판에서는 영랑 김윤식 1903-1950과 운양 김윤식 1835-1922 두 사람으로 나누어 버렸다. 시인 김영랑은 이 책에 언급되지 않는다. 구한말 관료였던 김윤식뿐이다. 22쪽의 지도에서는 바다를 땅으로 메꾸기도 했고. kōminka와 imperializaiton으로 표기된 것은 모두 황민화皇民化인데. 책의 앞부분에서는 국민화로 옮기기도 했고, 뒷부분에서는 공민화公民化로 옮기기도 했다. 황민회를 공민회로 쓰기도 했다. imperial way를 제국의 길이라고 한 것도 보이는 데. 황도皇道다. imperial subjecthood는 제국 주체성이 아니라, 황국신민다움 정도가 될 듯. Rescript on educaton을 1938년 교육칙어 개정이라고 했으나,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이다. 거류민협회라고 쓰고 있는데. 거류민단이다. 중간중간 중의원과 참의원도 나오는데, both Houses of Diet의 의역이지만, 참의원은 전후에 생겼고, 과거에는 귀족원이었다. 지방의회 명칭이 여러 곳에서 헷갈린다. 부협의회와 도평의회라는 자문조직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부회와 도회로 바뀐다. 협의회원, 평의회원이 나중에 의원이 된다. local council에서 local assembly로 바뀐다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정치적 자율권이 주어졌는지는 솔직히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름과 구성방식이 모두 바뀐 것은 사실이다. 이를 모두 지역협의회, 의원으로 쓰고 있다. 뒷부분에 쵸카이町会와 동회洞会를 community council이라고 표기하는 데, 이것도 지역협의회로 옮겼다. 앞의 것들은 도와 시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뒤의 것은 애국반이나 도나리구미 같은 근린 조직 단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식으로든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council은 거의 모두 협의회로 옮겼지만, council이 의회 기능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industry는 거의 대부분 산업으로 옮긴다. 산업 이라는 말을 이 시대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공업, 공업화 등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 적어도 1970년대 이후까지 어느 순간부터 공업이 모두 산업으로 바뀌없는데. 서비스업과 정보 산업의 비중이 커진 최근의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옛 문헌에는 공업이 압도적이다. 체제는 regime의 번역어이고, 면밀하게 따지면 system과도 구분된다. 국가체제, 사회체제, 식민지체제 등으로 표기된 말들이 좀 있는데, 원래 regime 또는 system이 없는 경우가 적잖다. 체제라는 용어를 보조명사나 조사처럼 첨가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본다. polity는 정치체제라기 보다는 정치체나 정체로 새겨야 한다. 앞부분에서는 colonial state와 colonial government를 총독부로 protectorate state를 통감부로 옮겼다. colonial state를 총독부로 바로 옮기게 되면, 지칭하는 바는 달라지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어감, 전능감이 강해져서,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읽힐 수 있다. 식민국가라는 표현은 식민지에서도 국가와 사회 사이의 긴장과 갈등, 본국과 식민지 간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때로는 Government-General 즉, 총독부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대략 앞에서 절반 조금 모자라는 정도는 총독부로 바꾸어서 옮기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식민국가, 식민정부, 식민당국으로 그대로 옮기고 있다. 이건 틀렸다기 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흥미로운 점을 하나 덧붙이면 vernacular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방어 또는 일상어로, 간혹 고유어로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하는 인쇄 자본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다. 『朝鮮日報』와 『東亞日報』를 일관되게 지칭하는 vernacular press는 조선어 신문으로 바뀌어져 있다. 왠지 저자는 네이션의 형성과 복잡성을 말하지만, 왠지 번역문에선 단일한 네이션이 이미 확립된 것 같지 않은가. 참고로 식민국가는 공식적으로 언문諺文신문이라고 말했다. 언문의 諺자는 상말을 가리키는 말이라. 국문은 당연하게도 일본어. 언문이란 식민국가가 발명해낸 말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 한글을 속되게 부르던 명칭이기도 해서. 기묘한 느낌을 준다. 언문은 vernacular를 거쳐 조선어가 되었다. 뭔가 과정을 건너뛰어 결과를 도약한 느낌이랄까. 위에 언급한 조선으로 옮겨진 것도 생각보다 다양한데. 모국 내지는 본국으로 번역되는 metropole의 대응어인 colony도 종종 조선이라고 이름을 찾아주었고, 무엇보다 peninsula가 조선으로 옮겨져 있다. 뒤로 가면서 조선반도로 옮겨지기도 하는데. 내지内地와 외지外地 그중에서도 반도半島는 서구 제국주의와 차이를 주장하기 위해 식민이라는 단어를 꺼려했던 일본이 주로 사용하던 어법이기도 하지만, 1930년대가 진행되어 가면서 동화를 꿈꾼(꿈으로 그친) 조선인 엘리트들도 대일본제국 내지 대동아제국 내의 한 지방으로서 조선이라는 지명 대신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다. 제국의 일부가 되려고 했던. 그 반도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찾아주어, 조선반도로 옮긴 것은. 지나친 친절일까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말로 islands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오던데. 역시 열도라고 하지 않고, 일본으로 정확하게 옮겼다. 그러고 보니 local도 식민지 조선으로 옮겨서 그것도 지나치게 정확한 지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층적 의미가 눌려 납작해진 느낌. 크로와상이 식빵이 된 느낌이랄까. 생각나는 것만 몇 개 적는다. 그만 적어야 겠다.
처음에는 너무나 유려하게 술술 읽혀서 즐겁게 읽다가 김윤식을 발견하고는 꼼꼼히 대조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다. 정오표 같이 정리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지치고 피곤해서 책을 그만 덮어야 겠다. 이 책을 인용하려는 연구자라면 정확성을 위해서 대조하기를 권한다.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말들을 익숙한 방식으로 늘어놓은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달까. 영미권 아시아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지인들의 평가도 계속 맴돌고.
*** 좀 기묘한 생각이 맴돌아 첨언한다. 한국 식민지 상황을 가리키는 영미권 연구서들은 보편 용어로 이들을 기술한다. 시민이나 지방의회 처럼, 대부분이 그렇다.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한국사를 전개할 때는 고유명사나 당시 사용했던 말을 되살린다. 이 두 완성품을 읽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아닐까. 서로 다른 언어체계 속에서, 이 책의 번역은 꽤 상당한 정도로 당시 사용했던 말을 찾아 쓰기는 했으되, 모두 찾아쓰지는 못했다. 전문가, 당시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보편 언어가 살아났다. 그런데 한국어의 일상 용어에서는 이런 보편 용어들은 식민지 이후 시대, 때로는 민주화 이후 시대의 국가나 사회기구에만 적용된다. 식민지 시기에는 또는 그 이전은 colonial한 또는 feudal한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데. 이를 영어로 쓰면 이런 차이가 사라져 버린다. 번역자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편언어의 개념들로 씌어진 식민지 시대 한국사는 영어로 읽을 때와 한국어로 읽을 때, 어감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우연찮게 그런 굴절과 차이, 그리고 과정을 노출한 것 뿐이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이 둘은 같은 담론을 담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그럴 수 있기나 한 것일까.
2021. 3. 10.
* 이 글의 저작권은 ⓒFELIVIEW.COM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