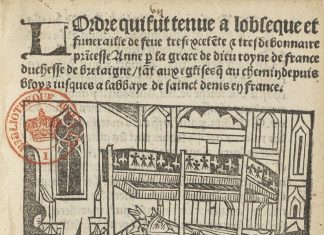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무과홍패로 동치同治8년 즉, 서기 1869년의 것이다. 고종 재위 6년으로 당시는 대원군 집권기였다. 무과 병과 343등이다. 합격증에 성적을 매기다니. 지금도 그렇지. 사법시험 수석이니 연수원 차석이니. 참 오래도 간다. 둘다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유진 Y. 박Eugene Y. Park, 『조선 무인의 역사, 1600~1894년Between Dreams and Reality: The Military Examination in Late Chosŏn Korea, 1600-1894』, 유현재 역, 푸른역사(Harvard Univ. Asia Center), 2018(2007).
제목을 듣고 무예도보통지에서 따온 책표지를 보면, 뭔가 무예를 겨루는 무인들의 역사를 상상할런지 모른다. 국왕의 호위무사나 무림의 고수나, 무술 비급이나. 결론을 말하면 그런 건 단 한쪽도 없다. 이 책의 내용은 영문 제목이 정확하게 말해준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조선 후기의 무과”, 조선 후기 무과급제자에 대한 연구다. 이 연구는 물론 에드워드 와그너와 송준호의 문과급제자 연구, 즉 문과방목 연구를 잇는 것이다. 유진 Y. 박(한국명 박영진)은 무과급제자 명부인 「武科榜目」을 연구한다. 한국인 연구자인 심승구와 정해은의 연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그는 와그너와 팔레 그리고 던컨과 슐츠의 조선 지배엘리트의 연속성 주장을 이으면서 이를 보완한다. ‘무과’란 대항 엘리트를 형성하는 구조도 신분제를 해체하는 기제도 아니라, 기존 지배체제를 보완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 책은 그의 하버드대 1999년 박사학위 논문인 Military Officials in Chosŏn Korea 1392-1863(조선의 무관)에 기반하여 이를 보완해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본은 20년된 연구다. 이점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럼에도 생각하고 참고할 점이 많다.
유진 박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간략한 요약은 자신의 논문 「조선 후기의 무과제도와 한국의 근대성」(『한국문화』, 2010)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이 논문은 공개되어 있다. 이 논문을 훓어보다 보면 기이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 ‘근대성’ 부분이 따로 노는 느낌이고 무엇을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 사실 그것은 이 책에서도 반복되는 데. 사료를 근거로한 풍부한 기술과 구성에서는 많은 점을 배우게 되지만, 그것이 이론과 마주하는 지점들에서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걸 이해하려면 상당히 고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럴 가치는 충분하다. 아, 그리고 물론 그 논문은 좋은 요약이지만, 요약은 어디까지나 요약일 뿐, 책이 훨씬 재밌다.
유진 박은 서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무과에 급제한다고 해도 주요 관직 등의 보상도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왜 무과를 보았을까? 실제 필요한 인원은 많지 않았는데, 왜 국가는 군사기구를 유지했을까? 그리고 이 군사제도는 국가방어에 왜 실패했을까?(7) 조선후기의 무과는 양반사회에서 입지를 보장해주는 정치적 역할과, 강고한 신분구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긴장관계를 완화시켜주는 사회문화적 수단으로 기능했다.(8) 조선 왕조가 안정적으로 긴 시간 유지된 것은 정치·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다. 무과의 변화도 여기에 속한다.(8) 지금까지 조선의 무과급제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록 즉 ‘방목’이 적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武科榜目」은 유실되었기 때문에 총 15만에서 17만 명으로 추정되는 무과급제자들 가운데, 현재 24,000명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역사서나 문집에 등장하는 비중도 적다.(9) 그렇다고는 하지만, 조선시대 전체의 문과급제자가 14,600명선인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숫자다. 10배가 넘는다. 잡과는 이보다도 작다. 1980년대에는 조선의 중앙관료체제에서 무관직이 회변혁의 주된 통로라는 가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9) 조선후기 무과제도에 대한 연구는 첫째 1980년 이전 연구들로 무과급제자 숫자의 증가와 이러한 증가가 사회질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는 것, 둘째, 조선 후기 무과를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면서, 사회질서의 개편과 하층민의 신분상승을 초래했는지에 조심스러운 입장, 셋째, 중앙관료체제 내에서 무과급제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집권층의 분화에 무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첫째는 이홍렬과 송준호,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주요 연구자가 심승구와 정해은이다.(10) 그러면서 그간의 한국 사학계가 식민지 사학 즉, 조선 역사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두 시도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반의 확대라는 국내 학계의 주장과 소수가 일관되게 중앙권력을 행사했다는 서국의 한국학계의 두 견해를 제시한다.(11)
유진 박은 한국 역사에서 장기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조선시대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기존 방식 대신 피지배층들이 자신의 지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조선시대 사회계층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12) 이때 피지배층은 아마도 nonelites이거나 nonelites and marginalized elites일 것이다. 영어책을 아직 입수하지 못해서 이건 아직 확인을 못했다. 학교에 있지 않는 나는 확인할 때마다 책을 사야 한다. 어쨌든, 이 책은 미리보기도 없어서 구글북스로 검색해서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 nonelites는 피지배층으로 때론 nonelites, as well as more marginalized elites를 피지배층(209, 20행)으로, 그러나 nonelites and marginalized elites를 피지배층과 권력에서 도태된 양반(222, 11행)으로 옮기기도 한다. 단어나 어구를 일대 일로 옮기는 것만이 올바른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융통성은 일반적으로 번역에서는 허용되는 수준이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역자가 한국사 연구자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풀어서 옮겼을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elites, local elites, nonelites 그리고 marginalized elites를 저자가 계층의 범주를 분류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저자는 2장은 무인 귀족 military aristocracy(벌열 무반), 3장은 지방 엘리트local elites(향촌 지배층), 4장은 양반의 응집 yangban cohesiveness(양반층의 결집), 5장은 nonelites 비엘리트(피지배층)이라는 다소 일관성있는 구분을 하고 있다. 2장의 무인 귀족은 중앙 엘리트에서 낙오한 이들이 무인 귀족으로, 즉 중앙 무인 엘리트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3장의 지방 엘리트는 삼남 지방, 서북 지방, 그리고 개성(구 고려)의 중앙에서 소외된 엘리트들의 대응 방식이고, 4장은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양반들 즉 중앙 문신 귀족층(경화거족)과 중앙 무인 귀족층(벌열 무반) 그리고 지방 엘리트(향촌 양반과 재지사족)이 혼인과 입양 등의 관계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고, 마지막 5장에서 비엘리트 즉, 중인, 평민, 노비의 무과를 활용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가 굳이 이를 양반yangban이라는 보다 통념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피하고, elite라는 용어로 보다 다양한 집단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12)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엘리트elite라는 단어를 매번 노출시키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는지. 권력층, 지배층으로 표기하고, nonelites는 피지배층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marginalized elites인데 그것을 모두 살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꽤 여러번 나오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된다. 피지배층 즉 nonelites에 포함시킨 경우, 권력에서 도태된 양반으로 해석하는 경우, 유진 박은 엘리트와 양반을 섞어쓰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marginalized는 종종 소외된으로 옮기는 것 같다. 영호남 양반이나 서북 엘리트를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식의 개념화는 굳이 불필요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관성과 방향을 보여주고, 또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평가는 이런 식의 조작적 개념화가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관련되는 것이다. 조선 시대 연구든 한국사회 연구든 이런 식의 조작적 개념화를 시도하는 것은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그 시도에 대해서 만이라도 높은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념화의 성공 여부는 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평가해 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미주 2번이 꽤나 중요하다. “필자는 보토모어T. B. Bottomore를 따라 ‘사회에서 기능적 혹은 주로 직능적으로 높은 신분인 집단’, 즉 인구 나머지에 비해 높은 신분을 유지한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엘리트elit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그 집단은 나머지에 비해 우월한 신분을 향유하고 있었다(Bottomore, 8, 12). 그런데 번역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엘리트’를 ‘집권층’, ‘지배층’ 등의 다른 용어로 대체한 경우도 있다(I follow Bottomore in using the term “elites” in the sense of “functional, mainly ocuupational, groups which have high status (for whatever reason) in a society,” hence, a group enjoying a status superior to the rest of the population, Bottomore, 8, 12).”(232)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으나 서평을 쓰려고 하면서 개념적 논의의 사용 부분을 따져보다가 위의 문제점들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된다. 맨처음의 불만은 사소한 거였다. 참고문헌에 Bottomore가 없었다. 다시 구글 북스로 확인 Bottomore, T. B., Elites and Society, 1965. 다행히 이 책은 국문 번역본이 있다. 진덕규가 번역한 박영문고로 『엘리트와 사회』라는 제목이었다. 신기하게도 보토모어의 책은 70년대말과 80년대 초에 한국어로 서너권 번역되었다. 이런 일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를 제외하고는 해롤드 라스웰 정도가 있을 것이다. 보토모어의 책을 훑어보았는데. 모스카와 파레토로부터 C. 라이트 밀즈의 파워 엘리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엘리트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보토모어는 마르크스 연구자다. 마르크스주의를 얼마나 신봉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인지, 엘리트론이나 계급론이나 결정론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계급론은 미래의 계급 없는 사회로의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엘리트론은 그렇지 않고, 현재의 민주주의론을 수용하지만, 계급 없는 사회의 희망은 담지 않고 있는 둘다 결정론이라는 비판이었다. 보토모어의 엘리트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신분(지위), 우월성, 기능적, 직업적(또는 전문적) 그리고 소수라는 다섯 개의 단어였다. 그의 글에서 벌써 계급론과 엘리트론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유진 박이 계층론과 계급론을 구별하는 기반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엘리트론의 다섯 가지 특성이야 말로 약간의 개방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 무과 급제자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기존에 가진 양반이나 신분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것은 송도 즉 개성 지방의 엘리트를 이야기할 때 설명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 ‘엘리트’의 변주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미주 2번이 붙은 문장을 살펴보는데, 앞으로 올라가도 elites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는 주가 붙은 자리를 의심했는데. 이건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다. 역시 주문을. 주번호를 장별로 나누지 않고 일련번호를 붙인 것은 아마도 작업한 프로그램 탓인가.
다시 조선 사회계층에 대한 이해를 피지배층으로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여기에 marginalized elites의 포함여부가 궁금한데, ‘계급class’대신 ‘신분status’를 분석의 범주로 선택해야 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보통은 조선시대의 사회계층을 ‘신분’이라고 지칭하는 데, 이는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2) 나는 이 문장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우선, 조선 시대 분석 단위로서 계급과 신분 사이에 논쟁이 있다는 주장, 일시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좌파 민족주의 열정이 들끓던 시기가. 그러나 1999년(박사학위논문)은 이미 그런 논쟁이 훌쩍 지나간 시기가 아니던가. 아직 사구체 논쟁이 한창이라 조선시대에 대해서도 계급론 논쟁이 있었나? 그러면서 ‘신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계급이 아닌 것은 모두 계층인 것인가, 이어지는 약간의 논의를 보면 계급이 아니어서 계층이라는 식의 논의이다. 물론 근대를 다루고 있다면, 그런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계층이란 신분제가 해체된 이후에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계층론이란 계측의 획득 가능성과 이동 가능성을 밑에 깔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근대적 신분제와는 다르다. 유진 박은 세습에 의해 신분이 고착되는 신분론이 아닌 유동성의 여지를 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분론은 4개의 신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서, 사회계층론을 도입해서 다양한 층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의 계층론은 바로 엘리트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전근대의 신분을 과감하게 계층으로 부르는데, 그건 그럴 수 있다 할지라고 그 객관화의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넘어간다. 유진 박은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회계층론은 일반이론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경직적인 시스템도 그 하나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사회계층론의 한 사례로 들 수 있는 이상, 조선의 신분제를 사회계층으로 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사회계층론은 근대 미국과 서유럽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근대 사회 시스템의 다양성과 유동성, 유연성 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지, 신분제를 설명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신분제를 계층으로 설명할 때, 기존의 신분제에 의한 설명보다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밝히고 입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건 계층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부르디외에게 맡긴다.
「조선후기의 무과제도와 한국의 근대성」이란 논문은 그래서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글이기도 하다. 북미의 한국사 연구자득은 중세medieval, 근세early modern은 서양사 논의에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세로 계보가 소급되지 않는 전문직 중인, 북부지방의 유력 토착 가문의 중간 계층 구성, 이들의 무과응시 및 경제적 활동과 자본의 툭적, 피지배층의 성장과 대중문화의 발달 등을 볼 때, 조선의 무과제도는 한국의 근대성 논의에 풍부한 소재를 던지며,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고대나 중세보다 근현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315-317)고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장기 근대를 주장하는 해석인데. 최근에 미야지마 히로시 등이 주장해서 좀 더 알려졌다. 역시, 주74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학자로 R. Bin Wong의 China Transformed,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 케네스 포메란츠 『대분기』, 미야지마 히로시 등을 들고 있다. Winston Wan Lo도 인용하는데, 그는 송대 연구자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의 장기 근대를 주장하는 해석은 내 기억에 나이토 고난内藤湖南이 그 시작이다. 송나라에서 중국의 근대의 시작, 즉 근세를 찾는 해석이다. 그의 동양학과 중국학을 제국주의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유진 박도 이런 견해에 대해 완전히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하지는 않고, 애매하게 말끝을 흐린다. 아마도 그의 해석에 따르면 조선의 무과는 끝내 실패했기 때문일 것 같다.
아마도 조선시대를 완전히 전근대 신분사회로 보고 싶지 않다는 그의 입장이 이 글에서도 계층론과 계급론의 애매한 대립을 유발하는 것 같다. 이 점은 사실 유감스럽다. 예를 들면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도 베버주의자도 아닌 E. P. 톰슨의 계급론을 제시하면서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인용해서 계급이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승된 전통, 가치체계values, 관념ideology 그리고 여러 제도들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황과 이해관계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나타나며, 이상화된 구분 대신 생생한 물질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2-13) 에드워드 파머 톰슨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럼 누가 마르크스주의자인 거지? 보토모어도 아니고? 도대체 유진 박이 생각하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어떤 사람이지 교조적인 5단계 사회발전론을 주장하는 사람인 건가? 스탈린주의자나 트로츠키주의자가 마르크스주의자인건가? 이상화는 아마도 idealized일테니, 이념화된 구분일 거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논문에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목적론적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에 끼워 맞추려는 것’이라는 팔레의 글을 인용한 부분(315)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서 서구의 한국사 연구자들이 비판하는 한국사학계의 마르크스주의(내가 비판하는 입장에서 민족주의)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던 ‘속류 마르크스주의vulgar marxism’인 것을 알게 된다. 동시에 그 비판의 화살끝은 사회발전 5단계론 또는 역사발전 5단계론에 입각해서 조선사회를 중세사회 및 중세사회의 해체기로 지정하여, 조선말기로 갈수록 지배연속성이 해체되고 그 안에서 근대의 맹아가 생긴다는 자본주의 맹아론 또는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된다. 그러나 그걸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판하는 순간 거대한 소동이 생겨난다. 이런 식의 발전 사관을 가진 사람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래서 선주 김의 홍경래의 난 연구를 비평한 오수창은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했다며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판의 지점은 분명하되, 그 화살은 틀렸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이며, 현재 혹은 서구가 도달한 미래를 이상향 내지는 더 나은 모델로 상정하고 그것을 향해 움직여나가는 발전사관인 동시에 진보사관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헤겔주의적 목적론이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도 헤겔을 전복했을지는 몰라도 헤겔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목적론적 발전 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좌와 우의 민족주의를 포괄할 수 있고, 심지어 거기에는 뉴라이트류의 식민지 근대화론 마저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헤겔리안이다.
유진 박은 막스 베버의 신분status은 경제외적인 명예honor, 위신prestige 그리고 종교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져와서 조선의 상황 속에서 신분은 대대로 세습되는 지위, 정규교육, 직업에 대한 지위, 적절한 사회 활동,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에 기반한다고 설명한다.(13) 그리고 다시 조선 후기 사회질서를 생각하면 계급보다 계층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양반, 중인, 평민, 천민이 경제적인 것 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분을 다시 슬쩍 계층이라고 한다.(13-14) 조선 후기에 토지 소유와 상업 발전 등으로 계급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과 계급의 상관관계는 낮았다는 것.(14) 그러면서 지주-소작 관계에 의한 계급관계가 명확해진 것은 조선의 마지막 10년간이라고 한다.(15) 그렇다면 대원군 집권 이후를 말하는데, 여튼. 그러면서 조선 후기 연구자들은 지방귀족들이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향권鄕權을 빼앗겼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한다.(16) 심재훈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국내 논의에 가장 밝은 해외 한국학자라고 평하던데. 그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나는 그저 조선 후기를 보는 관점으로 엘리트를 평가하면서 굳이 신분이나 양반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물론 신분이나 양반은 분석 단위로 쓰기에 무척 애매할 뿐더러 수많은 논의가 따라나오므로, 계층을 언급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계급론을 거부하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동의한다. 유진 박은 이 논의에서 신분 내적 다양성과 신분 간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한국사학자들처럼 분명한 동의는 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정당화 기제를 무과가 제공하는데 그건 있지도 않았던 중세 봉건 사회의 붕괴가 아니라, 조선 시대에 잠재해 있던 모더니티라고, 일종의 동아시아 장기근대, 말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애매모호한 거대담론과 유진 박이 한 실증적인 분석이 서로 결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걸 이으려면 중간에 수많은 개념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그에게는 부르디외가 아니었나 싶다. 여기서 일단 지적해 놓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의 구성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계급론과 계층론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나름 치열하게 싸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계급론이 한국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은 것은 조선 후기 만이 아니라 근대 한국 그 자체였다. 이 책의 독자가 미국인 또는 서양인이라 계급, 계층, 신분을 가볍게 오가는 논의에 쉽게 동의하고 움직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 논의가 적잖은 무게와 갈등의 역사를 깔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지금도 언론에서 통상 사용되는 단어인 중산층中産層이란 중간 정도의 자산을 가진 계층 정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은 middle class의 번역어이다. 이걸 중산층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이다. 중간계급은 재산 또는 자산을 가진 계층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반대로 마르크스주의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일 뿐이다. 이걸 중간 계급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계급과 계층 논의가 어떤 이념적 함의를 지니는지 보여준다. 중간층이라고 하든 신중간층이라고 하든 뭐든. 일본에서는 아예 층도 빼도 ‘중류’라고 하지 않던가. ‘一億総中流’는 자민당의 정책 목표이자 선거 캐치 프레이즈였다. 때문에 신분을 계층이라고 말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하는데. 계층론은 베버의 신분론에서 슬쩍 넘어가버리는 것이 도시 맘에 들지 않는다. 물론 사회계층론을 미국에서 주장한 탈콧 파슨스는 당근 미국에서 베버의 소개자이자 해석자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겠지 싶으면서도. 기능주의론까지 가게 되면, 신분제와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엘리트론으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거기도 functional, occupational이란 두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 문제는 영어책을 손에 넣으면 조금 더 살펴볼 생각이다.
유진 박은 조선 후기 사회의 무과제도의 위상을 분석하기 위해, 조선 시대 전체 무과급제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2,327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무과제도 관련 자료를 보다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 법전, 호적, 읍지, 문집, 방목, 족보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무과제도가 당시의 서민문화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고찰했으며, 마지막으로 방법론과 이론적인 이슈를 고찰하고 있다. 사회시스템이 기능하는 방식과 숨겨진 구조, 구조와 행위 주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다.(17-18) 이 마지막 네번째 특징이 이 연구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빛나는 점이라고 하겠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줄곧 그런 개념의 사용과 개념 규정에 집중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가 직접 인용하는 학자는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윌리엄 스월William H. Sewell, Jr의 “A Theory of Structure: Duality, Agency, and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92)이다. 그는 프랑스 노동, 사회, 정치, 역사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스월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혹은 ‘스키마’ 개념, 특히 ‘스키마’는 행위자의 실천이자 실천의 인식틀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아비투스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구조의 개념을 활용하는데, 한쪽에는 사회적 삶의 실천이나 재생산에 적용되는 스키마로서 행위자의 마음속에 있는 비물질적 차원virtual existence가 있고, 다른 한쪽에 권력의 원천으로 제공될 자원resources의 세계 속에 있는 물질적 차원real existence이 있다. 스키마는 전이될 수 있으며, 시공간을 가로질서 광범위한 상황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오로지 실천practice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점에서 비물질적이다. 이 구조는 스키마에 대한 지식과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다. 구조는 스키마와 자원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일상의 삶에서 여러 행위를 표출하지만, 행위의 성격과 힘은 행위자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사회적 환경에 따라 행위자들은 자원과 지식 혹은 스키마에 접근하여 이용하게 된다.(18-19) 조선 후기의 다층적 구조 가운데, 정치적 장arenas, 사회적·문화적으로 구획된 영역들regions 민중문화의 장르genres들이 이 연구에서 중요하다. 이 구조를 재생산하고 주조한 스키마는 귀족들이 지배하는 유교담론으로부터 글이나 구전으로 평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웅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다.스키마는 여러 자원을 통해 활성화되며, 스키마나 자원의 효과는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무과에 급제하는 숫자의 규모다. 19세기에는 스키마는 줄어들고, 정규군은 강력해지고 있었다. 이는 새롭다기 보다, 달라진 구조에 맞게 변형되어 국가의 보수적인 개혁이나 국가에 필요한 행위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은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이 아닌 근면한 성리학적 군주가 당색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왕정을 요구했다.(19-20) 유진 박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 즉, 가문의 배경, 사회계급, 교육과 같이 함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경제적 자산의 총합을 이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부르디외의 오토넘autonum과 아비투스의 지체 현상hysteresis 라는 개념을 가져 온다. 아비투스의 지체 현상에 따르면 개급의식과 상승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소는 인증된 증서가 필요한데, 이는 귀족 사이에서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것이 바로 무과급제이며, 급제자에게 내려주는 홍패(붉은 종이에 쓴 합격증) 같은 증서는 ‘오토넘’ 내에서는 영향력이 있다. 유진 박은 부르디외의 통찰을 조선 후기의 상이한 역사적 시기moment에 적합하게 조정하면서 활용한다.(20-21)
유진 박의 부르디외 인용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대략 서너번에 걸쳐, 자신의 논의가 가지는 함의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룬다. 핵심은 실제 간략하다. 실제 관직도 특권도 얻을 수 없는 ‘붉은 색 종이 쪼가리’에 왜들 그렇게 매달리고, 그걸 또 한 번에 만장씩 날리는 ‘萬科’가 먹혀들고, 그러다가 그 가치가 변화하고 나중에는 외면 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나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훨씬 본격적으로 이 논의를 끌어오고 있다.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는 한 장, 한 장 따져보는 과정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래전 『구별짓기』를 읽고 반했지만, 그 후론 읽어보지 못한 탓에. 요즘 하도 여러사람이 부르디외를 이론적 자원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서, 부르디외를 좀 차분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유진 박의 이 논의가 성공했는지와는 별개다.
양반은 특권적인 신분을 유지했고, 조선 초기 양반이었던 가문 이외에 양반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양반들은 문과 뿐 아니라 무과도 장악했다.(29) 고려시대 문무반 중앙관료는 자신들을 제외한 이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고, 늦어도 여말선초에 양반이 귀속적 지위집단을 형성하고, 양반은 실질적 지위나 벼슬자리에 상관없이 귀족 지배계층에 속하게 되었다.(30) 조선의 개국 초기 핵심 목표는 사병 철폐와 새로운 무과제도를 만들어 모병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것, 즉 군대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이었고, 결국 성공했다.(32) 태조는 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충분한 무술 실력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학식을 요구했다.(33) 지방과 중앙 군대를 감독하던 군대 지휘관은 왕과 고위관직의 문반들이었고, 무관들은 문반이 차지한 자리 이외에 대략 4,000여개의 자리에 배치되었다.(37) 오늘날 하사관과 일반 병사에 해당하는 하급군인들은 중앙관료집단이 아니었으며, 양반도 아니었다.(38) 무과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가 기본으로 합격자수는 문과 33명, 무과 28명, 잡과 48명, 사마시 200명이었으나, 별시가 많았다.(40) 무과는 문과에 비해 유교적 소양에 대한 기준이 낮았다.(41)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과를 쉬운 시험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42) 15세기 말이 되면, 무과 실시는 6개월에 한 번, 평균 합격자 수는 282명으로 늘었다.(43-44) 16세기의 이러한 상황변화는 붕당정치의 과열로 권력자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충성스러운 자를 뽑으려던 경향과 일종의 자격을 조금씩 나누어줌으로써 사람들을 달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44)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까지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는 근간부터 붕괴되었다.(45) 16세기 조선의 주된 근심은 백성의 빈곤이었는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노비로 전락하여 군대에 병사가 충원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5세기 조선의 건국과 중앙집권화 정책은 지방 향리와 같은 사회집단을 희생시켜서 국가와 양반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고, 16세기에는 양반들이 국가와 양인 납세자들의 희생을 통한 이득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6세기 조선은 임시변통으로 국경을 경비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무과를 시행했다.(47) 무과급제자들의 정치적 위상은 추락했다.(47) 15세기 말부터 무과급제자들이 벼슬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고, 16세기에도 임용전망은 불투명했다.(50) 조선왕조의 인구는 왕조 개창 당시 4~5백만에서 1500년대에 7~9백만 사이로 늘어났고 무과급제자 수도 늘었지만, 중앙정부의 관직 수는 조선시대 내내 고정되어 있어, 『경국대전』이 완성된 1469년과 같이 1,779개의 문관직과 3,826개의 무관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50) 관직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었고, 1543년에는 무과 시행 결과가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으며, 관리들은 정치적 인맥을 통해 관직을 얻었다.(50-51) 무과급제자들은 점차 장군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군사훈련만 익힌 병사로서 인식되었다.(52) 이들을 배치할 군대의 수도 감소했다.(53) 과거는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독점했고, 서얼과 향리의 응시는 법적으로 규제되었다. 고려말 중앙관리의 자손인 한량閑良도 응시조차 막혀 있었다. 평민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무과 출신은 거의 양반 가문일 뿐 아니라 나라가 특권을 보장하는 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자들이었다.(54-59) 16세기에 한량이 무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1512년에 만들어진 정로위定虜衛에 충원할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북방에서 정로위에 복무하면 수도의 금군禁軍으로 옮길 특권이 주어졌다. 조선은 한량이 군대를 보완할 잠재적 인력이라 보았다. 16세기 무과급제자는 양반이 아니더라도 관직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의 관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자격을 주었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한량이나 재력 있는 평민이나 하층 양반에게 그 매력이 작용했을 것이다.(59) 16세기 위협이 증가하면서 서얼에게도 무과응시 자격을 부여했지만, 의미있는 관직은 허용되지 않았다.(59-60) 대외적 절박함으로 조선을 규제를 완화해 한량, 서얼, 노비 등도 무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급제하는 자들은 대부분 양반이었다. 대부분 음서 출신이거나 전현직의 하위 무관들 왕실 친위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다수 무과급제자는 양반의 자손이었다. 전반적으로 부친이 아들들보다 양반 직역을 가진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위의 하강이동이 16세기의 사회적 현실임을 알려준다.(60-61) 16세기 동안 1,060명의 무과급제자 중 성관이 확인되는 216명을 보면, 최근 고위직에 올랐던 자의 후손, 이전 세기 무과에 급제해 고위직을 역임한 역사를 가진 가문의 후손, 8촌 이내에 문과급제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쪽 지방 출신들은 대부분 조상 대대로 같은 지역에서 세거한 자들이었다. 무과에서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재경사족이 무과를 장악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급제자가 많지 않았는데, 양반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61-62) 양반 신분은 본인 자신이나 친척이 문무과에 속한 내역, 입양, 혹은 인척관계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않았다. 양반에게 중요한 것은 양반이라는 사회적 지위 그 자체였다.(63)
조선 초기부터 양반들의 관직 독점과 귀족화는 에드워드 와그너의 후예들의 일관된 견해다. 사료도 이를 보충한다. 무엇보다 서얼, 향리, 한량을 금지한 조선의 양반들은 참으로 경이로웠다. 자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사람들만 쏙 뽑아서 이들에게 과거를 금지시키거나 제한시켰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인구증가였다. 거의 2배에 이르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직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국가적 실패는 크게 보아서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약한 국가-약한 왕권-강한 양반귀족, 이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경직된 제도. 처음부터 무과는 용도가 애매했는데. 지휘관을 선출하는 제도가 어느새 병력을 충원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나간다. 외부위협이 커져감에 따라 병력은 더욱 필요해졌다. 한량, 서얼에게도 제도의 문을 열지만, 병력을 충원하려는 것 뿐이다. 이미 이때부터 국가의 실패가 분명했다고 하겠다. 조선 시대부터 한국의 군대는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는 용도였던 모양이다. 군대의 주적은 양민이었던 셈이다. 지금은 얼마나 다른 건지. 사람들에게 적절히 특권을 부여하는 듯 문을 열고, 홍패를 나누어주지만, 관직 만은 철저하게 독점했다. 나름대로 효과적인 대응책이었던 셈이다. 무과의 결과로 특권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는 평가가 어렵고.
양반가나 양반 개인이 특정한 직분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조선 후기의 귀족들은 정치적으로나 기능상 하위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떤 가문은 무관으로 전문화되었고, 어떤 가문은 문관만 배출했으며, 영호남지방 귀족은 전혀 관리를 배출하지 않기도 했다. 중앙무관은 문관들에게 종속되었다. 무관귀족의 발흥과 비지배층nonelits에게 개방되면서 무과체제의 평가절하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69) 조선은 조일전쟁(임진왜란) 이전의 붕당 간 정쟁으로 부세제도와 군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혁할 수 없었다.(70) 양반들의 피역과 세금 면제라는 특전이 큰 문제였다.(72) 무과는 자주 시행되었고, 급제자들은 증가했다. 1402년부터 1592년까지 약 200년간 무과급제자는 7,758명이었지만, 1592년부터 1607년까지 대략 2만 명에서 4만 명이 무과에 합격했고, 1608년부터 1894년까지는 그 수가 12만 1,623명이나 되었다. 합격자수 100명 이상의 무과가 현저하게 증가했다.(73) 낮아진 기준들로 무과를 통해 출세하고 싶은 자들은 늘어났고, 이를 지원해 주는 이념적 뒷받침도 나타났다. 성혼은 백성들이 과거를 중시여긴다고 말했다. 무과는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실행되었다.(74) 정부는 무과를 더 자주 시행하여 군사를 보강해야 했고, 북쪽 국경 방어를 위한 병력을 비변사가 4만명으로 추산했을 때, 광해군은 누적된 무과급제자들을 급파하라고 명령했다.(75) 급기야 1620년 만명이 넘는 무과급제자가 양산되어 만과萬科라는 용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조일전쟁에서 처럼 조청전쟁에도 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소용이 없었다.(76) 한때 북벌의 희망을 안고 무과를 시행했고, 그 후에도 반정과 반란에 대비해야 했다. 19세기말로 갈수록 대규모의 무과는 효용성이 한계를 보였다.(78-79) 대규모 무과로는 비정기적 무과 별시 시행의 증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치러진 직부전시直赴殿試(강경 등을 면제하고 왕 앞에서 무예로만 시험을 봄)에 응시하는 장정의 급증, 상류층이 아닌 사회계층의 무과 참여를 들 수 있다.(79-80) 무과개혁논의가 생겨났고, 임명되지 못한 급제자들이 한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도 일으켰다. 무과의 위상은 추락했다.(85) 그러나 무과제도에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86) 조선 후기까지 대규모 무과를 조속시켰던 이유는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였고, 홍경래의 난은 반란은 진압해도 사회적 불만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왕가의 경사를 맞아 백성을 위무하는 사회적 역할도 했다.(88) 송준호의 견해에 따라 정해은과 유진 Y. 박은 무과급제자 중 일부가 서울에 기반을 둔 중앙 무관귀족들의 자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제자의 평균연령은 32.5세, 이는 10년 이상 공부하고 수련해야 하며, 재산을 가진 자에게 유리했음을 보여준다.(89) 급제자의 대부분은 서울에 적을 두고 있던,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의 양반가 출신이거나 중앙 관료사회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경력을 갖기 위해 응시한 자들이었다.(89) 한량이나 군직을 가진 자, 이미 관직이나 관품을 가진 자도 많았고, 정해은에 따르면 중앙의 정치구조에서 소외된 많은 양반들이 조선 초기에 비해 무과로 전향하는 경향이 강했다. 역을 지지 않는 양반이 증가하면서 피지배층은 수탈에 더욱 노출되었다.(91) 무과급제자의 성관분포를 보면 문과보다 더 광범한 친족집단이었다. 그러나 급제자 중 신분 높은 양반가 자제들을 기록한 『武譜』를 보면 중앙의 주요 무관 가문 중 몇몇이 조선 후기 무과급제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덕수이씨, 전의이씨, 능성구씨, 평산신씨, 평양조씨, 수원백씨가 그들인데, 1780~1894년까지 급제자의 3분의 1 정도였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섯 개 유력 가문의 급제자 배출이 뚜렷하게 두드러졌다. 중앙귀족을이 관료사회의 특정 분파와 관련된 가문을 만드는 데 300년이 걸리지 않았다.(94-95) 벌열 무반military aristocracy가 생겨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있다. 정치적 갈등에서 승리한 편에 선 자들, 유명 무장의 후손, 정치적 갈등에서 몰락한 후 무과로 집중 등이다. 대표적인 예가 밀양박씨 규정공파이다.(95-96) 벌열 무반, 즉 무인 귀족은 조선 후기 관직의 전문화 경향을 보여준다.(98) 이중 밀양박시 규정공파의 12명의 무과급제자들은 무관인 중인 가문 출신으로 기술관이나 무관 중인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문무관 양반가와 혼인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관직으로 전문화되어 있던 한양의 양반 가문들도 여러 세대에 걸쳐 폐쇄적인 통혼권을 유지해왔다.(101) 문관 세도가의 자손들은 무과 최고위 관직인 대장大將이나 영장營將 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무관도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고, 케네스 퀴노네스에 따르면 무과 합격자가 중앙의 주요관직에 있을 경우 한양과 그 주변에 기반을 둔 저명 무인 가문 출신이었다.(102) 군영 장군직에 비해 수령 자리를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19세기 전반에 한양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문이 지방관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무과급제자들은 낮은 직급의 관리에 만족하거나 급제한 사실에 만족해야 했던 자들, 역을 치르거나 각 군영의 경연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장교가 되고, 벼슬이나 높은 지위의 관리가 된 자들, 소위 별천別薦을 통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천거되어 시험을 통과한 뒤 높은 지위의 문관이나 군영 장군직을 받기 전 일련의 지방관이나 무관직을 받는 자들의 세 종류가 있었다.(104-105) 서울 출신의 벌열 무관들은 조선 후기 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105)
두번째 장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벌열무반 즉 무인 귀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가문들은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양반들 이순신 같은 무장의 후예들, 정치적 갈등에서 승자의 편에 선 자들로 나뉜다. 이들은 300년이 채 못되는 기간 동안 통혼권을 형성하고, 중앙 무관직을 세습하면서, 일종의 지배 엘리트의 하위 파트너로서 자신들도 지배 엘리트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 말하면 유진 Y. 박은 여기서 엘리트 분화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조일전쟁(임진왜란)과 조청전쟁(정묘, 병자호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신 중심으로 단일하게 결속되어 있던 양반 엘리트 층에 일종의 분화가 생겨나게 된다. 일련의 기간을 거쳐 무인 귀족 층 즉 벌열 무반이 형성되게 된다. 이들은 중앙 양반 엘리트들과 권력을 다투지 않는 대신,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면서, 지배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이들에게 도전하는 세력에게 대항한다. 이들 중 일부는 예를 들어 밀양박씨 규정공파는 본래 문무반 양반이 아니었다. 즉 신분status 상 양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지만, 중앙 무신의 후원과 자신들의 역량으로 벌열무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통혼권을 보면 아직도 기술관과 무관 중인들과 통혼하고 있어, 양반으로 신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신흥 엘리트 귀족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터 슬슬 유진 박이 신분 대신 계층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가면서 엘리트론을 전개하는 지 그 이유를 드러낸다.
향촌 지배층 즉 지방 엘리트 역시 문과를 통해 중앙의 출셋길은 차단되어 있기에 출세를 위해 무과에 집중했다. 유진 박은 이 글에서 엘리트elites에 대해 의도적으로 양반이나 귀족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성과 서북지역 엘리트를 영호남 지역 귀족과 같이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12-113)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의 수는 지역에 따라 변동을 거듭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합격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19세기 들어 반등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서북지역은 17~18세기 무과합격자 수가 증가하다가 19세기 들어 급감했다. 한양과 경기도 지역은 무과합격자의 절반 정도를 배출했으나 19세기 후반들어 급감하기 시작했다.(114) 유진 박은 이 논의를 위해 조선의 지방 엘리트를 셋 으로 분류한다. (1) 경상도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남쪽 절반으로 농촌 지역의 향촌 양반, (2) 개성과 그 인근지역의 도시 출신으로 상업적으로 연관된 지배층elites, (3) 평안도와 함경도를 기반으로 한 북부지방 지배층elites.(114) 여기서 (1)은 지방과 향촌에 있어도 양반귀족이지만, (2)와 (3)은 신흥 엘리트 들이다. 물론 신흥이라고 해도 200~300년에 걸쳐 형성된 엘리트들이라서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유진 박이 엘리트라는 구분을 끌어가는 것은 이들 때문이다. 영호남 지방의 양반층은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고 새로 유입된 계층으로 인해 지방의 정치적 패권의 도전을 받았다. 조선시대 중반 이후 과거급제를 하거나 관직에 올라 양반이 될 수 있었던 영호남 지방 출신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지배층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첫번째 계기는 1623년 조선 남부지방에 기반을 둔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이었다. 이로써 북인정권이 전복되었고, 개성과 영호남에 기반을 둔 북인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 핵심 계기는 1694년 서인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갑술환국으로 경상도에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던 남인에게 승리하였다. 1623년 서인 정권 이후 경상도 출신 고위관리는 감소하고 경성세가 출신은 관직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114-117) 서울에 기반을 둔 양반의 우세는 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국왕 앞에서 직접 치르는 전시의 이전 단계를 건너뛰는(직부전시) 이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시에서는 무예만 확인했다. 정부는 무예시험을 통과한 뛰어난 실력자들을 군문에 배치하여 근왕세력을 강화하려 했고, 인조가 청에 대한 복수설치復讐雪恥를 내세우면서 무과에서 특권적 면제를 용인하는 일이 증가했다. 후에 열린 상당수의 무과에서 90% 이상의 급제자들이 면제특례를 받았다. 특례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수의 지방거주자들이 특례를 받자, 18세기 후반에 지방 거주자인 후보들에게 주는 특례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17세기부터 문과에서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 향촌 양반 가문의 후손들은 무과로 돌아서고 있었다.(117-119) 일부 중앙관직 사회로 나가기 위해 무과를 택했던 지방 양반들은 조선 초기 이후 문과급제자나 문관을 배출하지 못한 가문에서 두드러졌다. 이들은 문중 내 무과 경시와 먼저 싸워야 했다.(122) 영호남 귀족은 무예와 무과를 경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과 응시에서 중앙이나 서북 출신 보다 불리했다. 군문이 중앙과 북쪽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면제도 그쪽에 집중되었다.(123-124) 그러나 영호남 지방 양반들이 무과에 응시할 때 가장 큰 장애는 향촌사회에서의 정치적 헤게모니 변화였다. 17세기에 기존 양반들의 지역 내 주도권이 새로 등장한 피지배총nonelites의 우세한 부와 영향력이 위협받고 있었고, 서얼과 양인이 향안에 입록되기 시작하자 구귀족들은 지역에서 향임과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존 양반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부를 유지하기 우해 구 양반 귀족사회를 사회문화적으로 더 보수화시켰다. 우월한 가문의식에서 파생된 조직과 활동은 족보를 만들거나, 집성촌에 모여 살거나 서원이나 사우 등 교육기관, 사회기관, 제례와 관련된 것을 설립하면서 문화체계를 세우려고 했다.(124-125) 경상도의 가장 보수적 지역에서도 새로운 가문들은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귀족계층과 사회적 연분을 쌓으려 했다. 예를 듦녀 혼인이나 공동의 공적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옛 귀족계층과 신흥세력들을 무과에 응시하게 했다.(125) 전체적 무과급제자나 관직자 수를 보면 영호남 지방의 양반과 중앙 관직 사회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영호남 지방의 양반과 이들의 후손으로 서울에 기반을 둔 문과, 무관가문은 강하게 결속된 사회 최상위 지배층elites라는 인식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 이들은 서얼을 제외하고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양자를 교환했다.(126) 19세기 영호남 지방에서 양반이 아닌 주변부 귀족층(marginalized elites?)이나 평민이 무과에 응시하여 성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무과급제자가 급증했다.(126) 신흥계층이 다양한 종류의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했지만, 여전히 양반의 신분을 결정짓는 것은 과거급제와 상관없는 출신 성분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의 높은 유교적 소양을 보여주기 위해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려 애썼다.(126) 관직과 무관한 사마시 합격노력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자본은 체화된embodied 상태, 객관적objectified 상태, 제도화된institutional 상태로 실현될 수 있다. 어린시절부터 글을 읽고, 도덕적 가치가 내면화된 학생들은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객관적 상태의 문화적 자본을 보여준다. 이 둘이 모두 체득되고 나면, 실제로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제도화된 상태에 들어간다. 시험에 통과한 자는 성리학자로 성리학이 정의한 이상적 귀족층에 완벽하게 걸맞는다.(127) 조선 후기 영호남 지방의 양반들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에 나가는 수는 점차 감소하였는데, 출생에 의한 신분은 대다수 양반들이 생원·진사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었다. 생원·진사시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양반 이외에 문화자본이 있는 피지배층nonelites에도 다수 존재했다. 소양을 갖춘 귀족들이 시험에 응시했기에 시험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권위는 가치가 떨어진 관직에 이름을 올리는 일과 구분되었다. 다수의 신흥세력들이 관직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부터 양반들은 관직에 이름 올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러자 문화자본이 있는 비귀족층은 생원·진사시에 끌렸다.(127-128)
첫번째 지역 엘리트 즉, 향촌 양반층 내지 향촌 지배층은 영호남의 양반들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문과로 중앙에서 밀려난 후에는 무과로 관심을 돌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지배력 사실은 귀족 신분에 대한 문화체계를 통한 입증을 꾀했다. 그러다가 사마시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그 이유를 유진 박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유진 박의 논의를 조심스레 따라가 보면, 무인 귀족, 즉 벌열 무반에 대한 논의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양반은 확대되지 않는다. 양반은 여전히 양반이며, 양반은 양반들끼리 혼인하고 양자를 주고 받는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 나온다. 양반이 양반임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원래 없다. 그들은 양반이기 때문이다. 무과가 흔해져서 지역의 신흥 elites인 원래는 피지배층nonelites들과 무과를 가지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중앙 무관직에 나갈 수도 없는 종이쪼가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버려 버린다. 그리고는 생원·진사시를 친다. 그러자 문화자본을 가진 피지배 즉 nonelites 출신의 신흥 엘리트elites들이 생원·진사시로 따라온다. 생원·진사시가 무과보다 더 있어보인다는 거겠지. 그러자 문화자본이 있는 양반은 생원·진사시도 치지 않게 된다. 그 이후 어떤 경로를 밟아 갔는지는 더 설명할 길은 없다. 식민지가 되고, 그 체제가 자체로 몰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유진 박은 엘리트는 일종의 순환, 다시 말해 엘리트가 부와 이를 발판으로 한 권력과 문화를 쌓아서 상승을 꾀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신분상승 즉 양반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양반이 되는 건 재산에도 호적에도 달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분제는 해체되지 않고, 양반은 양반이되 엘리트는 교체되고 순환된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문화자본을 찾아간다. 신흥 엘리트는 명예가 필요하다. 그러나 계속했을 때 됐을지 안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결국은 되지 않았을까? 안되면 무너졌거나. 모르겠다. 상상하는 것도 의미없는 일이고.
개성의 사회구조는 영호남이나 북부지방과 달리 꽤나 독특했다. 영호남 지배층elites와 달리 북부지방 귀족들과 손잡고 중앙의 고의적이고 제도화된 차별과 맞서야 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기에 정부는 1470년까지 개성주민의 과거 응시조차 금했고, 이 법이 풀린 후에도 중요한 관직을 맡지 못해,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에 나섰다. 개성의 지배층은 포기하지 않고 과거에 응시하여 조선후기에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128-129) 개성상인들은 조선 전체에 걸쳐 맺은 독점권을 기반으로 인삼, 구리, 은, 목면, 무명 등의 무역에 나서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1882년 이후, 그리고 20세기에 개성상인들은 변화된 조선의 근대적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다.(130) 문과급제자의 절대치로 보면 조선에서 가장 많은 급제자를 낸 10개 지역 중의 하나였으나, 중앙 요직을 탄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문과보다 생원·진사시에서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마크 피터슨에 따르면 출신지역이 밝혀진 합격자 중 1.5%가 개성 출신이었고, 다양한 가문에서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이는 개성의 경제적 자원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피터슨은 시사한다. 제임스 팔레는 조선의 상인과 장인은 과거에 응할 수도 관직에 나갈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금지조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17세기 즈음 개성의 지배층elites 상인가문들이 문과나 생원·진사시에 합격자를 내었다.(130-131) 덜 박식하나 신체 능력이 있는 자는 무과로 나아갔을 것인데, 출신지를 알 수 있는 3만 636명의 무과급제자 중 2,174명(7.1%)가 개성출신이었다. 개성 출신 무과급제자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나왔다. 한조선이 개성 출신의 무과응시자를 허락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한양과 가까워 별시가 자주 설행되었다. 상당수의 개성 출신 급제자들이 형제, 사촌들뿐 아니라 여러 대에 걸쳐 무과급제자를 내었다. 셋째, 많은 개성 출신 급제자들이 개성을 본관으로 쓰는 성씨를 포함해서 조선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성씨를 사용했다. 넷째, 개성 출신 무과급제자의 이후 이력은 남도 출신 양반보다 인상적이지 못하다. 남부지방 귀족층과 달리 개성 지배층의 정치 참여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남부지방 출신의 응시자에 비해 합격자 규모에 변화가 거의 없어, 도시의 경제적 영향, 문화자본,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이 지배층elites로 하여금 개성이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직을 맡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도록 만들었다.
개성 출신자의 급제 이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보는 것 같다. 개성은 일반적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탓에 생겨난 차별에 관한 이야기나 상인들에 대한 분석 뿐이었다. 유진 박이 지방 엘리트들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면서 개성을 꼽은 데는 꽤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 문과, 무과, 사마시 모든 측면에서 지배 엘리트에 가까이 가기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조선을 지배하는 양반에 속하지 못했다. 무과급제자의 수도 아주 두드러진다. 그리고 성씨가 다양한 것도 그렇다. 사마시 합격자의 수도 눈길을 끈다. 조선왕조가 개성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개성이야말로 대항하는 엘리트들의 산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이런 대항 엘리트의 성장이나 성공 가능성을 막는데 아주 탁월했다. 개성이 이런 차별 속에서도 가벼이 볼 수 없는 성공을 거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영향과 문화적 자본 그리고 거기에 위치가 더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들도 문무양반층의 지배 엘리트 안으로 진입할 수는 없었다. 조선왕조와 조선의 양반 귀족은 이 점에서는 아주 철저하고 분명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개성은 실제 규모와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한양과 근기의 양반귀족 지배 엘리트에 포함시킬 수 없는 개성 엘리트를 따로 보는 것은 이 책의 뛰어난 점 중 하나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배층은 양반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차별받았다. 북방에는 상대적으로 성리학이 늦게 전해졌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관서지방의 유려층들은 높은 수준의 문화적 소양과 뛰어난 무예를 갖추었고, 18세기의 군주들은 왕권을 강화할 생각으로 북부의 뛰어난 유력층(elites?)을 끌어들이려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한양의 핵심 정치권력 구조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합격율만 높이게 되었고, 출중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엘리트라는 신분에 만족해야 했다.(134) 관서 거주 주민도 무과에서 이점을 누렸따. 이 지역에 주둔하던 관료나 군인들은 무과 초시를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다. 중앙정부와 양반관료는 서북지방의 유력층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열등하고 관료로 등용하기에 부족하다며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수창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1811년의 홍경래의 난은 능력을 갖춘 이들이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현실 질서에 반하는 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135-136) 동쪽의 함경도는 중앙정부와 귀족들이 더욱 낙후된 곳으로 생각하여다. 강석화의 연구는 중앙에서는 해당 지역에 상무尙武의 문위기를 강조하고 싶어했으나 문풍文風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136) 오수창과 강석화의 연구는 민족주의적 인식과 서북부민의 특정 계급의식을 조금 과장한 단점도 있으나 1차 사료에서 확인한 확실하고 풍부한 논거에 기반하고 있다. 영호남 지방과 마찬가지로 북부지방의 저명한 가문들은 사회적 지위를 공고하게 유지하려고 하였다. 북부지방민의 족보에는 15세기말과 16세기초 중앙관료나 학자인 그들의 조상이 유배되었다고 말하짐나, 영호남지방에 거주하는 같은 가문의 족보에는 빠져있다. 아마도 북부지방의 가문에는 성리학이나 족보 편찬 등도 늦게 전해져 제한된 양의 기록으로 족보를 작성하면서 연결고리를 상상하고, 때론 위조했을 것이다.(137-138) 가계의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관서지방의 지배층elites들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극명해진 신분의식을 갖게 되었고, 향촌 엘리트들은 스스로를 양반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이라 믿게 되었다. 한반도의 서북지역에 거주했던 백성들의 과거합격률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높아졌다.(139) 1620년 의주 출신 한 명이 무과에 급제한 최초의 북쪽지방 출신이었다. 이 지역에서 17세기 초까지 한 명의 급제자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 지역에서 정부관료로 입문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와그너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문과급제자가 급증하는 데, 특히 정주에서 급제자가 많았다.(139) 조선 후기 정부가 문과를 주최한 것은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과에 합격시키면서도 정치권력은 나누어주지 않았다.(140) 영조와 정조는 한양의 지배층에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평안도 출신의 무예가 뛰어난 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등용했으며, 왕실근위병으로 배속하기도 했다.(140)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 많은 상인들이(경제적 배경에 힘입어 무예를 겸비한 부유한 가문 출신의 평안도 장정들) 무관 직책을 얻었다. 함경도도 무과에서 특혜를 받는 지역이었다. 숙종부터 영조까지 조선 정부는 수많은 무과 향시를 도입했고, 중앙 무관가문의 출현과 동시에 지방 무인들로 왕을 호위하게 했다. 당시 국가에서 지역 무과에 한해서 서북부 출신을 편애했음을 알 수 있다.(141)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제 관직을 얻지는 못했다. 1880년대까지도 수가 변함없었던 중앙 관료사회의 무관직에 비해 이를 얻으려던 지원자가 너무 많았고, 중앙의 소수 양반가문이 장악한 관료사회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서북민들은 무과급제자가 성공적인 관력을 시작하는 핵심인 선전관 후보로 등록되지 못했다. 숙종 재위기간 중 서북부 출신 무과급제자 몇몇이 핵심관직에 나가기는 했으나 누구도 수령직을 받지 못했다. 평안도 출신은 초관硝官, 방어사, 변장邊將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142-143) 북부지방 지배층이 무과급제에서 받은 혜택은 19세기에 이어지지 못했는데, 함경도 무과급제 비율이 떨어진 것이 정체기였다면, 평안도의 급제율이 하락한 것은 1811년 홍경래의 난 때문이었다. 지역 내 지배층elites로 남기 위해, 북부지방 전체, 특히 서북 지배층은 무예를 연마하기 보다 교육과 학문의 길을 모색하려 했다.(140) 조선 후기 지방 엘리트는 무과로 목표를 전환했지만, 영호남 양반은 문화적 활동을 주목했고, 소외된 개성 출신들에게는 무과가 중요했으며, 서북지방은 무과에 응시해도 중요한 관직을 얻을 수 없었다.(144-145) 조선 군사체계의 주안점은 군사의 징집과 훈련보다 과세제도 쪽으로 넘어갔다. 정규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고, 무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145-146)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배층은 양반인가? 결국 그들은 양반이 아니었다. 스스로 양반이라고 자처했으나 그들을 차별하는 구조는 그들을 양반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점이 영호남의 양반들과 달랐던 것이다. 영호남의 양반들은 중앙 양반 귀족이 인정하는 양반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자본에 몰두하게 된다. 극도로 소외되었던 개성 출신들에게 여전히 무과가 중요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엘리트들은 양반을 자처했으나 양반이 아니었고, 무과에 합격했으되 관직을 얻지 못해 좌절하고, 반란까지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된다. 그들은 다시금 문과라는 전통적인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데 골몰하게 된다. 양반-중인-평민-천민의 신분제 구조로는 이들 지역 엘리트들의 다양성과 그 활동의 정도를 섬세하게 구분짓고 위치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점에서 엘리트론과 문화자본론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영호남의 신흥 엘리트도 개성의 상인 출신 엘리트들도 넓게 보아 중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인 신분이라고 하기에 애매한데다가, 중인-잡과 급제자들의 집단과 비교할 때, 이들이 중인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중인이란 양반도 평민도 아닌 세력의 잔여범주이기 때문이다. 서북지방의 엘리트를 중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양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디에도 넣기 어렵다. 서북의 자칭 양반들은 한양과 근기는 물론이고, 영호남의 양반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양반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인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구조다. 성리학이 전파되고, 서원을 세우는 등 양반으로서의 활동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런 특이성을 드러내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 양반은 어떻게 할때 유용한 분석적 개념이 될 수 있을까? 여러가지로 의문이 생긴다. 오수창과 선주 김의 연구를 좀 살펴보아야 겠다.
조선 후기 신분의 경계가 확연해 지면서 양반은 중앙의 문관과 무관, 향반의 친족집단으로 뚜렷이 분화되었고, 그 안에서도 자신들을 구별짓기 시작했다. 중앙 문관가문을 중심으로 중앙 무관이 이를 뒷받침했고, 영호남 지방의 양반들은 중앙 정치무대에서 소외되고 있었다.(150) 다른 지역의 양반(?)들은 중앙 무대에 등장한 적도 없다. 조선 후기 양반 귀족사회가 세 계층으로 구분된 이유는 양반이 관직에 종사하는 중앙관료가 아니라 세습되는 신분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사회사연구자들은 이렇게 본다. 양반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향반 출신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출생은 지위를 획득하는 방법이었다. 중앙과 영호남 지방 양반 사이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두 집단 간의 정치적 위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지방의 양반들은 한양의 양반에게 많은 선물을 했다.(150-151) 중앙 문관, 중앙 무관, 남부 지방 양반의 차이, 정치적 힘의 불균형은 별개의 신분집단이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중앙의 양반 조차 결집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151)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토지와 노비에 대한 경제적 특권을 지키는 동시에 군역을 면제받으려 했다. 붕당이나 학맥은 서울과 지방 양반 모두의 공통이익을 초월할 정도였다.(152) 중앙 무관 귀족층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만 혼인관계를 맺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152) 중앙 무관귀족층과 중인가문층의 사회적 신분의 균질 정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같은 신분층 내 혼인율은 중앙의 무관가문 사이에서 대략 60% 정도, 중인들은 90%가 넘었다.(154) 중앙의 문무관 가문 사이의 혼인은 17세기까지는 계속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드물어졌다.(154-155) 조선 후기 문무과 급제자들은 극소수 가문들이 통혼권을 유지하면서 중앙 관직을 장악하고 있었다.(156) 조선 후기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경우 양자 입양이 성행했고, 이는 중앙 문관과 중앙 무관, 남부 지방의 양반 가문 사이에 계속되었다.(156) 양자에는 서얼은 배제했으며, 양자를 보내는 가문과 양자를 들이는 가문이 사회적으로 같은 지위여야 했으며 상호간 승인이 필수였다.(156-157) 족보상 시조가 같고 서울 출신이 없는 가문들은 양자 입양과 관계없이 서로를 같은 혈족으로 인식하였다. 서얼의 경우 혈통상 문제가 있어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 문관, 중앙 무관, 영호남 지방의 양반가문들 내에서 서로 양자가 오고간 것은 세 집단이 서로를 동등한 양반 신분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158) 조선은 18세기 말경에는 부계 중심으로 확장된 가족 형태를 지닌 문중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 족보상으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세 집단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159) 조선 후기 양반 가계에 문무관 가문이 있었다. 중앙의 문무관과 남부지방의 양반가문은 서로를 가까운 친척이자 같은 본관씨족으로 받아들였다. 가문의 시조와 가까운 후손 대에서 중앙 문관가문과 무관가문이 함께 나오기도 했다. 혼인을 통한 결합, 양자의 입양, 족보 편찬 등은 양반 가문이 내부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가문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159-161) 새로 등장한 귀족들이 표면상으로는 지배층elites와 동등했을지 몰라도 지배층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양반은 신분간 경계가 중요했기에 신분에 따라 직위와 관직의 가격이 달랐다. 매관매직은 세입의 수단이었다. 관직을 사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다. 1583년부터 서얼과 천민도 기부금을 내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납미허통제는 1696년 폐지된다. 17세기에 부를 얻은 새로운 계층이 국가적 차원의 매관매직을 통해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부민富民과 소외된 양반들이 이를 가장 원했다. 기근을 구휼하기 위해 흔히 발행되던 공명첩은 신분과 나이에 따라 값이 달랐다.(162-163) 추증이나 가설加設직은 값이 비쌌고, 군역을 지고 있던 평민과 상민 출신은 가설직을 살 수 없고, 사은숙배謝恩肅拜도 일정직 이상의 양반에게만 허락되었다. 관직의 가격은 연 천석을 수확한 이의 한 달 수입과 맞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중앙정계에 몸담지 않았던 후손이 족보에 중앙관직으로 기록된 경우, 소작농이거나 가난한 양반은 아니었다.(163-165) 양반이 아닌 자들이 관직을 사는 것을 막지 못했던 일도 많았다.(165) 양반에게 공명첩의 가치는 점점 낮아졌고, 정부가 매매했던 직위와 관직은 실제 등용되지 않던 허직虛職이 많았다. 양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진짜 양반들은 관직 구매의 이익이 크지 않았으나, 곡식을 기부한 비양반층은 관직이나 직위 그 자체에 체화된 보상에 끌렸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아무리 관직을 산다고 해도 진정한 양반이 되기는 어려웠다. 관직이 매매된다는 사실은 양반이 명망을 유지한다는 증거다.(166-167) 성과를 거두면서도 좌절을 겪고 있던 기술직이나 지방 향리와 달리 양반 출신 무과급제자들은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신분계급 때문에 귀족신분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167) 중앙정부의 기술직을 독점하던 기술직 중인가문들도 고유한 신분의식을 지니기 시작해 입격자 명단 작성, 문집 간행, 족보 편찬 등의 사회문화적 활동을 시작했다.(168) 지방에서 직위를 세습하던 지방 향리들도 고유의 신분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양반과 기원이 같음을 지적하며 적절한 예우를 받고자 했다.(168) 그러나 귀족층은 이들을 하대했다. 양반관료들은 기술직 중인들이 더 중요한 관직을 맡는 것을 저지했고, 매우 엄격한 평가의 잣대를 제시했으며, 미미한 추문이나 경미한 죄에도 쉽게 처벌을 받았다. 교육수준과, 교양이 높고, 부를 축적했던 이들 중인들은 좌절했다.(169) 19세기 말이 되면 한양의 중인들은 족보의 간행이나 증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가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거나 양반 가문의 족보에 편입되려 노력했다.(170) 무인계급의 『무보』에도 평민, 서얼, 기술직 중인, 지방 향리르 모두 배제했다. 19세기 5만 명이 넘는 무과급제자 중 겨우 3,700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유장儒將으로서 이상을 존중하여 스스로 양반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교양있는 학자이자, 전략가여야 했다. 의미심장하게도 무관의 초상화에서 갑옷이 아닌 무관복을 입고 있다.(170-171) 유장 신헌은 조선이 개방할 때, 두 개의 근대 조약(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조규)을 체결하기도 한다.(176) 무관들은 외세와 싸우고 반란을 진압하는 본분에도 충실했다.(177)
중앙 문관가문과 중앙 무관가문 그리고 영호남 지방 양반을 모두 양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양반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양반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통혼, 입양, 그리고 매관매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분적 제한이었다. 이들 사이에 정치적 위상 등 여러가지가 서로 달랐다고 할지라도 같은 신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동질성과 응집력은 있었다. 양반 가문은 조선 왕조 수립 이전에 문무양반직을 가진 세습적인 지위라는 사실에 과거를 치르고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인 동시에, 출생으로 획득하는 지위이다. 이것은 확실한 세습적 신분이다. 그리고 이런 세습적인 신분은 서로 간의 갈등과 지위에 대한 구별과 권력 및 관직에 대한 독점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양반으로 인정하고 사회적·문화적 교류를 실행함으로써 양반의 지위를 다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평안도와 함경도 즉 서북 지방의 양반을 과연 양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의문에 빠지게 된다. 이들을 네 개의 주요 신분 중 한 곳에 위치시켜서 그 함의를 평가하기 어렵다면, 지역 엘리트라는 구분은 유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요 양반 그룹은 인정하지 않는 서북 지방의 신흥 양반이자 향반이라는 자기 모순적인 명칭과 정의를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족士族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들이 marginalized elites인 건가? 아니면?
그렇지만 이 논의에서 가장 내 눈에 띈 것은 기술직 중인들에게 매우 평가가 엄격했다는 구절이었다.(169) 이글을 쓰는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검에 당당하게 출두했지만, 노회찬 의원은 특검 출두 대신 자결하고 말았다. 흔히들 진보 세력 또는 운동권이 신경이 약하다는 등, 도덕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는 등 쉽게 말하지만, 그 본질은 지나치게 엄격한 평가에 있는 것이다. 다음 장의 피지배층nonelites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평가 기준을 들이대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의 야당이 그리고 재야의 진보 세력들에게 엄격하고 또 엄격한 도덕주의가 부과되고 참빗으로 골라낼 만큼 세밀하게 따져댄 것은 그들이 도덕주의를 내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대항 엘리트이고, 아예 엘리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회찬이 그나마 정치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기고라는 한국 엘리트의 산실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대를 나왔다는 사실이고. 그런 그도 그가 대표하는 노동자 세력 즉 과거의 평민이나 천민들이 자신의 지위를 떠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하려할 때, 천민 출신 무과 급제자에게 들이대는 엄격하디 엄격한 잣대와 검열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었다. 작은 잘못에도 엄벌을 받는다.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손가락질은 신분이 낮은 동료들에게서 온다. 그리고 그 손가락질은 그들을 무너뜨린다. 그가 가장 두렵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으리라. 그것이 이땅에서 천출賤出의 운명이다. 천출들은 자기자신을 대표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지배엘리트의 하수인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때,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다. 개천에서 솟아난 용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다간.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 법관이 되어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배세력의 일원이 되어 지배세력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성찰한다고 해도 그 실천적 아비투스를 변화시키는 것은 실제로 아주 어려운 일이다.
조선 후기에 무과는 양반이 아닌 계층에게도 개방되었다. 이는 계획적 정책이라기 보다 군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행해진 부득이한 결과였다. 17세기 후반의 이른바 ‘만과萬科’ 출신은 양반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무과 시행을 통해 무관을 충원하려는 본래의 기능도, 피지배층의 불만을 완충시키는 사회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비양반층non-yangban은 피지배층nonelites를 의미하는 것인데. 양반들은 이들이 자신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중인(역관, 의관, 화공, 악공, 군졸, 서얼 등), 양인(소농, 상인이나 서얼의 자손), 천민(노비, 광대, 무당 등 어느 정도 세습적), 이들이 피지배층이다.(182-183) nonelites에게 무과의 기능은 양반과 다르다. 얻을 수 있는 직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망이 어둡다고 인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급제하거나 중앙에 관직과 관품을 얻는 것은 양반의 외형을 모방하려는 사람에게 유용한 수단이었고, 군적에서 빠져 군역과 군포를 면제받는 실질적 혜택도 있었다. 그러나 nonelites가 무과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한 움직임은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183)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근거를 통해 국가가 하층민의 신분상승 염원을 반복해서 저지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84) 국가가 하층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 것은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였다. 선조는 1593년(임진왜란 중) 지방무과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공·사노비까지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184) 심승구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무과급제자들은 향리, 서얼, 노비까지 비양반계층이 포함되었지만, 대부분 양반이었다. 양란 이후 하층민 신분상승 가능성은 과장된 느낌이다.(185) 17세기 초반 광해군 대에 눈여겨 볼 만한 하층민의 정치참여가 나타난다. 천민도 응시하도록 했던 ‘만과’ 시절이다.(184) 그러나 1620년 정부는 대규모 무과 합격자 중 공사천이나 서얼 출신은 합격을 취소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무과 부정에 연루된 자를 색출하기도 한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도 천민의 불법적 과거 응시를 바로잡으려는 조치가 있었다.(186) 또 양반들은 무과에 급제한 비양반층들을 양반신분의 무과급제자 및 관직자와 구별하려고도 했다.(186) 숙종 때 결국 하층민 출신의 급제자들은 양인으로 대우해주게 되었다. 결국 무과에 급제한 이가 형조가 아닌 의금부에서 심문받는 특권을 박탈했다. 이 특권은 박탈과 회복을 반복하는데, 결국 살인이나, 강상윤리 등 심각한 범죄의 경우 형조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 형조에서는 고문을 한다.(187-188) 정해은은 17~18세기에 무과에서 비양반층이 다수 급제하다가 그후 비양반층이 방목에서 사라지는 것은 진짜 양반에게만 주어지던 지위를 비양반층이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189) 유진 박의 조사에 의하면 1608년부터 1864년까지 무과급제자 중 비양반층은 3.3~16.4%였으며, 일정 정도의 비양반층이 무과에 지속적으로 응시했고, 급제자도 존재했다. 양반 직역을 비양반층도 사용했기에 직역만으로는 알 수 없다. 무과급제자중 관직, 관품이 없고, 다른 직역이 없는 한량의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유진 박은 본래 양반이 아니었던 자들이 한량을 법적으로 혹은 거짓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본다. 조헌 후기 한량이라는 직역은 다양한 사회요소를 포괄한다. 무과를 준비하는 유학, 무과에 응시하는 관직이나 관품을 가진 평민이나 중인, 거짓으로 한량을 모칭하는 자.(190-191) 군직군들 군영에 소속된 무관과 군졸, 전시에 전공을 세운 자 등이 무과에 쉽게 합격했다. 1673년 산성정시의 합격자는 대부분 미천한 신분 출신이다.(조청전쟁(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던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무과) 이때 김해김씨와 밀양박씨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 성관은 조선 후기까지 정체성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채택한 우산형 성관이다. 예를 들어 1673년과 1784년 정시 합격자 중 밀양박씨는 139명인데. 현존하는 족보에서 단 한 명도 확인할 수 없다.(192-193) 3.3~16.4%는 명백히 양반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고 양반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 급제자는 이보다 더 많았다. 산성정시 급제자의 85%가 면천 노비인 것은 극단적 예이다. 18세기 무과에서는 왕을 시위한 전력이 있는 자만 급제시키기도 했다.(192-194) 무과에 급제한 nonelites(정리하다 보면, nonelites를 피지배층으로 쓸 때, 자꾸만 거부감이 생긴다. 그것은 잡과중인 때문이다. 중인을 피지배층으로 뭉뚱그려도 좋은 걸까? 물론 양반 귀족이 아니라 지배층도 아니지만)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것은 향촌사 연구에서 드러난다. 부를 축적한 이들이 향촌 행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얻고 있으나 지위상승에 대한 자유로운 기회는 누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무학, 업무 등의 직역은 가치가 하락한다.(195) 새로 나타난 세력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면역 혜택을 받는 직역을 요구했다. 김준형의 연구에서 보이는 단성 지방의 사례는 구 귀족은 이런 세력을 받아들이기 거부했지만, 간혹 사회문화적 교류도 일어나고, 향임을 맡거나 서원에서 직임을 맡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향리에도 영향을 미쳤다.(195-196) 수령의 인사권에 종속된 세습적 향리가문들은 신흥 세력과 자신들을 사회·문화적으로 구별하는 방식을 찾았고, 새로운 사회요소들social elements는 향촌에서의 정치 권력 뿐 아니라 문화자본도 획득해가고 있었다. 19세기 원주에서 새로운 가문들이 생원·진사시에서 입격자를 배출한 것이다. 시험에 합격할 만큼의 문화적 자본을 가진 신흥세력은 무엇보다 양반에서 ‘떨어져 나온’ 후손들이었다. 조선 후기 족보는 몇 세대 이후에는 서얼에 대한 가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규모가 큰 본관씨족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신분을 상승시킨 비양반층 가문은 명문가 후손이라는 간판이 필요했다.(197-198) 조선 후기 무과급제자의 대다수는 양반 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지배층(marginalized elites?)들로 구성되어 있다. 무과에 급제하는 것은 문화자본을 필요로 했다. 문화적 배경이 부족한 피지배층이 높은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웠다.(199) 산성정시의 면천자들을 보면 무과급제보다 면천된 사실이 사회적 지위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양인신분을 요구했던 하층민들은 무과급제 내역을 강조했다. 물론 관직을 얻거나 정치적 권력을 보장받지는 못했다. 형제가 천역에 종사한다고 면직시킨 사례도 있다.(200-202) 양반들은 새로운 세력을 생활방식을 구실로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202) 부르디외의 상징적 의사표현symbolic manifestation이라는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 elites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의 차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부르디외는 교육받은 정도와 신분에 따라 습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데,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이 상징적 의사표현이며, 이것의 의미와 가치는 능력을 갖춘 당사자와 능력을 소비하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즉 국가가 요구하는 문화적 능력을 보여준다면 신분에 관계없이 급제한다. 무과가 귀족이 평가하는 문화적 능력cultural competence과 귀족국가aristocracy state가 평가하는 전문적인 능력professional competence를 상징한다해도 문화적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분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는 피지배층이 사회계층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분에 대한 성취를 인정해 주고 있다.(203)
nonelites들은 관직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무과를 활용했다. 천민, 평민, 상인 등 모두 마찬가지다. 관직을 실제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면역이라는 혜택도 있었고, 자신들이 가진 경제력으로 지방의 향촌사회에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향촌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다. 반면 중앙 정부의 양반은 끊임없은 구분과 분리를 시도했다.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기도 했다. 그런 판단의 기준은 주로 문화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다시 부르디외가 등장한다. 결국 세습에 의해 받은 습득한 문화적 능력이 결정적 위치를 차지했다. 부르디외의 상징적 의사표현이란 말이 가지는 의미는 무과에 급제해도 원래 양반이어야 그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nonelites들이 이런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효력 즉 관직을 얻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양반의 외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맨 마지막 문장이다. 피지배층이 사회계층이 도전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분에 대한 성취를 인정해 주고 있다. nonelites들이 신분 상승 즉 면천이나 양인 지위를 인정받는 일, 이름뿐인 무과급제로 면역되는 일 등을 신분에 대한 성취로 본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그런 성취가 사회계층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런다고 그들이 중앙문관 귀족이나 중앙무관 귀족 또는 영호남 양반 층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 문장만 보면 신분은 사회계층 보다 더 경계가 약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사회계층은 신분을 세분화한 것으로 그 신분 안에 다양한 층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앞에서 본 elites 집단들이기도 했다. 뭔가 개념이 뒤섞여 있다. 앞에서는 계층을 신분이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신분과 사회계층 그리고 엘리트는 각각 자신의 지평과 차원을 가지고 있는 범주들이다. 그리고 그 범주들은 교차하기도하고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차이의 평면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면 저자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되, 지금까지의 논의를 주도해 온 범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무과급제는 제한적이지만 피지배층 급제자들에게 신분 향상의 기회였다. 양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무관은 될 수 있었다. 피지배층의 신분상승 열망은 조선 후기에 평민들 사이에 성리학적 가치와 이상이 확대되었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의 전통, 학문에 대한 유교적 이상, 도덕, 예식ritual에 기반한 강력한 계급의식은 상위계층의 특징이다. 문화가 양반을 만든다는 믿음이었다.(204) 앞에서 말한 문화자본을 만드는 세 가지 상태에 대한 부르디외의 개념을 통해 보면, 무술을 체화해야하고 객관화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전문지식을 학습해야 하고, 무과급제란 국가로부터 문화적 배경을 인정받는 것이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은 사마시보다 무과에 더 잘 적용된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귀속성에 의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확실한 문화자본이 필요했고, 피지배층은 무과급제가 신분 표시수단으로의 위신이자, 축적된 문화자본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평민들의 무과 급제가 늘어나자 이를 줄이기 위해 강서講書가 부활되기도 했다.(204) 평민에게 무과급제는 군포와 역을 면제받고 다른 평민의 존경을 받게 된다. 홍패는 중요했다.(206) 조선 후기에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군담소설인데, 이런 소설은 성리학의 기본덕목을 잘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는 성리학 교육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206) 군주는 잔치와 회방에 대한 축하 등으로 무과에 신망을 보여주었다.(209) 조선의 사회계층 구조에서 중재역할 담당했던 것은 문화였다. 강고하고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은 문화의 이념적 기능에 의지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통한 수동적 저항은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의 숨겨진 대본hidden transcript개념으로 볼 수 있다. 피지배층이 자신들의 숨겨진 바람을 표출하는 숨겨진 대본은 탈춤이 대표적이다. 몇몇 학자는 이를 제의적인 반란으로 보기도 했다.(210-211) 무과는 통속문화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판소리나 양반 저자의 한글소설은 충, 효, 정절과 같은 유교적 기본 덕목을 구현하고 있다.(212) 군담소설이 대량으로 양산되게 된다. 주인공은 무술, 종교, 이념과 정치에 본능적으로 영웅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다.(213) 임경업전 같은 사실적인 군담소설은 조선이 외적에 승리를 거두는 영웅적 서사는 패배한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양반들의 전쟁 기간 중 보여준 비겁함과 분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215) 양반 출신이 아닌 영웅이 등장하는 군담소설은 미천한 출신의 주인공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성도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군담소설의 영웅적 모습은 무과 준비로 사람들을 이끌기도 했고, 임경업이나 최영, 남이는 무속신앙의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성리학 담론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216-218) 조선 후기의 문화적 맥락에서 무과제도는 귀족세계와 평민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무속신앙과 성리학적 기반은 상극을 이루지만, 두 영역은 공통적이고 넓은 기반이 있다. 성리학과 무속제의는 민간에서 나타났던 특별한 사회, 종교적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성리학이 민속에 영향을 주는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무과는 신분의 구분을 초월한다.(219)
조선 후기 한글소설에 대한 연구가 최근데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들었으니, 지금은 이 연구보다 훨씬 앞으로 나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과라는 고리로 유진 박이 보여주는 것은 조선의 문화이고, 특히 상층의 성리학과 하층과 여성의 무속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런 교차가 군담소설이나 영웅적 무장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들의 행동 윤리는 성리학적 도덕을 보여주고 있다. 무속신앙과 성리학을 연결짓는 상상력은 좀체 하기 쉬운 것이 아닌데. 유진 박은 보데인 왈라번(Boudewijn Walraven, 또는 보데왼 왈라번, 왈라반이라도 함, 네덜란드 이름은 읽는 사람 맘대로인가)을 인용한다. 아마도 이런 주장은 무속 연구자들이나 인류학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일지도 모른다. 유진 박은 솜씨좋게 한글 문학과 무속 연구와 성리학을 엮어낸다. 사실 이 부분은 읽으면서 감탄했는데. 제임스 스콧을 조금 더 파고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스월을 따라 말하면 제대로된 국가는 구조로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는 붕괴되지 않는다면 구조적 위기나 변형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구조의 지속은 국가의 권력보다 국가권력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새로운 집단이 충분한 자원을 대안alternative vision이나 일련의 스키마set of schemas 주변에 수집하는 것을 못하지 않는 한, 피지배층의 신분이 상승하여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223) 조선은 성리학적 감화感化를 통해 미묘한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했는데, 가혹한 법적 강제 없이 행해졌고, 조선 후기 국가는 권력의 기준으로 보면 특별할 것이 없지만, 대부분의 피지배층이 그 구조 안에 소속되기 원하는 스월이 말하는 심도depth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후기 국가권력의 심도는 쇠퇴해갔지만, 사회적 불만의 고조는 중화시키고 있었다.(224) 체제를 유지하면서 피지배층의 신분상승 욕구를 채워주는 일은 부르디외의 이력현상hysteresis과 오토넘autonum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에 민감한 신향들이 구 귀족에게는 증명이 되지 못하는 급제 여부나 임명증서를 바란 일이 이력현상이고, 오토넘은 여전히 높은 지위를 누기고 있는 다른 부류에게 적용되는 홍패 백패가 넘쳐나고 하위관직의 가치가 떨어지자 고의로 무직을 택한다. 오토넘의 영역은 불만의 중심지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224-225) 조선의 변화는 부르디외가 설명한 세 단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피지배층이 가치가 하락한 무관을 선택하고,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더 나아가 전체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225) 고의적 무직 상태는 남부에 거주한 귀족에게 널리 퍼진 현상이다. 부르디외가 사회 신진세력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짐작했던 것과 반대로 문화자본을 가진 이들은 누구나 충분히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조선 후기의 국가를 법적인 규제와 도덕적 지침의 수호자로 여겼다. 소작농 조차 왕을 탓할 이유가 없었다.(226)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무과급제로 수여하는 직위와 무과제도를 체제 전복적 요소들이 봉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망으로 사용했다. 부르디외는 직위와 같은 자격부여가 넘쳐나고 그 결과 가치가 하락하면 구조적으로 불변의 상태structural constant가 된다고 한다.(226) 대다수 피지배층은 이런 방법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양반에게 투탁하여 노비같이 노동해야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 국가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 신호는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라 볼 수 있다. 향촌 유력층과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있는 피지배층이 참여했고, 홍경래는 지관으로 급제하지 못했으나 과거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성리학적 소양이 있었다. 반면 지방의 지배층과 향리들은 봉기에 참여하는 것을 피했고, 요호부민饒戶富民, 상인, 소농은 활발히 참여했다.(227) 지역민들은 향회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라는 방식을 통했기에 반세기 동안 물리적 불만이 표출되지 못했다. 지방행정에서 양반의 영향력이 줄고,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들의 잡다한 부정은 1862년의 민란으로 연결된다.이는 소농의 분노와 지방 양반과 요호부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228) 대원군 집권에서 이어지는 기간은 전통적인 양반 중심의 사회적 계급이 평민을 포함하여 새로 등장한 요호부민과 같은 세력의 적극적인 행동에 굴복했음을 보여준다.(229) 조선의 개항은 내부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동학의 총봉기로 이어졌다.(229) 동학농민운동 기간 동안 마지막 무과가 시행된다.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를 제한적으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효력은 꺼져가고 있었다.(230) 과거제의 끝무렵 무과에 응시해 급제한 박성빈朴成彬(1871-1938)은 관직을 얻기 위해 재산을 허비하고 무산계 정9품 효력부위效力副尉를 얻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수로 보낸다. 그는 박선달로 불렸는데, 그의 아들이 박정희다. 그가 소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는 결국.(230-231) 무론 박정희는 고령박씨로 주요 무관 집안은 아니다.
거의 마지막 무과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박성빈의 급제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다. 박정희가 최초의 중요한 근대적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아주 전근대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무과급제자의 아들인 것은 정말 흥미진진하다. 박정희 담론에 고명이 좀 더 올라간 느낌이다. 결론 부분에서 유진 박은 스월과 부르디외를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설명해 나간다. 스월이 말하는 국가의 심도depth는 곰곰히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다. 유진 박도 와그너와 팔레 그리고 던컨의 뒤를 이어 조선왕조의 장기 지속 그 탄탄한 지배의 가능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문화다. 문화적 소양이라는 가치가 문과, 무과 등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신분상승을 원하는 이들에게 무과 급제의 문을 허용하면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무속신앙과 대중 군담소설의 영역은 어떻게 성리학적 가치와 연결되는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를 던진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외부로 부터온 새로운 충격을 조선왕조는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붕괴되고 만다. 조선왕조의 지배층의 장기지속이라는 그의 선배 학자들의 견해에 문화적 감화와 국가의 심도를 통한 문화의 침투라는 이야기를 더한 셈이다. 실제 지금까지도 이 심도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한다. 그럼 북한은 어쩌지. 조선 후기에도 양반은 아니라면서 차별받았다는 북한 지역. 본관을 사용하지 않은지 70년에. 혈연, 지연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북한도 조선왕국의 후예인만큼 뭔가 어떤 연줄을 따지고 있겠지. 잘 모를 뿐이다. 그러나 본관씨족을 상실해 버린 이들과 다시 교류하게 될 때, 이들이 조선말기 처럼 각자 본관을 우산형 씨족 중에서 택하게 될까?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연구는 전근대와 근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단절적인 이유로 연계가 끊어졌으니. 북한이야말로 인류학적 연구대상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거대한 실험들의 결과가 쌓여있으니.
부르디외를 활용한 그의 논의를 평가할 능력이 모자란다. 그 점이 많이 아쉽다. 부르디외라곤 『구별짓기』를 읽어본 게 고작. 부르디외가 놓인 논의의 맥락과 유진 박의 부르디외 이해 정도 및 그 한계를 평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할 듯 하다. 동아시아 전근대 연구에 부르디외가 얼마나 활용되는지도 궁금하다. 유진 박의 이 책이 국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데는, 부르디외 뿐 아니라 다른 이론적 자원을 평가할 능력이 한국 사학계에는 좀 모자라서가 아닐까 싶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론에 너무나 무지하면서도 그걸 또 굳이 외면하는 모습을 자주보아서 그렇다. 거기에 고집도 있어서, 무지에 고집이 더해지니. 게다가 이론 공부하면 선생님이나 선배들에게 쓸데 없는 짓 한다고 야단을 맞기도 한다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으려나.
유진 Y. 박의 다음 저서는 A Family of No Prominence: The Descendants of Pak Tŏkhwa and the Birth of Modern Korea(한미한 일가: 박덕화의 후손과 근대 한국의 탄생)로 2014년에 Stanford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조선 후기 중인 무과 집안인 밀양박씨 규정공파의 박덕화의 후손을 그리고 있다. 밀양박씨는 규정공파는 무인 귀족(벌열무반) 중 유일하게 중인 집안이다. 밀양박씨는 우산형 씨족. 이들이 16세기부터 출발해, 구한말 대한제국시기를 지나 일제 식민지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단양우씨도 나온다. 서평을 보니 저자 자신의 조상이기도 한 모양이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나온다고 예고된 A Genealogy of Dissent: The Progeny of Fallen Royals in Chosŏn Korea(반대자의 계보: 조선 시대의 몰락한 왕족의 후예)도 있다. 몰락한 고려 개성의 왕씨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 두 이야기다 이 책에서 다루던 상대적으로 중간에 속하는 엘리트들의 이야기다. 구해서 보려고 한다. 일단 사서 쌓아둔 다음.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다들 좀더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기본 폰트에 포험되어 있으면 좋겠고. 일본어 폰트도 그렇다. 좀더 어울리고 매끄러워지면 좋겠다. 글자가 좀 튀어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만, 모양은 좀. 무엇보다 참고문헌이 좀 문제다. 빠진 것도 몇 개 있고, 저자 이름이 틀린 것도 있다. 제목은 맞으나 출판사가 틀린 것도 있고. 해당 출판사에는 저자가 다르고 제목이 같은 책이 있다. 저자의 잘못인지.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을 한국어 문헌과 영어 문헌으로 나누다가 벌어진 일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2쇄에는 고쳐지길. 그리고, 한국어로 출판된 책들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출판사나 역자 재량에 딸린 일이지만, 나는 그저 이 책에서 인용하는 와그너, 팔레, 도이힐러, 던컨, 슐츠, 에커트, 하부쉬 자현 김의 책은 물론이고, 톰슨과 부르디외 그리고 보토모어까지 모두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두고 싶다. 그리고 선주 김의 출간예정으로 표기된 저서는 Ma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The Hong Kyŏngnae Rebellion in 1812라는 다른 제목으로 출간되었다는 사실도.
2018. 8. 7.
* 괄호 안의 숫자는 번역서의 쪽수이다.
** 이 글의 저작권은 ⓒFELIVIEW.COM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